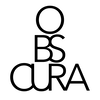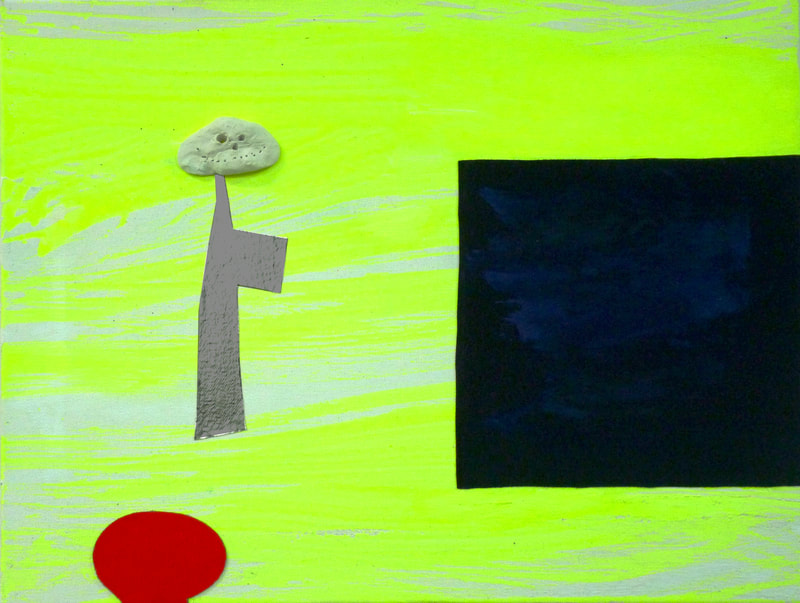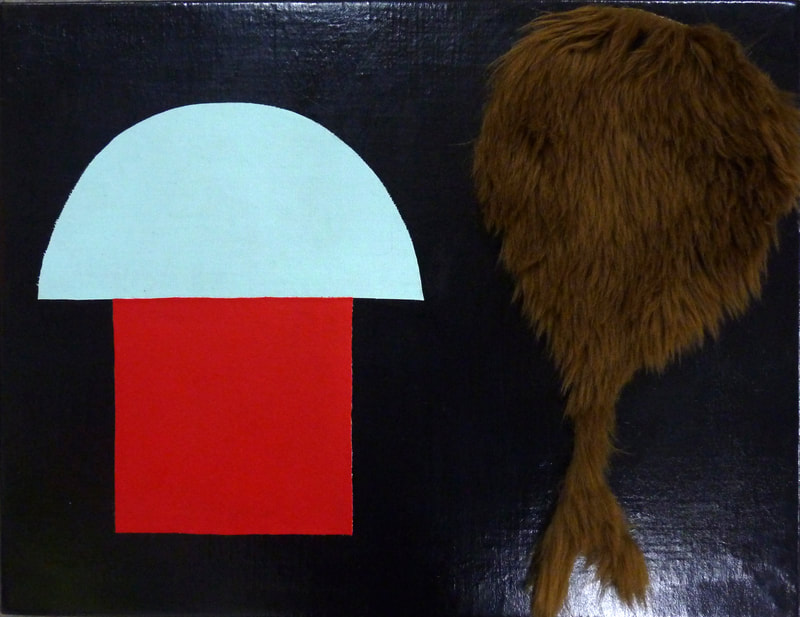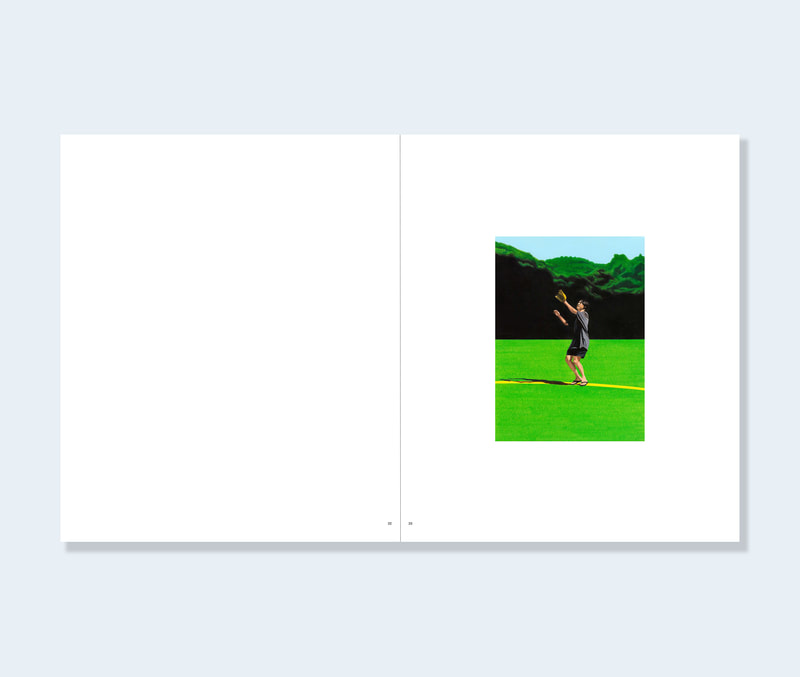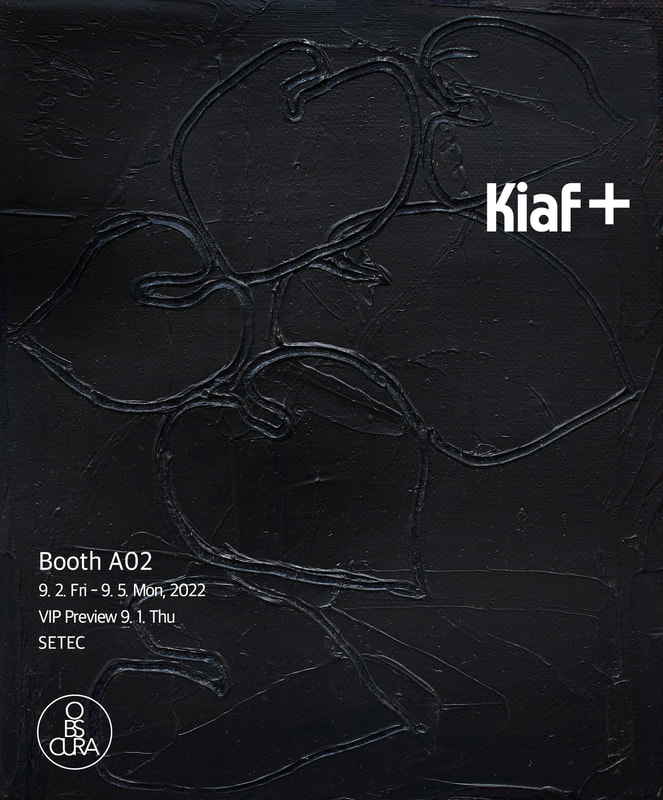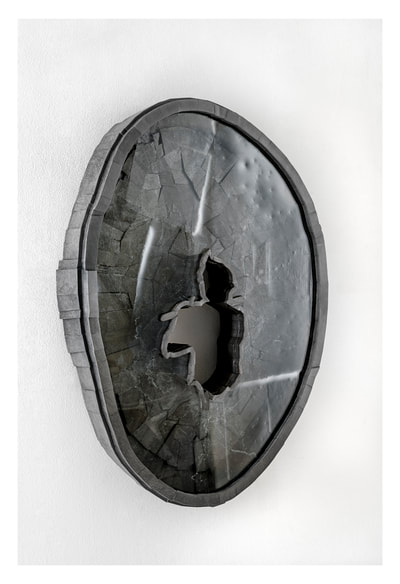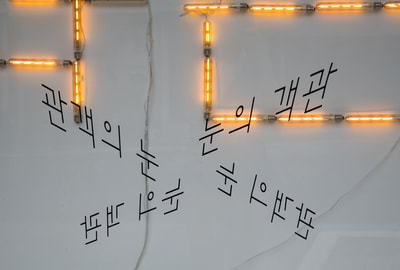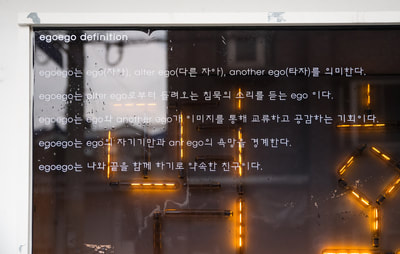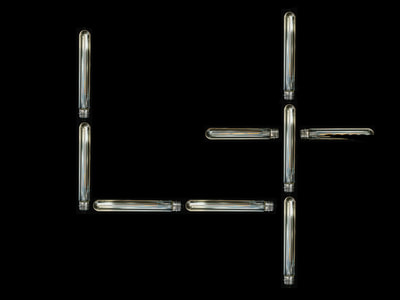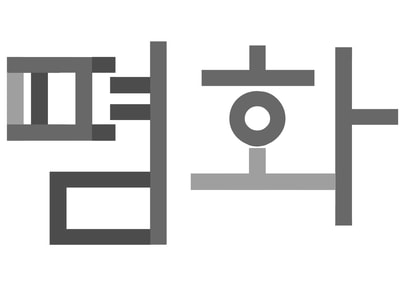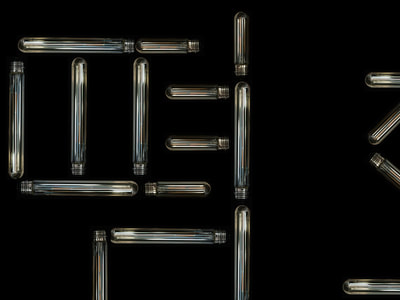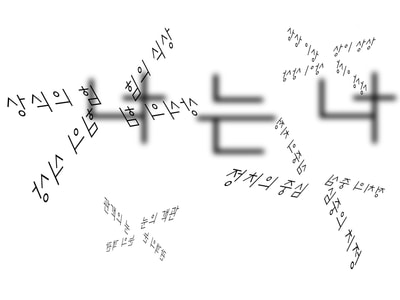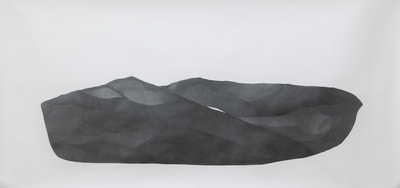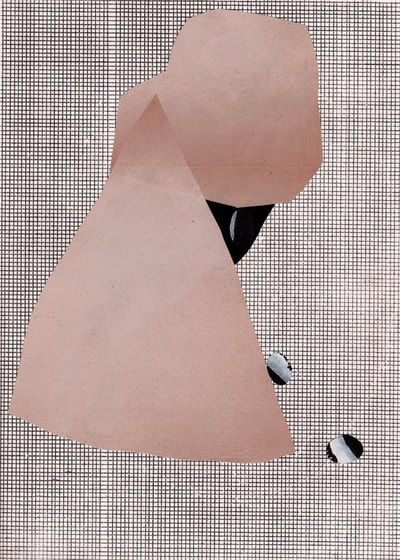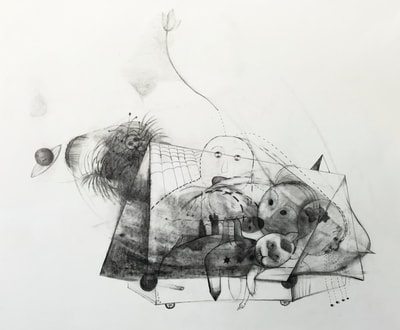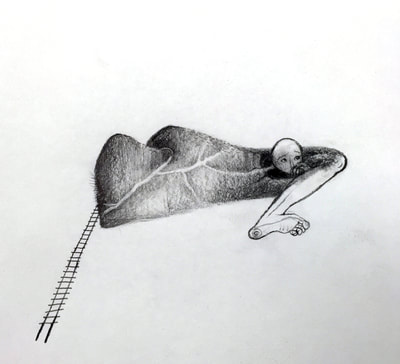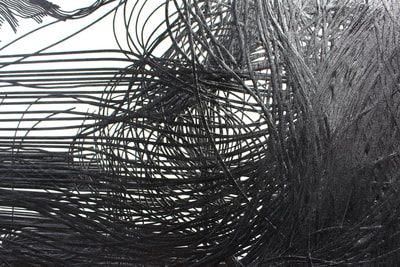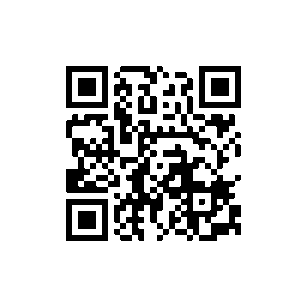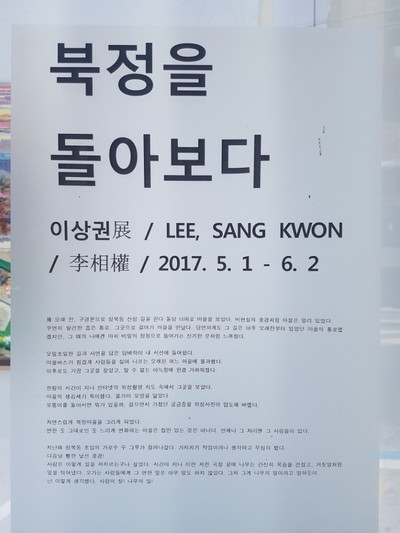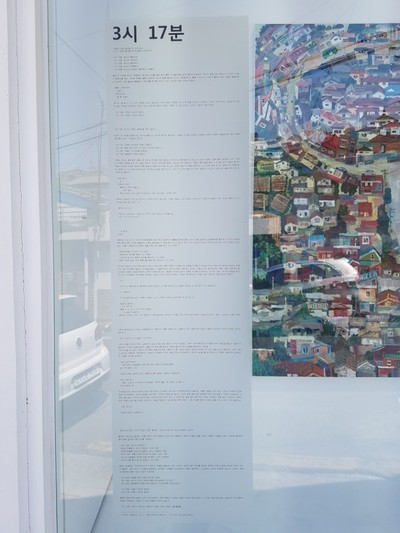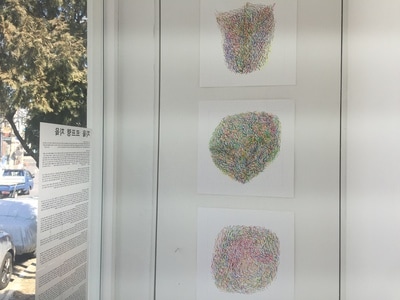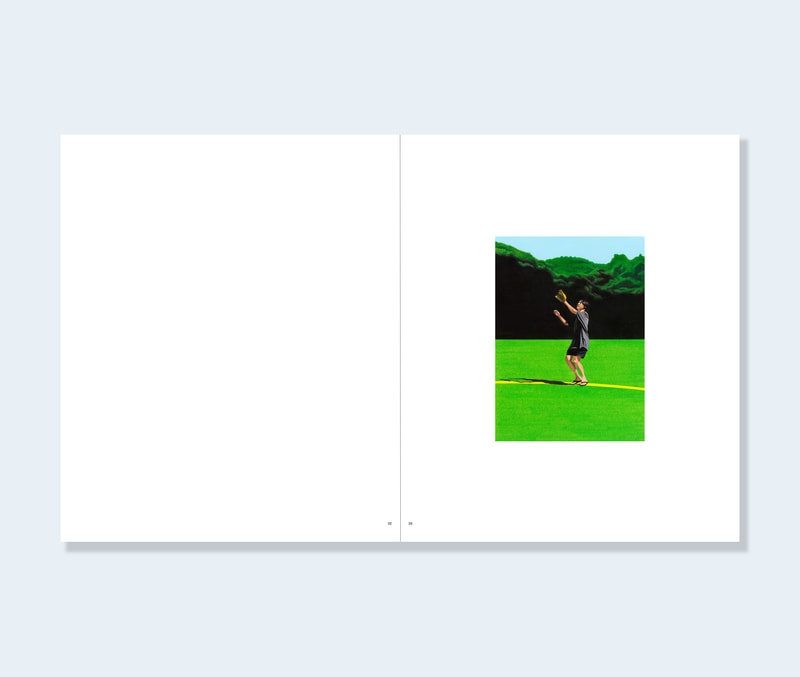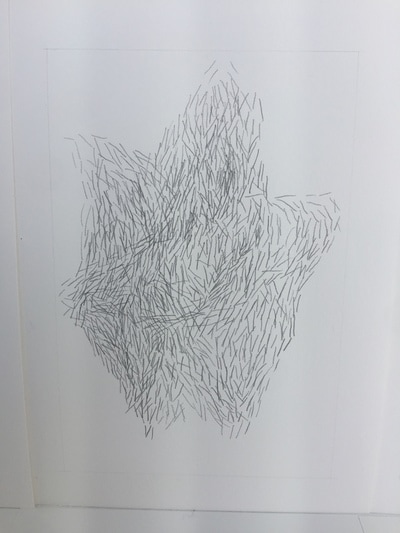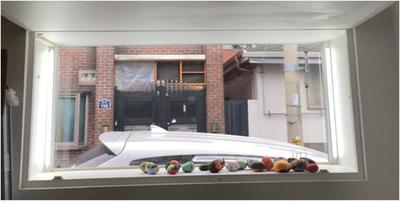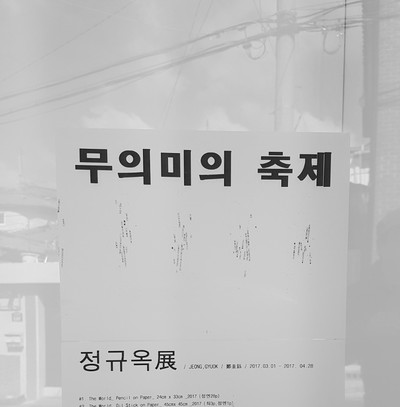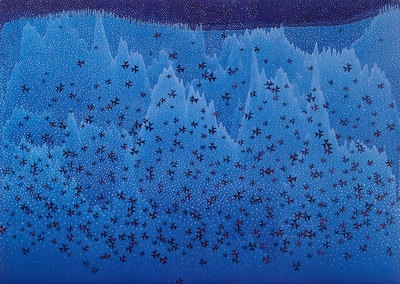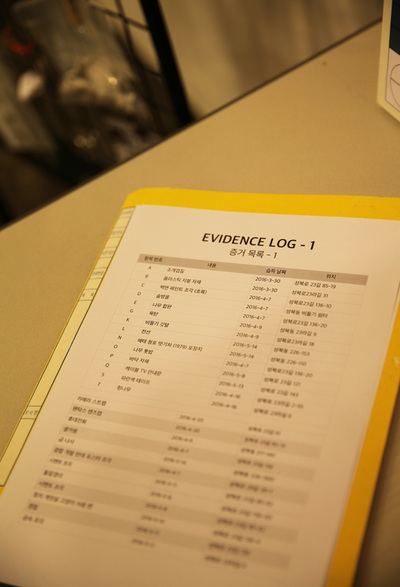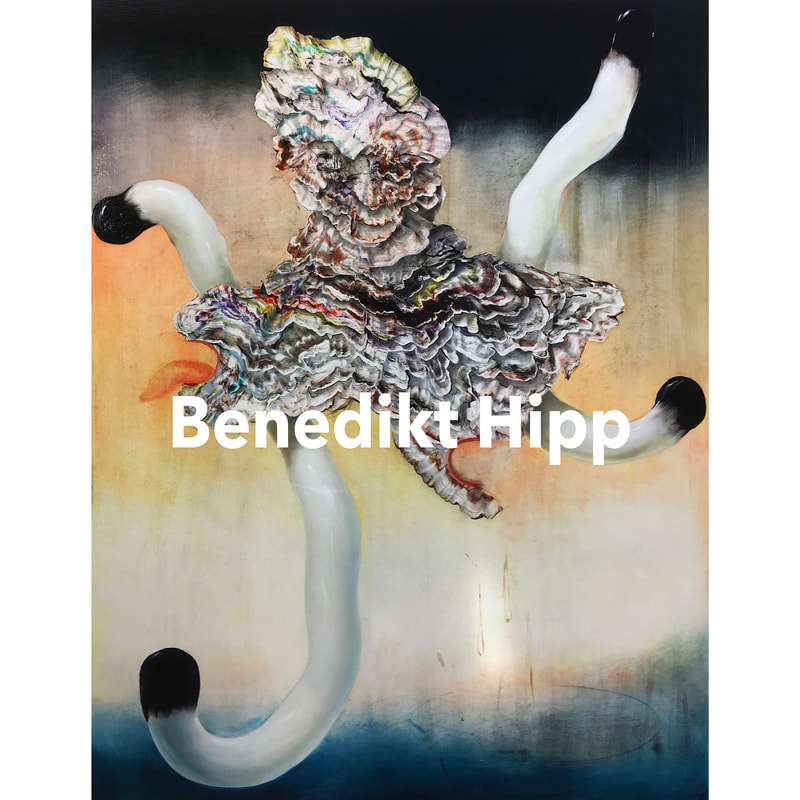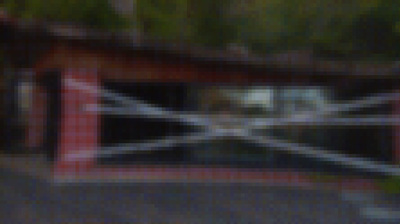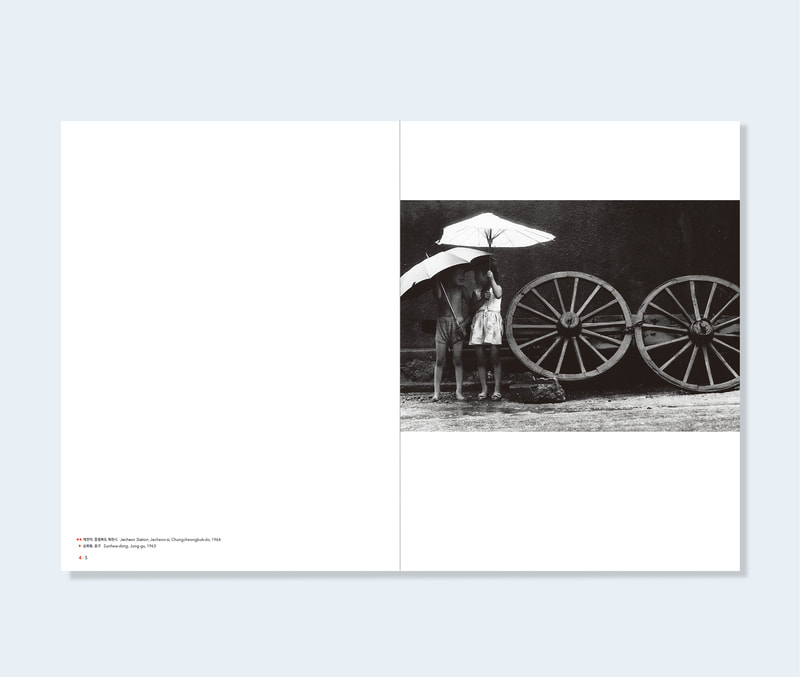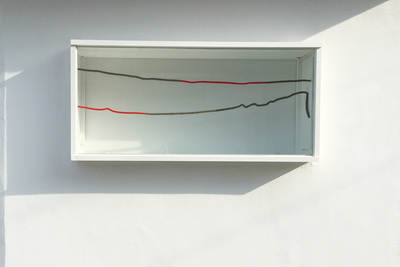윤혜진 / YOON, HAEJIN/ 尹恵珍 / DANCING ZELKOVA / 2018. 11.01 - 2019. 01.11
나무가 춤을 춘다.
지구에 뿌리를 내린 채
해와 달을 지나서,
우주너머 空을 향해간다.
지구, 달, 태양이 서로 뒤엉키며 하나 되는 찰나,
파편화된 기억은 뭉쳐지고 단단한 자아는 해체되어 간다.
내가 나무가 되고 나무는 우주가 된다.
우주가 나무가 되고 나무는 내가 된다.
느티나무가 춤을 춘다.
나, 나무, 우주,
다 사라질 때까지……
윤혜진
지구에 뿌리를 내린 채
해와 달을 지나서,
우주너머 空을 향해간다.
지구, 달, 태양이 서로 뒤엉키며 하나 되는 찰나,
파편화된 기억은 뭉쳐지고 단단한 자아는 해체되어 간다.
내가 나무가 되고 나무는 우주가 된다.
우주가 나무가 되고 나무는 내가 된다.
느티나무가 춤을 춘다.
나, 나무, 우주,
다 사라질 때까지……
윤혜진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북정 마을의 정자. 어디에나 그렇듯 정자 옆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모든 나무가 그러하듯 나무는 봄부터 햇살로 키워온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지나가는 바람에 몸을 맡겨 소리 내며, 새들이 머물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 이렇게 푸릇하고 따뜻했던 나무의 시간은 지나가고 하늘의 색만으로 채워지는 겨울이 찾아왔다. 이 겨울에 찾아온 <Dancing Zelkova>는 지난 계절, 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듯 나무의 한편에 머물던 사람과 새처럼 지나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무(無)로부터 유(有)한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는 순간의 힘이 요구된다. 색과 붓이 어우러져 순간에 그려진 궤적은 비록 유의미하게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즉흥적인 힘에 의해서만 비로소 형상화될 수 있다. 윤혜진 작가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많은 형상은 무에서 유로 막 첫발을 내디딘 태초의 모습을 하고 있다. 태초의 모습은 순수하고 여린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생소함을 안겨 주기도 한다. 정제되어 있지 않은 날것의 모습에서 역설적이게도 섬뜩하고 낯선 느낌이 든다. 이 모순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려 한다. 첫째는 태초의 형상을 주목시키는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사방으로 뻗어있는 여러 손으로 리듬을 타는 아이는 단지 의인화한 나무가 춤추는 것으로만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이끌림을 스스로 발현하여 관람자를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든다. 가슴의 드로잉처럼 그 어떤 유기체보다 더 정교함을 갖추고 있는 태초의 형상은 관람자가 그것의 현현에 관심을 두고 수동적으로 다가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직접 스스로를 작품 앞에 세우게 만든다. 즉, 관람자 자신의 시선이라는 주체적 힘보다 태초의 형상이 가진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털, 가죽의 사용에 주목해야 한다. 작가는 화면의 한 부분, 인형의 한 부분에 털이나 가죽을 자주 사용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인형에도 머리 부분이 짙은 갈색의 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인형의 몸은 팔, 다리로 구성된 일반적인 신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얼굴은 눈, 코, 입의 형상 없이 털로만 되어있다. 털은 그것으로 감싸진 동물의 형상이 명확히 보였을 때나, 반대로 가공된 직물임이 확인될 때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신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모호한 경계 선상에서 마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섬뜩함은 커진다. 인형의 몸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해가 지고 어둑해진 시간에, 스치듯 마주한 털 덩어리는 모호함의 경계 사이에 위치한다. 윤혜진 작가의 태초 형상에서 느껴지는 모순된 감정의 동시적 상기는 선이나 악과 같은 대립하는 상징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무와 유의 경계 그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의 힘에, 익숙하지만 낯선 힘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의 힘에 우리는 이끌리는 것이다.
작가는 생명의 시작 순간에 대해 여러 기표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표 자체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기표들은 단서와 같아서 진리를 향해 한 방향을 가르키고 있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작품의 진리는 존재하면서 부재한다. 진리는 결코 작품 속에서 한 번에 현전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기표의 놀이, 즉 그것들의 차이, 연기, 산포의 유희뿐이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
데리다의 말처럼 하나의 기표는 다른 것들과 차이를 이루며 다른 기표로 연기되면서, 존재하는 동시에 부재하는 흔적이 된다. 그것은 방금 떠났다가, 떠나려고 되돌아왔다가, 다시 떠난다. 예술작품 역시 마찬가지다. 작품의 의미, 그것의 진리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한다. 느티나무의 흔들림은 사방으로 뻗어있는 여러 손으로 리듬을 타는 아이가 되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인형과 같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그 인형은 두려운 공포를 안겨준다. 그러나 곧 생명의 흔적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순간 부는 바람에 느티나무가 흔들린다.
박우진
무(無)로부터 유(有)한 어떤 것이 만들어질 때는 순간의 힘이 요구된다. 색과 붓이 어우러져 순간에 그려진 궤적은 비록 유의미하게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즉흥적인 힘에 의해서만 비로소 형상화될 수 있다. 윤혜진 작가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많은 형상은 무에서 유로 막 첫발을 내디딘 태초의 모습을 하고 있다. 태초의 모습은 순수하고 여린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생소함을 안겨 주기도 한다. 정제되어 있지 않은 날것의 모습에서 역설적이게도 섬뜩하고 낯선 느낌이 든다. 이 모순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려 한다. 첫째는 태초의 형상을 주목시키는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사방으로 뻗어있는 여러 손으로 리듬을 타는 아이는 단지 의인화한 나무가 춤추는 것으로만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이끌림을 스스로 발현하여 관람자를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든다. 가슴의 드로잉처럼 그 어떤 유기체보다 더 정교함을 갖추고 있는 태초의 형상은 관람자가 그것의 현현에 관심을 두고 수동적으로 다가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직접 스스로를 작품 앞에 세우게 만든다. 즉, 관람자 자신의 시선이라는 주체적 힘보다 태초의 형상이 가진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털, 가죽의 사용에 주목해야 한다. 작가는 화면의 한 부분, 인형의 한 부분에 털이나 가죽을 자주 사용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인형에도 머리 부분이 짙은 갈색의 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인형의 몸은 팔, 다리로 구성된 일반적인 신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얼굴은 눈, 코, 입의 형상 없이 털로만 되어있다. 털은 그것으로 감싸진 동물의 형상이 명확히 보였을 때나, 반대로 가공된 직물임이 확인될 때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신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모호한 경계 선상에서 마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섬뜩함은 커진다. 인형의 몸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해가 지고 어둑해진 시간에, 스치듯 마주한 털 덩어리는 모호함의 경계 사이에 위치한다. 윤혜진 작가의 태초 형상에서 느껴지는 모순된 감정의 동시적 상기는 선이나 악과 같은 대립하는 상징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무와 유의 경계 그 사이에서 일어난 변화의 힘에, 익숙하지만 낯선 힘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의 힘에 우리는 이끌리는 것이다.
작가는 생명의 시작 순간에 대해 여러 기표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표 자체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기표들은 단서와 같아서 진리를 향해 한 방향을 가르키고 있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작품의 진리는 존재하면서 부재한다. 진리는 결코 작품 속에서 한 번에 현전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기표의 놀이, 즉 그것들의 차이, 연기, 산포의 유희뿐이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
데리다의 말처럼 하나의 기표는 다른 것들과 차이를 이루며 다른 기표로 연기되면서, 존재하는 동시에 부재하는 흔적이 된다. 그것은 방금 떠났다가, 떠나려고 되돌아왔다가, 다시 떠난다. 예술작품 역시 마찬가지다. 작품의 의미, 그것의 진리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한다. 느티나무의 흔들림은 사방으로 뻗어있는 여러 손으로 리듬을 타는 아이가 되었다. 그 아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인형과 같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그 인형은 두려운 공포를 안겨준다. 그러나 곧 생명의 흔적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순간 부는 바람에 느티나무가 흔들린다.
박우진
박미례 展 / PARK, MIRAE/ 朴美禮 / 야경꾼 NIGHT WATCHER/ 2018. 09.17 - 10.27
영장류 중 젤로 머리만 좋은 것이 그저 직립보행 한다.
바퀴달린 것 만들고
날개 달린 것 만들고
물위를 떠다닐 것 만들긴 해도
저기 바다의 고래처럼 물속에서 숨 쉴 줄 모르고
철새처럼 이 땅에서 저 멀리로 날아갈 줄 모른다.
까불기는
날 줄 도 모르는 게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게.
조물주는 인간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고
물속에서 숨 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 빨아 먹는 모기도, 나비 아닌 나방도
무생이건 생이건 산다는 이유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냥, 그냥,
그저 살라고.
잡생각이 길어지는 시간이면
지나 온 시간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 시간, 그 땅에서, 왜 너를 보았는지에 대해.
이 순간이 중요한 찰라 다.
그 순간이 내 속과의 대면이며
업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박미례
밤이란 무엇일까? 밤은 어디에서 올까? 어떻게 밤이 생겨날까? 이 질문의 답으로 밤이 지구의 그림자라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된 것은 16세기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Nicolaus Copernicus, 1473-1543)에 의해서이다. ‘밤은 지구의 그림자’라는 명제를 얻기 전, 사람들은 밤과 어둠을 인간이 저지른 큰 잘못의 결과로 해석하고, 밤이 오면 밤바람 속의 정령들과 더불어 인간의 내면에서 어두운 욕망이 고개를 든다고 상상했다. 미지의 밤은 인간에게 두려움의 총체적 집합소 같은 것이었다. 이제 두려운 밤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밤은 여전히 인간에게 낮과 반대되는, 이성의 반대편 영역을 자극하는 것으로 남아있었다.
“쾌락을 중단시킬 뿐인 낮을/ 너희는 기뻐할 수 있겠니?”
“모든 낮엔 골칫거리가 있고/ 밤엔 쾌락이 있어.”
이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Lehrjahre』에 등장하는 필리네(Philine)의 말이다. 그녀는 삶의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 밤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런 “여성의 시간”으로서의 밤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어 한다. 밤의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밤의 아버지가 사라지면서 이제 밤은 “모든 아름다움의 어머니”로서의 시간으로, 미학의 원천이 된다.
오늘날의 밤은 도시는 불빛으로 채워지고 낮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람들의 활동으로 가득하다. 밤의 갈망이 브레이크 없이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에게 완벽한 밤이란 외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두 눈을 감고 수면하는 내부의 시간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도 도시의 불빛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은하수의 장관에 경탄할 수 있는 장소는 점차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인공의 빛은 밤의 소멸을 이끌고 낮의 영역을 확장한다. 밤이 가지고 있던 쾌락과 사색의 미학은 점차 사라진다. 박미례 작가는 빛이 가득한 도시의 밤이 아닌, 밤 그 자체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수천 년 전 바빌로니아 지역에 살던 셈족계 유목민인 칼데아인들이 가축을 키우고 푸른 초목을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며 별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밤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간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숭고한 감정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작가는 밤하늘의 어둠 그리고 펼쳐지는 환상적 이야기들에 마음을 뺏긴다. 작가는 사슴, 황소, 궁수(弓手), 별 이야기의 합주가 펼쳐지는 밤하늘 중 부엉이 곁에 있다. 밤의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부엉이는 이 밤 곳곳을 누빈다. 낮이 두려워 밤에 움직이는 부엉이는 밤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어둠을 잠시 경험하는 것은 짜릿한 쾌락을 주지만 그 어둠만 계속되는 곳에서 있어야 한다면, 이제 어둠은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이 된다. 그래서 부엉이는 작가와 함께하는 야경 감상자로서 언뜻 떠오르는 밤의 두려움을 제거해주며 현실로 귀환을 안내해 줄 야경꾼이다.
유화와 목탄을 이용한 회화작업을 주로 선보이던 박미례 작가에게 이번 스페이스 이끼에서 선보인 시트지 작업은 새로운 시도였다. 손의 궤적이 느껴지던 작업을 주로 하던 작가가 손길이 잘 표현되지 않는 새로운 매체를 만났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내심 갖고 있었다. 시트지 작업은 기존 회화작업에 비해 감정과 이야기가 정제되기 때문에 밤 이야기 자체를 전달하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에는 적합한 소재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작가가 표현하는 대상을 환상의 영역으로 올려놓던 손의 궤적이 사라지면서 작업 전체에 풍기는 환상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작업이 시트지 작업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라면 차후 작업에서 보일 혼용과 변주에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박우진
“쾌락을 중단시킬 뿐인 낮을/ 너희는 기뻐할 수 있겠니?”
“모든 낮엔 골칫거리가 있고/ 밤엔 쾌락이 있어.”
이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Lehrjahre』에 등장하는 필리네(Philine)의 말이다. 그녀는 삶의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 밤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런 “여성의 시간”으로서의 밤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어 한다. 밤의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밤의 아버지가 사라지면서 이제 밤은 “모든 아름다움의 어머니”로서의 시간으로, 미학의 원천이 된다.
오늘날의 밤은 도시는 불빛으로 채워지고 낮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람들의 활동으로 가득하다. 밤의 갈망이 브레이크 없이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에게 완벽한 밤이란 외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두 눈을 감고 수면하는 내부의 시간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도 도시의 불빛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은하수의 장관에 경탄할 수 있는 장소는 점차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인공의 빛은 밤의 소멸을 이끌고 낮의 영역을 확장한다. 밤이 가지고 있던 쾌락과 사색의 미학은 점차 사라진다. 박미례 작가는 빛이 가득한 도시의 밤이 아닌, 밤 그 자체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수천 년 전 바빌로니아 지역에 살던 셈족계 유목민인 칼데아인들이 가축을 키우고 푸른 초목을 따라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며 별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밤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간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숭고한 감정에 압도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작가는 밤하늘의 어둠 그리고 펼쳐지는 환상적 이야기들에 마음을 뺏긴다. 작가는 사슴, 황소, 궁수(弓手), 별 이야기의 합주가 펼쳐지는 밤하늘 중 부엉이 곁에 있다. 밤의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부엉이는 이 밤 곳곳을 누빈다. 낮이 두려워 밤에 움직이는 부엉이는 밤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어둠을 잠시 경험하는 것은 짜릿한 쾌락을 주지만 그 어둠만 계속되는 곳에서 있어야 한다면, 이제 어둠은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이 된다. 그래서 부엉이는 작가와 함께하는 야경 감상자로서 언뜻 떠오르는 밤의 두려움을 제거해주며 현실로 귀환을 안내해 줄 야경꾼이다.
유화와 목탄을 이용한 회화작업을 주로 선보이던 박미례 작가에게 이번 스페이스 이끼에서 선보인 시트지 작업은 새로운 시도였다. 손의 궤적이 느껴지던 작업을 주로 하던 작가가 손길이 잘 표현되지 않는 새로운 매체를 만났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내심 갖고 있었다. 시트지 작업은 기존 회화작업에 비해 감정과 이야기가 정제되기 때문에 밤 이야기 자체를 전달하고 싶었던 작가의 의도에는 적합한 소재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작가가 표현하는 대상을 환상의 영역으로 올려놓던 손의 궤적이 사라지면서 작업 전체에 풍기는 환상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작업이 시트지 작업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라면 차후 작업에서 보일 혼용과 변주에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박우진
살구이끼4. 박원주展 / PARK, WONJU 朴嫄珠 / 닮은그림찾기 더미/ 2018. 08.01 - 08.31
살구이끼4.
박원주
2018. 08.01 - 08.31
닮은그림찾기_평면더미2018 Smoothing
(후원/서울문화재단)
북정마을에서 한 달을 보냈다. 성북동 성곽 아래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다. 고만고만한 주택들 사이로 신식 집들이 섞여 있는 데 멋이 과하지 않은 소박한 모양새이다. 문화예술 관련 일들이 새로이 옮겨온 것이다. 나도 동참할 기회가 생겼다. 첫 주에는 시간이 많아 여태껏 내가 만들어 온 작품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자니 낯이 익은 것이 있었다. 박살 난 유리를 살릴 수 있는 것만 모아 조각 조각 겨우 짜맞춘 액자 <맥거핀>에 길쭉한 둥근 고리처럼 생긴 북정마을 모양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무어라 불러야 할지 몰라 일단 맥거핀(MacGuffin)이라 이름 지어 두었는데 이 마을에 와서야 맞아떨어지다니!
땅거미가 내리고 성곽이 군데 군데 불을 밝히면 창 밖으로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지를 잘 보고 작업실을 나선다. 큼지막히 세워진 마을지도를 마주 보며, 둥근 고리로 난 길을 돌아 내려오고 있을 버스를 기다린다. 큰 나무와 정자 바로 뒤에는 매일 밤 동네를 환히 밝혀주는 미술 작품이 가득 든 커다란 유리창이 있다. 7월 내내 ‘너와 내’가 번갈아 가며 정류장을 지켰고, 이번 달에는 내 차례가 되었다. 대수롭지 않은 종이 한 장을 생각하며 시작하게 된 ‘약간 구겨진 액자’에서 제목 <펴기>는 ‘사실, 원래는 더 구겨져 있었던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Smoothing>, the lightly crumpled frame came from ‘a piece of paper’. Traditionally, the glass of a picture frame is supposed to be invisible. But the deformed glass by slumping method turns telltale sign in mutability by the direction of light. The crumpled glass interrupts the audience’s view. Strange paradox and reversion occurs here. By the way, have you noticed that the title ‘Smoothing’ implies that the thing used to be more crumpled?”
희 망 봉
………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이번 봄에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다.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더니, 희망봉을 보러 가는 것이라 한다. 나는 “거기 가봤자 희망은 볼 수 없을 텐데…”라고 했다. 인터넷에서 희망봉을 찾아보니, 원래 이름이 The Cape of Good Hope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불러 왔던 ‘봉’이라는 뜻의 peak가 아니고, 그 모양 또한 상상해 왔던 봉우리도 아니다. 결국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말 그대로 ‘봉’도 없는 셈.
어쨌거나.
(peak: 봉 / cape: 곶)
………… She said she quit the job and would go to Africa this spring. I asked, why so far. She will go to see The Peak of Hope, she answered. I responded, “You ain’t find the hope there.” I went on the internet and looked up the word, the Peak of Hope. It’s originally The Cape of Good Hope. It wasn’t the peak which we meant, or we pictured.
Hence, no hope, no peak?
Whatsoever.
박원주
박원주의 작업은 모순율과 아이러니를 통해서 실제와 개념의 차이에 주목하게 하며, 차이가 나는 의미들, 왜곡된 의미들,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의미들로 유도한다. 작가의 작업이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예로는 사물의 물성이나 본성을 변질시킴으로써 그 의미마저 변환시키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이를테면 일련의 <펴기 Smoothing>(2007) 작업 시리즈는 전면에 유리가 끼워진 보통의 나무액자를 종이처럼 접거나 구겼다가 다시 편 형태를 하고 있다. 나무와 유리의 물성은 그대로인데, 다만 그 모양이 종이처럼 변형된 이 기묘한 오브제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이 오브제들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상식과 선입견과 편견을 재고하게 만든다.
패러디 또한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계기로서 작동하는데, 원작과 차용 사이에서 다른 의미들을 파생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2009)에서는 마르셀 뒤샹의 원작 <신선한 과부 Fresh Widow>(1920)를 패러디하고, <칼날 삼부작 Blade Trilogy>(2009)에서는 루시오 폰타나(Lucio Fontana)의 칼로 캔버스를 찢은 행위를 패러디한다. 뒤샹의 말장난(Window를 Widow로 표기하는)에 또 다른 말장난(Fresh를 Fresher로 표기하는)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더니즘 혹은 아방가르드 서사에 내장된 마초적인 억압체계를 드러내며, 폰타나의 형식논리를 몸의 논리로 전유한다. 즉 찢어진 캔버스를 상처와 동격인 것으로 본 것이다.
작가의 작업은 이처럼 상식으로 굳어진 물성과 의미의 대응관계를 비트는 것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고독공포를 완화하는 의자>(2004)에서 정점에 이른다. 흔한 사무용품 중 하나인 A4 용지를 일일이 자르고 붙여 만든 이 정교한 종이의자는 그러나 사실은 놀랍게도 전기의자를 재구성해놓은 것이다. 전기의자는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공인된 살인도구란 점에서 폭력적이며, 그 살인행위가 사실상 공공연한 합의에 의해 추동된 것이란 점에서 사회적이고 존재론적인 폭력욕망을 반영한다. 이제 문명화된 시대(?)에 걸맞게 전기의자는 과거 속의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로써 과연 폭력과 살인을 위한 공공연한 제도적 장치도 덩달아 사라진 것일까. 혹 육체적인 가해가 사라지고 없는 빈자리에 개인의 무의식마저 파고드는 미시화된 권력이 대신 들어선 것은 아닌가. 종이의자와 고독공포라는 제목은 이처럼 형태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적인 권력의 실체를 암시한다. 그 공포는 하얀 종이처럼 추상적이지만, 정작 그 존재론적인 무게는 전기의자만큼이나 무겁다.
이 이질적이고 낯선 물건들이나 기형의 오브제들이 경계 위의 불안정한 사유와 삶의 방식을 예시해준다. 확고부동한 진리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사유를 대질시키고, 도구적인 사유가 작동을 멈춘 지점으로부터 허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만큼 섬세한 사유를 파생시킨다. / 고충환 <100.art.kr: Korean Contemporary Art Scene>. 열린 책들, 2012, p.478
평문1
수 백 년 동안 전통적인 회화작품에 대한 통념을 지배해 온 강력한 전제인 직사각형의 틀과 판판하기 이를 데 없는 유리, 이 둘로 구성된 액자는 캔버스에 담긴 내용, 즉 풍경이나 인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식품이다. 그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하나의 ‘특별한 허구’라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펴기>에서, 작품의 핵심 내용 혹은 ‘본래의 (original)’ 작품처럼 틀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화면과 화면 위의 무늬들은 사실 구부러진 유리를 반영하는 액자의 뒷판이며, 유리를 구기기 위한 열처리 과정에서 생겨난 무늬이다. 관객은 습관처럼 그 유리를 통해 유리 너머를 보면서 그것을 작품의 내용으로 오인하게 된다. 기묘 한 역설과 전복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또한 그 무늬는 빛에 따라 변화무쌍하기도 하다. / 조광제 <박원주의 「펴기」: 2009 오늘의 작가-에퀴녹스, 김종영미술관 발행, 발췌 및 재편집>
평문2
살구이끼展
성북동 북정마을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드로잉스페이스 살구가 공동기획한 작가 4인의 개인전이 스페이스 이끼에서열린다.
북정마을에서 작업하는 작가 이순주, 최승훈 그리고 드로잉스페이스 살구 2018년 레지던시프로그램 작가 이안리,박원주가 참여한다
전시장소: 스페이스 이끼
전시기간: 2018.5.1-2018.8.31
살구이끼1. 이순주 5.1-5.31 설치, 드로잉
살구이끼2. 이안리 6.1-6.30 설치, 사진, 오브제
살구이끼3. 최승훈 7.1-7.31 설치, 사진
살구이끼4. 박원주 8.1-8.31 설치, 오브제
연계 전시
Drawing Space Saalgoo. Artist Residency #10 박원주
2018. 8.1 - 8.18. 1pm - 7pm. Monday closed
Closing Concert: 강태환(색소폰), 강권순(정가), Alfred 23 Harth(클라리넷)
2018. 8.18. 5:30pm
www.saalgoo.com
박원주
2018. 08.01 - 08.31
닮은그림찾기_평면더미2018 Smoothing
(후원/서울문화재단)
북정마을에서 한 달을 보냈다. 성북동 성곽 아래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다. 고만고만한 주택들 사이로 신식 집들이 섞여 있는 데 멋이 과하지 않은 소박한 모양새이다. 문화예술 관련 일들이 새로이 옮겨온 것이다. 나도 동참할 기회가 생겼다. 첫 주에는 시간이 많아 여태껏 내가 만들어 온 작품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자니 낯이 익은 것이 있었다. 박살 난 유리를 살릴 수 있는 것만 모아 조각 조각 겨우 짜맞춘 액자 <맥거핀>에 길쭉한 둥근 고리처럼 생긴 북정마을 모양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무어라 불러야 할지 몰라 일단 맥거핀(MacGuffin)이라 이름 지어 두었는데 이 마을에 와서야 맞아떨어지다니!
땅거미가 내리고 성곽이 군데 군데 불을 밝히면 창 밖으로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지를 잘 보고 작업실을 나선다. 큼지막히 세워진 마을지도를 마주 보며, 둥근 고리로 난 길을 돌아 내려오고 있을 버스를 기다린다. 큰 나무와 정자 바로 뒤에는 매일 밤 동네를 환히 밝혀주는 미술 작품이 가득 든 커다란 유리창이 있다. 7월 내내 ‘너와 내’가 번갈아 가며 정류장을 지켰고, 이번 달에는 내 차례가 되었다. 대수롭지 않은 종이 한 장을 생각하며 시작하게 된 ‘약간 구겨진 액자’에서 제목 <펴기>는 ‘사실, 원래는 더 구겨져 있었던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Smoothing>, the lightly crumpled frame came from ‘a piece of paper’. Traditionally, the glass of a picture frame is supposed to be invisible. But the deformed glass by slumping method turns telltale sign in mutability by the direction of light. The crumpled glass interrupts the audience’s view. Strange paradox and reversion occurs here. By the way, have you noticed that the title ‘Smoothing’ implies that the thing used to be more crumpled?”
희 망 봉
………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이번 봄에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다.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더니, 희망봉을 보러 가는 것이라 한다. 나는 “거기 가봤자 희망은 볼 수 없을 텐데…”라고 했다. 인터넷에서 희망봉을 찾아보니, 원래 이름이 The Cape of Good Hope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불러 왔던 ‘봉’이라는 뜻의 peak가 아니고, 그 모양 또한 상상해 왔던 봉우리도 아니다. 결국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말 그대로 ‘봉’도 없는 셈.
어쨌거나.
(peak: 봉 / cape: 곶)
………… She said she quit the job and would go to Africa this spring. I asked, why so far. She will go to see The Peak of Hope, she answered. I responded, “You ain’t find the hope there.” I went on the internet and looked up the word, the Peak of Hope. It’s originally The Cape of Good Hope. It wasn’t the peak which we meant, or we pictured.
Hence, no hope, no peak?
Whatsoever.
박원주
박원주의 작업은 모순율과 아이러니를 통해서 실제와 개념의 차이에 주목하게 하며, 차이가 나는 의미들, 왜곡된 의미들,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의미들로 유도한다. 작가의 작업이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예로는 사물의 물성이나 본성을 변질시킴으로써 그 의미마저 변환시키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이를테면 일련의 <펴기 Smoothing>(2007) 작업 시리즈는 전면에 유리가 끼워진 보통의 나무액자를 종이처럼 접거나 구겼다가 다시 편 형태를 하고 있다. 나무와 유리의 물성은 그대로인데, 다만 그 모양이 종이처럼 변형된 이 기묘한 오브제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이 오브제들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상식과 선입견과 편견을 재고하게 만든다.
패러디 또한 아이러니를 발생시키는 계기로서 작동하는데, 원작과 차용 사이에서 다른 의미들을 파생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2009)에서는 마르셀 뒤샹의 원작 <신선한 과부 Fresh Widow>(1920)를 패러디하고, <칼날 삼부작 Blade Trilogy>(2009)에서는 루시오 폰타나(Lucio Fontana)의 칼로 캔버스를 찢은 행위를 패러디한다. 뒤샹의 말장난(Window를 Widow로 표기하는)에 또 다른 말장난(Fresh를 Fresher로 표기하는)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더니즘 혹은 아방가르드 서사에 내장된 마초적인 억압체계를 드러내며, 폰타나의 형식논리를 몸의 논리로 전유한다. 즉 찢어진 캔버스를 상처와 동격인 것으로 본 것이다.
작가의 작업은 이처럼 상식으로 굳어진 물성과 의미의 대응관계를 비트는 것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고독공포를 완화하는 의자>(2004)에서 정점에 이른다. 흔한 사무용품 중 하나인 A4 용지를 일일이 자르고 붙여 만든 이 정교한 종이의자는 그러나 사실은 놀랍게도 전기의자를 재구성해놓은 것이다. 전기의자는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공인된 살인도구란 점에서 폭력적이며, 그 살인행위가 사실상 공공연한 합의에 의해 추동된 것이란 점에서 사회적이고 존재론적인 폭력욕망을 반영한다. 이제 문명화된 시대(?)에 걸맞게 전기의자는 과거 속의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로써 과연 폭력과 살인을 위한 공공연한 제도적 장치도 덩달아 사라진 것일까. 혹 육체적인 가해가 사라지고 없는 빈자리에 개인의 무의식마저 파고드는 미시화된 권력이 대신 들어선 것은 아닌가. 종이의자와 고독공포라는 제목은 이처럼 형태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적인 권력의 실체를 암시한다. 그 공포는 하얀 종이처럼 추상적이지만, 정작 그 존재론적인 무게는 전기의자만큼이나 무겁다.
이 이질적이고 낯선 물건들이나 기형의 오브제들이 경계 위의 불안정한 사유와 삶의 방식을 예시해준다. 확고부동한 진리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사유를 대질시키고, 도구적인 사유가 작동을 멈춘 지점으로부터 허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만큼 섬세한 사유를 파생시킨다. / 고충환 <100.art.kr: Korean Contemporary Art Scene>. 열린 책들, 2012, p.478
평문1
수 백 년 동안 전통적인 회화작품에 대한 통념을 지배해 온 강력한 전제인 직사각형의 틀과 판판하기 이를 데 없는 유리, 이 둘로 구성된 액자는 캔버스에 담긴 내용, 즉 풍경이나 인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식품이다. 그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하나의 ‘특별한 허구’라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펴기>에서, 작품의 핵심 내용 혹은 ‘본래의 (original)’ 작품처럼 틀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화면과 화면 위의 무늬들은 사실 구부러진 유리를 반영하는 액자의 뒷판이며, 유리를 구기기 위한 열처리 과정에서 생겨난 무늬이다. 관객은 습관처럼 그 유리를 통해 유리 너머를 보면서 그것을 작품의 내용으로 오인하게 된다. 기묘 한 역설과 전복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또한 그 무늬는 빛에 따라 변화무쌍하기도 하다. / 조광제 <박원주의 「펴기」: 2009 오늘의 작가-에퀴녹스, 김종영미술관 발행, 발췌 및 재편집>
평문2
살구이끼展
성북동 북정마을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드로잉스페이스 살구가 공동기획한 작가 4인의 개인전이 스페이스 이끼에서열린다.
북정마을에서 작업하는 작가 이순주, 최승훈 그리고 드로잉스페이스 살구 2018년 레지던시프로그램 작가 이안리,박원주가 참여한다
전시장소: 스페이스 이끼
전시기간: 2018.5.1-2018.8.31
살구이끼1. 이순주 5.1-5.31 설치, 드로잉
살구이끼2. 이안리 6.1-6.30 설치, 사진, 오브제
살구이끼3. 최승훈 7.1-7.31 설치, 사진
살구이끼4. 박원주 8.1-8.31 설치, 오브제
연계 전시
Drawing Space Saalgoo. Artist Residency #10 박원주
2018. 8.1 - 8.18. 1pm - 7pm. Monday closed
Closing Concert: 강태환(색소폰), 강권순(정가), Alfred 23 Harth(클라리넷)
2018. 8.18. 5:30pm
www.saalgoo.com
살구이끼3. 최승훈展 / CHOI, SUNGHUN / 崔昇勳 / EGOEGO / 2018. 07.01 - 07.31
살구이끼3.
최승훈
2018. 07.01 - 07.31
egoego
최승훈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언어, 인식, 이미지, 감각등을 심미적으로 결합, 재배치 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전시의 제목인 'egoego'는 작가 최승훈의 작품인 동시에 그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인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최승훈의 설치 작품을 통해 '출판사 egoego'의 철학을 공표하는 첫 전시이다
살구이끼展
성북동 북정마을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드로잉스페이스 살구가 공동기획한 작가 4인의 개인전이 스페이스 이끼에서열린다.
북정마을에서 작업하는 작가 이순주, 최승훈 그리고 드로잉스페이스 살구 2018년 레지던시프로그램 작가 이안리,박원주가 참여한다
전시장소: 스페이스 이끼
전시기간: 2018.5.1-2018.8.31
살구이끼1. 이순주 5.1-5.31 설치, 드로잉
살구이끼2. 이안리 6.1-6.30 설치, 사진, 오브제
살구이끼3. 최승훈 7.1-7.31 설치, 사진
살구이끼4. 박원주 8.1-8.31 설치, 오브제
최승훈
2018. 07.01 - 07.31
egoego
최승훈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언어, 인식, 이미지, 감각등을 심미적으로 결합, 재배치 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전시의 제목인 'egoego'는 작가 최승훈의 작품인 동시에 그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인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최승훈의 설치 작품을 통해 '출판사 egoego'의 철학을 공표하는 첫 전시이다
살구이끼展
성북동 북정마을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드로잉스페이스 살구가 공동기획한 작가 4인의 개인전이 스페이스 이끼에서열린다.
북정마을에서 작업하는 작가 이순주, 최승훈 그리고 드로잉스페이스 살구 2018년 레지던시프로그램 작가 이안리,박원주가 참여한다
전시장소: 스페이스 이끼
전시기간: 2018.5.1-2018.8.31
살구이끼1. 이순주 5.1-5.31 설치, 드로잉
살구이끼2. 이안리 6.1-6.30 설치, 사진, 오브제
살구이끼3. 최승훈 7.1-7.31 설치, 사진
살구이끼4. 박원주 8.1-8.31 설치, 오브제
살구이끼2. 이안리展 / LEEAHNNLEE / 李按利 / 귤 한 덩어리가 비탈 위에 놓이게 되기까지의 몸짓 Gestures Until An Orange Has Been Placed On The Hill / 2018. 06.01 - 06.30
살구이끼2.
이안리
2018. 06.01 - 06.30
귤 한 덩어리가 비탈 위에 놓이게 되기까지의 몸짓
Gestures until an orange has been placed on the hill
귤이 입 속에서 미지근하고 달다. 나는 귤 속에 앉아있다.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긴 방에서 공기는 귤 껍질 속 알갱이들처럼 서로 엉켜있다.
작음의 세계로 들어가 꿈꾸고 생각하자마자, 모든 것은 커진다.
오래되어 버려진 것 어딘가에는 빈틈이 있다. 낡은 장롱에서 뜯어낸 나무 판 위에 그린 그림을
덮고 또 그것을 다시 칼로 긁어내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다. 긴 오후의 단면이 지나가고 있다.
키우다 죽은 나무의 일부가 파라솔이 되고, 창턱 위 아주 작은 그릇에 올려놓은 음식 자투리 사
진들은 어떤 위로이기도 하다.
위태로운 마을, 비탈 위에 귤이 ‘슬쩍’ 놓이길 바란다.
살구이끼展
성북동 북정마을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드로잉스페이스 살구가 공동기획한 작가 4인의 개인전이 스페이스 이끼에서열린다.
북정마을에서 작업하는 작가 이순주, 최승훈 그리고 드로잉스페이스 살구 2018년 레지던시프로그램 작가 이안리,박원주가 참여한다
전시장소: 스페이스 이끼
전시기간: 2018.5.1-2018.8.31
살구이끼1. 이순주 5.1-5.31 설치, 드로잉
살구이끼2. 이안리 6.1-6.30 설치, 사진, 오브제
살구이끼3. 최승훈 7.1-7.31 설치, 사진
살구이끼4. 박원주 8.1-8.31 설치, 오브제
이안리
2018. 06.01 - 06.30
귤 한 덩어리가 비탈 위에 놓이게 되기까지의 몸짓
Gestures until an orange has been placed on the hill
귤이 입 속에서 미지근하고 달다. 나는 귤 속에 앉아있다.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긴 방에서 공기는 귤 껍질 속 알갱이들처럼 서로 엉켜있다.
작음의 세계로 들어가 꿈꾸고 생각하자마자, 모든 것은 커진다.
오래되어 버려진 것 어딘가에는 빈틈이 있다. 낡은 장롱에서 뜯어낸 나무 판 위에 그린 그림을
덮고 또 그것을 다시 칼로 긁어내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다. 긴 오후의 단면이 지나가고 있다.
키우다 죽은 나무의 일부가 파라솔이 되고, 창턱 위 아주 작은 그릇에 올려놓은 음식 자투리 사
진들은 어떤 위로이기도 하다.
위태로운 마을, 비탈 위에 귤이 ‘슬쩍’ 놓이길 바란다.
살구이끼展
성북동 북정마을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드로잉스페이스 살구가 공동기획한 작가 4인의 개인전이 스페이스 이끼에서열린다.
북정마을에서 작업하는 작가 이순주, 최승훈 그리고 드로잉스페이스 살구 2018년 레지던시프로그램 작가 이안리,박원주가 참여한다
전시장소: 스페이스 이끼
전시기간: 2018.5.1-2018.8.31
살구이끼1. 이순주 5.1-5.31 설치, 드로잉
살구이끼2. 이안리 6.1-6.30 설치, 사진, 오브제
살구이끼3. 최승훈 7.1-7.31 설치, 사진
살구이끼4. 박원주 8.1-8.31 설치, 오브제
살구이끼1. 이순주展 / YI SOONJOO / 李淳珠 / 서툰 손으로 한 조각을 닮은 북정마을 Greed Eats a Village, Bukjeong Maul / 2018. 05.01 - 05.31
살구이끼1.
이순주
2018.5.1 - 2018.5.30
서툰 손으로 한 조각을 닮은 북정마을
Greed Eats a Village, Bukjeong Maul
성북동 서울성곽 아래
삐뚤삐뚤 힘겹게 서로 연결된 실핏줄 같은 골목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작고 오래되고 낡은 집들
서툰 손으로 한 조각을 닮은 북정마을은
척박함을 무릅쓰고 자란 나무처럼
독한 겨울을 살아남아 봄볕에 졸고 있는 꼬질꼬질 길냥이처럼
거칠고 아름답다
여기 사람들도 그렇다
재개발귀신이 힘을 모은다
집을 허물고
사람을 내쫒고
돌산을 부수고
역사를 지우고
돈되는 집 짓겠다고 마을이 난리다
업적주의자와 돈에 눈 먼 자는 이 짓을 도시재생이라고 속이며 가속페달을 밟으려 한다
마음과 몸이 재개발 걱정으로 가득 찼다
이번 전시에서 북정마을 지도를 확대해서 파괴될 부분을 가시화해 보았다
크게 펼쳐보니 그 폭력성이 조금 더 잘 보인다
머리 반쪽이 날아간 개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걱정이다
집도 물건도 돌도 동물도 식물도
오래되면 다 사람인데
이순주
살구이끼展
성북동 북정마을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드로잉스페이스 살구가 공동기획한 작가 4인의 개인전이 스페이스 이끼에서열린다.
북정마을에서 작업하는 작가 이순주, 최승훈 그리고 드로잉스페이스 살구 2018년 레지던시프로그램 작가 이안리,박원주가 참여한다
전시장소: 스페이스 이끼
전시기간: 2018.5.1-2018.8.31
살구이끼1. 이순주 5.1-5.31 설치, 드로잉
살구이끼2. 이안리 6.1-6.30 설치, 사진, 오브제
살구이끼3. 최승훈 7.1-7.31 설치, 사진
살구이끼4. 박원주 8.1-8.31 설치, 오브제
이순주
2018.5.1 - 2018.5.30
서툰 손으로 한 조각을 닮은 북정마을
Greed Eats a Village, Bukjeong Maul
성북동 서울성곽 아래
삐뚤삐뚤 힘겹게 서로 연결된 실핏줄 같은 골목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작고 오래되고 낡은 집들
서툰 손으로 한 조각을 닮은 북정마을은
척박함을 무릅쓰고 자란 나무처럼
독한 겨울을 살아남아 봄볕에 졸고 있는 꼬질꼬질 길냥이처럼
거칠고 아름답다
여기 사람들도 그렇다
재개발귀신이 힘을 모은다
집을 허물고
사람을 내쫒고
돌산을 부수고
역사를 지우고
돈되는 집 짓겠다고 마을이 난리다
업적주의자와 돈에 눈 먼 자는 이 짓을 도시재생이라고 속이며 가속페달을 밟으려 한다
마음과 몸이 재개발 걱정으로 가득 찼다
이번 전시에서 북정마을 지도를 확대해서 파괴될 부분을 가시화해 보았다
크게 펼쳐보니 그 폭력성이 조금 더 잘 보인다
머리 반쪽이 날아간 개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걱정이다
집도 물건도 돌도 동물도 식물도
오래되면 다 사람인데
이순주
살구이끼展
성북동 북정마을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드로잉스페이스 살구가 공동기획한 작가 4인의 개인전이 스페이스 이끼에서열린다.
북정마을에서 작업하는 작가 이순주, 최승훈 그리고 드로잉스페이스 살구 2018년 레지던시프로그램 작가 이안리,박원주가 참여한다
전시장소: 스페이스 이끼
전시기간: 2018.5.1-2018.8.31
살구이끼1. 이순주 5.1-5.31 설치, 드로잉
살구이끼2. 이안리 6.1-6.30 설치, 사진, 오브제
살구이끼3. 최승훈 7.1-7.31 설치, 사진
살구이끼4. 박원주 8.1-8.31 설치, 오브제
전윤정 展 / CHUN, YUNJUNG / 全玧貞 / 블랙헤어라푼젤 Black Hair Rapunzel / 2018. 03.05 - 04.27
생각과 감정의 기술, 불편한 드로잉
그 동안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노트 모서리에 낙서를 하면서 마음 속의 생각들을 끄적여왔다. 습관적으로 써내려간 낙서 위에 또 다시 겹쳐 그리거나 귀에 맴도는 단어들을 써내려가며 나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 소소한 ‘생각과 감정’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느다란 펜으로 매우 작게 그리다가 점차 크게 하거나 유기적인 형태로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이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색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에만 집착하는 한계를 느낀 후, 점차 색을 배제하고 펜으로만 작업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그리고 오랜 고민과 탐색 끝에 마침내 지금의 작업에서 사용하는 검은색 라인테이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캔버스 혹은 공간의 벽에, 가늘게 자른 라인테이프를 겹쳐 쌓아 촘촘하게 박힌 검은 형상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직선과 곡선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과정을 거쳐 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제한적으로 표현된다.
본인의 작업은 본질적 용도에서 벗어나 물질적 속성의 ‘불편함’과 현대사회 안에서의 ‘불편한’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라인테이프 작업을 ‘불편한 드로잉’ 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관계 속에 얽혀 있는 복잡 미묘한 심리, 미처 표현되지 못한 생각과 타인과의 오해 등 감정의 파편은 이미지와 함께 깨알만한 텍스트가 들어간 드로잉으로 수집된다. 수집된 이미지는 오랜 작업 과정에서 시간의 단절이 주는 다양한 감정의 축적을 보여주는 가느다란 라인테이프의 선으로 조율된다. 그리고 외부에 실재하는 시공간적 제약을 인식하는 동시에 실존공간의 구조적 한계 위에서 스스로 감정을 통제해 가며 그리듯, 칠하듯, 쌓고 겹치면서 형태를 구축하여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검정 라인테이프라는 매체의 ‘불편한’ 표현으로 다시금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면서 감정에만 집착하지 않는 이성적인, 이상적인 ‘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기술적 감각만이 아닌 내재된 이면을 드러내려고 한다. 테이프의 쌓기 또는 곡선과 직선으로만 나타내는 추상적 형상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편한 생각을 감추려 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없는 듯 하지만, 라인테이프가 그려진 방안에서 본인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며 이렇게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전윤정 작가노트
그 동안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노트 모서리에 낙서를 하면서 마음 속의 생각들을 끄적여왔다. 습관적으로 써내려간 낙서 위에 또 다시 겹쳐 그리거나 귀에 맴도는 단어들을 써내려가며 나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 소소한 ‘생각과 감정’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느다란 펜으로 매우 작게 그리다가 점차 크게 하거나 유기적인 형태로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이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색에 대한 즉각적인 감정에만 집착하는 한계를 느낀 후, 점차 색을 배제하고 펜으로만 작업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그리고 오랜 고민과 탐색 끝에 마침내 지금의 작업에서 사용하는 검은색 라인테이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캔버스 혹은 공간의 벽에, 가늘게 자른 라인테이프를 겹쳐 쌓아 촘촘하게 박힌 검은 형상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직선과 곡선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과정을 거쳐 한정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제한적으로 표현된다.
본인의 작업은 본질적 용도에서 벗어나 물질적 속성의 ‘불편함’과 현대사회 안에서의 ‘불편한’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라인테이프 작업을 ‘불편한 드로잉’ 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관계 속에 얽혀 있는 복잡 미묘한 심리, 미처 표현되지 못한 생각과 타인과의 오해 등 감정의 파편은 이미지와 함께 깨알만한 텍스트가 들어간 드로잉으로 수집된다. 수집된 이미지는 오랜 작업 과정에서 시간의 단절이 주는 다양한 감정의 축적을 보여주는 가느다란 라인테이프의 선으로 조율된다. 그리고 외부에 실재하는 시공간적 제약을 인식하는 동시에 실존공간의 구조적 한계 위에서 스스로 감정을 통제해 가며 그리듯, 칠하듯, 쌓고 겹치면서 형태를 구축하여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검정 라인테이프라는 매체의 ‘불편한’ 표현으로 다시금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면서 감정에만 집착하지 않는 이성적인, 이상적인 ‘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기술적 감각만이 아닌 내재된 이면을 드러내려고 한다. 테이프의 쌓기 또는 곡선과 직선으로만 나타내는 추상적 형상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편한 생각을 감추려 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없는 듯 하지만, 라인테이프가 그려진 방안에서 본인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며 이렇게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전윤정 작가노트
겹쳐진 실재, 그 속의 환영
너무나 확고한 이미지에 잔잔한 바람이 분다.
바람이 가져오는 흔들림에
마음도 일부러 흔들려보고
바람결 따라 손짓도 따라가 본다.
마음에 묶인 덩어리가
결 끝에 그냥 한번 흔들려본다.
흔들리는 척한다.
전윤정 작업의 첫인상은 긴 겨울을 보낸 일기의 묶음을 툭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공유되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뒤섞이고 감춰져 있어서 여러 겹의 암호로 싸여있는 것 같았다. 2018 봄의 시작에서 IKKI에 찾아온 작업 <블랙 헤어 라푼젤(Black Hair Rapunzel)>은 동화를 차용한 제목처럼 이야기를 쌓아 담아낸 큰 책이다.
그의 작업은 추상적 형태로 쌓아올린 라인 테이프와 그것들 사이의 층차, 그리고 견고함을 위해 칠해진 마감재의 끈적하면서도 매끈한 결과물과 마주하게 된다. 검은 선들은 제목처럼 긴 머리카락을 연상시킨다. 길고 긴,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은 오랜 기간의 적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시간을 품은 머리카락은 기억의 산물이기도 하다. 모든 일의 흔적이 머리카락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블랙 헤어 라푼젤>은 라인 테이프가 쌓아 올려진 층차만큼 여러 이야기가 겹치고 겹쳐있다. 이야기는 드로잉에서 시작된다.
라인 테이프처럼 단색 얇은 선으로 채워지는 드로잉은 캔버스 작업과 비교해보면 신체, 나무, 물방울 등 형상이 더 또렷이 나타난다. 그래서인지 한 장 한 장 이야기가 구성되고 피어나는 느낌을 받는다. 채워진 선 사이로 얼굴 없는(얼굴을 구분할 수 없는) 신체가 드러난다. 얼굴 없는 몸은 선들 사이에서 헤엄치고 때로는 벗어나며 순간 훅 빨려 들어간다. 이 무명의 몸은 이중적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강박하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치다가도 동시에 강박의 소용돌이를 즐기며 그 안에서 위로와 휴식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무명의 몸과 몸을 연결하는 선이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연결하고 있다. 선은 날카로운 침과 가시가 되어 공격하다가도 깊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물이 되기도 하며 바람결에 누운 풀더미가 되어 그 흐름에 몸을 숨겨주기도 한다. 또한, 선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는 생각, 옥죄어오는 생각이 퇴적된 머리카락이 되어 스스로 감싸고 이어나간다. 단절이 모여 흐름을 이룬다. 주인 없는 몸,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기 싫었던 몸은 스스로 차분히 기록해가며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실재의 ‘불편한’ 이야기들은 테이프를 쌓아 올리는 반복적 행위로 만들어진 추상적 형상 안에 감춰진다. (실제로 작가는 일련의 이야기와 감정을 감추고 싶다고 언급하고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던 것 같다.) ‘불편한’ 이야기는 실재이고 외상으로 남았다. 외상을 감추려 하지만 감춰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상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재가 재현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재는 재현될 수 없고 단지 반복될 수만 있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 “반복은 재생산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듯이 반복은 열린 개념이다. 반복적 행위와 그에 따른 강박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이란 행위를 통한 실재의 재현은 실재를 가릴(screen) 수 있으며 그 변화의 결과물을 통해 실재를 가리킬(point) 수 있다. <블랙 헤어 라푼젤>에서 실재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졌고 고정된 흔적으로 ‘반복’되었다. 그리고 동적인 요소, AR(Augmented Reality)이 더해짐으로써 흔적 안에 감춰졌던 이야기들을 환영처럼 드러내며 실재를 환기한다. 라캉은 이 지점에서 주체의 지각과 의식 사이에서 실재는 반복의 스크린을 파열시킨다(rupture)고 언급하며 이러한 외상적 지점을 투셰(tuché)라고 정의했다.[i] 라캉이 언급한 파열이 <블랙 헤어 라푼젤>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현의 반복이 정신분석학에서의 행위의 변주(라캉)와 예술에서의 행위 반복(전윤정)이라는 차이도 고려해야겠지만 실재의 환기 요소에 이전과는 다른 매체(AR)가 사용되었다는 점도 그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열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의식 상태에서의 아련함과 외로움, 스산함과 잔잔함이 느껴진다.
잠들기 전 침대의 저 아래로 몸이 내려가고 정신은 또렷해지는 온전한 나를 느끼는 그 찰나가 있다. 전윤정의 작업은 그가 되는 온전한 순간의 기록이다. 어쩌면 그의 작업 앞에서 마주 서게 되는 것은 자신이 되는 그 순간이다. 자유롭지만 답답한, 흐릿하면서도 선명해지는 기억과 잊힘, 외로우면서도 편안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긴 겨울 여행의 기록은 침잠하나 또렷하게 남았다.
박우진
[i]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The Return of Real』, 이영욱, 조주연, 최현희 옮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3, p.212.
조동광 展 / JO, DONGKWANG / 趙東光 / 대환영 Daehwanyoung / 2017. 10.01 - 12.29
대환영
10/1/2017하얀색 방을 뒤적거려 약간의 잔해들을 차 뒷편에 싣고 다시 빗길을 달렸다. 비가 점점 거세지더니 제법 굵은 빗방울이 창문에 경쾌한 타격음을 내며 빠르게 달려든다. 내달리는 차의 속도에 비례하여 빗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빗물은 유리창에 짓이겨져 창밖의 시야를 왜곡한다. 와이퍼는 바쁜 와중에 얼룩한 표면의 반대편을 슬쩍슬쩍 들춘다. 옆자리 운전사의 무어라 알아 들을수 없는 말이 빗소리와 뒤섞인다. ..비현실적이다.. 머리 속 신경 다발이 한꺼번에 끊어진걸까? 아니면 실제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차를 잡아 탄걸까? 문득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 라이카라는 개가 떠올랐다.
.
.
.
09/22
10:25pm
내일은 부천에 있는 새로운 놀이공원을 간다. 현재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곳이다. 나는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몇몇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다.
.
.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는 은하 열차를 타듯 미끄러져 내려가는 결말을 따라간다.
하기사.. 언젠가 끝이 나긴 난다.
여기 ‘유예된 종말’은 화물칸에 실린 잔해들과 함께 할 운명이다.
실은 엔딩의 결과가 중요했던 건 아니었다.
정작 모든 관심은 ‘목격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마광수가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아이디 ‘광마’로부터 오래전 받은 짤막한 메시지를 열었다.
‘대환영 입니다.’
.
조동광 작가노트
DAEHWANYOUNG
Fumbling in a white room and put some fragments in the rear of my car, I was in a car again. As rains fall fiercely, thick raindrops dash to hit the front window with delightful striking sounds. Raindrop sounds amplified by corresponding with the speed of car driving and rains are trampled on the window, thus obstructing outside views. Windshield wiper nimbly lifts the opposite part of stained surface. Driver’s murmuring are mingled with rain sounds … so unreal…were nerve clusters in my brain disconnected at the same time or did I pick up the car bound for another dimension? An idea that a dog named Laika that flew up to the universe by the artificial satellite suddenly came across my mind.
.
.
.
09/22
10:25pm
I will go to a new amusement park in Bucheon tomorrow. It is not operated anymore. I am supposed to meet new people, some of whom are acquainted with me.
.
.
I follow the conclusion as if sliding down spirally on a galaxy railway spirally.
But the end always comes.
“Delayed end” herein is doomed to be with debris loaded on the freight car.
In fact, end was not so important.
The attention was focused on who “the witness was.
I heard the news that Novelist Ma Gwang-su was dead this morning.
I opened up a short message received from ID “Gwangma.”
It said “Big Welcome.”
JO, DONGKWANG
10/1/2017하얀색 방을 뒤적거려 약간의 잔해들을 차 뒷편에 싣고 다시 빗길을 달렸다. 비가 점점 거세지더니 제법 굵은 빗방울이 창문에 경쾌한 타격음을 내며 빠르게 달려든다. 내달리는 차의 속도에 비례하여 빗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빗물은 유리창에 짓이겨져 창밖의 시야를 왜곡한다. 와이퍼는 바쁜 와중에 얼룩한 표면의 반대편을 슬쩍슬쩍 들춘다. 옆자리 운전사의 무어라 알아 들을수 없는 말이 빗소리와 뒤섞인다. ..비현실적이다.. 머리 속 신경 다발이 한꺼번에 끊어진걸까? 아니면 실제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차를 잡아 탄걸까? 문득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 라이카라는 개가 떠올랐다.
.
.
.
09/22
10:25pm
내일은 부천에 있는 새로운 놀이공원을 간다. 현재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곳이다. 나는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 몇몇은 이미 아는 사람들이다.
.
.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는 은하 열차를 타듯 미끄러져 내려가는 결말을 따라간다.
하기사.. 언젠가 끝이 나긴 난다.
여기 ‘유예된 종말’은 화물칸에 실린 잔해들과 함께 할 운명이다.
실은 엔딩의 결과가 중요했던 건 아니었다.
정작 모든 관심은 ‘목격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마광수가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아이디 ‘광마’로부터 오래전 받은 짤막한 메시지를 열었다.
‘대환영 입니다.’
.
조동광 작가노트
DAEHWANYOUNG
Fumbling in a white room and put some fragments in the rear of my car, I was in a car again. As rains fall fiercely, thick raindrops dash to hit the front window with delightful striking sounds. Raindrop sounds amplified by corresponding with the speed of car driving and rains are trampled on the window, thus obstructing outside views. Windshield wiper nimbly lifts the opposite part of stained surface. Driver’s murmuring are mingled with rain sounds … so unreal…were nerve clusters in my brain disconnected at the same time or did I pick up the car bound for another dimension? An idea that a dog named Laika that flew up to the universe by the artificial satellite suddenly came across my mind.
.
.
.
09/22
10:25pm
I will go to a new amusement park in Bucheon tomorrow. It is not operated anymore. I am supposed to meet new people, some of whom are acquainted with me.
.
.
I follow the conclusion as if sliding down spirally on a galaxy railway spirally.
But the end always comes.
“Delayed end” herein is doomed to be with debris loaded on the freight car.
In fact, end was not so important.
The attention was focused on who “the witness was.
I heard the news that Novelist Ma Gwang-su was dead this morning.
I opened up a short message received from ID “Gwangma.”
It said “Big Welcome.”
JO, DONGKWANG
<걸음보다 느린 배영>: 망막의 저편과 사물의 질서
이 예언가들(초현실주의자들)은…이러한 사물들 속에 숨겨진 '분위기'의 엄청난 괴력을 폭발시킨다.(벤야민)
1. 색채와 형태는 미술사의 오래된 범주였다. 둘 간의 관계는 시대마다 엎치락뒤치락 하였다. 친숙한 동료일 때도 있었고 지고의 적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동료일 때라도 둘의 지위가 같은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개념을 지향하는 형태가 색채를 다스리고 억누르는 관계였다. 이것은 그림이 오랫동안 글자에 종속됐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역시 확인된다. ‘시는 회화와 함께ut pictura poesis’라는 테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일러준다. 그림은 글자를 닮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에 들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술에서 ‘선적인 것’이 점차 물러나고 ‘회화적인 것’이 득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렘브란트가 이러한 양상의 시작이라면 인상주의는 완성일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색채에게 마냥 유리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얼마 후 현대미술은 ‘망막 너머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지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곳은 대체 어떠한 곳일까. 조공광의 <걸음보다 느린 배영>이 흥미로운 것은 그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곳의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를 살며시 들추기 때문이다. 색채의 작은 반란, 혹은 감추기 힘든 욕망을 말이다.
2. 조동광은 사물의 변용(기능변화)을 작업의 원칙으로 삼는다. 이 방법은 첫 번째 개인전 <트로피아>(2010) 때부터 견지한 것으로, 주로 ‘발견된 사물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재조립한다. <걸음보다 느린 배영>도 이러한 방법이 역력히 작동한다. 고무호수, 철망, 솜, 화분, 밥상, 벽돌, 입간판이 모여서 생소한 설치가 구성된다. 서로가 어디서 구한 것들인지 모를 사물들이 조동광의 규칙에 따라 기묘한 ‘사물의 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조동광이 선택한 질료와 방법은 언어와 비슷하다. 여기서 질료는 낱말이고 방법은 문법에 해당될 것이다. 자의적인 규칙에 따라 의미를 부여받고 서로 간에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러한 경향은 일찍이 아상블라주가 지향한 것이다. 제 1의 자연이 아니라 제 2의 자연(문화)에서 질료를 구하고, 조형의 의지를 버리고 문법과 같은 규칙을 따르는 것. 자연을 모방한 소리에서 문화의 찌꺼기 같은 소음을 수집해 ‘연주’를 했던 현대음악과 동일한 태도다. (자연적인) 조화가 아니라 (인공적인) 혼돈이 펼쳐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역시 현대미술과 동일한 결과다.
3. 하지만 작가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사실 그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무엇보다 <걸음보다 느린 배영>에서 ‘조형의지’가 확실하게 약화됐다. <트로피아>의 작품들은 기능이 변하더라도 애초의 형태를 견지했고, 둘 간의 긴장이 작품의 핵심으로 작동했다. 트로피를 질료로 삼았던 작품이 대표적이다. 트로피를 뼈대로 여러 가지 소품을 재조립했는데, 적어도 트로피의 외형은 온전히 유지됐다. 그러나 <걸음보다 느린 배영>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의지는 찾기 어렵다. 모든 작업들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닥에 옆으로 펼쳐놓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갤러리 벽면에 판자 몇 개를 수평으로 몇 개 이어붙인 작업이 있지만, 딱히 구성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분홍빛 색감 때문에 평면의 성격이 강조될 따름이다. 즉 자의적인 단어에 자의적인 문법에 따르는 언어에 전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위로 솟구치는 조형의지에서 옆으로 펼쳐지는 문법으로 확실하게 다가간 것이다. “인상주의에서 수립된 망막적인 경계들을 뚫고 언어・사유・시각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재스퍼 존스) 현대미술의 진앙인 뒤샹이 그랬던 것처럼, 조동광은 확실하고 착실하게 ‘망막 너머의 세계’로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4. 현대미술에서 색채와 형태는 유효한 범주가 아닐 것이며, 다양한 양식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범주를 해체했다. 신고전주의 등 몇 차례 주기적으로 전통적 범주의 욕망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현대미술이란 맥락에서 반동이나 이단처럼 간주되는 게 보통이었다. 조동광 역시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바탕은 (언어적) 개념을 지향하는 현대미술의 경향을 고스란히 따른다. 그런데 말이다. 약화됐다고 해서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색감의 욕망을 감추지 못한 작업이 있기 때문이다. 벽면에 파란색 계통의 평면이 배경처럼 자리하고, 분홍색 패트병과 노란색 발판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이 작업. 뭐랄까, 기껏 망막을 힘들게 넘었더니, 또 다시 마주친 게 색채라는 것이다. 예전과 같은 조형의지는 뒤로 숨었지만, 색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통적 미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5.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은 발칙한 상상을 해보게 된다. 발견된 사물에 구애받지 말고, 본인이 인위적으로 구성한 사물의 질서와 색채를 ‘의식적으로’ 충돌시켜 보면 어떨까. 오픈 직전까지 작품의 색감을 맞추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일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성공한다면, 망막 너머의 세계의 너머의 곳일 테니까 말이다.
김상우(미술평론)
< The Backstroke Slower than a Walk>: Beyond the retina and the order of things
These prophets (surrealists) explode super-ultra strength of an ‘atmosphere’ hidden in these things. (Walter Benjamin)
1. Colors and shapes were long categories in the history of ar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urned over and over every era. They were used to be friendly companions, or the severest enemies. However, the positions were not the same even when they were companions. Usually, colors were ruled and suppressed by shapes aiming at concepts.
This is found in a historical fact that pictures had been subordinate to letter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thesis, ‘Poetry is along with paintings’ – (ut pictura poesis) tells about this situation accurately. Pictures wanted to resemble letters. But things began to change in modern times. ‘Something linear’ disappeared in art by gradation and ‘something pictorial’ began to be dominant.
Provided Rembrandt is the beginner of this aspect, impressionism would be a finish. But the situation was not favorable to colors all the time. After a while, contemporary art began to aim at ‘the world beyond the retina’ in earnest. Then where is that place?
The reason why <The Backstroke Slower than a Walk> of Dong-kwang Jo is interesting is it shows a section of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it gently reveals the problems which are hard to ignore like a little revolt of colors, or a desire that is hard to conceal.
2. Dong-kwang Jo founds his principles of work on transformation (functional changes) of things. This has been insisted since his first private exhibition, ‘<Tropia>(2010) and mostly, he gathers ’discovered things’ and re-assemble them, based on his own rule. This method vividly works in <The Backstroke Slower than a Walk>. Rubber hose, wire netting, cotton, flower pots, tables, bricks and standing signboards form a unfamiliar installation together. Although you cannot know where things come from, an odd ‘order of things’ is created according to the rule of Dong-kwang Jo. Accordingly, the substance and the method chosen by Dong-kwang Jo are similar to language. Here, the substance refers to a word and the method refers to grammar. According to the arbitrary rule, they are given meanings and the relationship is formed. As you may know, this tendency was oriented towards by assemblage early. This is getting substances from the second nature (culture), not the first nature, giving up the will of modeling and following the rules, such as grammar. This is the same attitude as modern music which collected noise like waste of culture from sound copying nature and ‘played’. It is natural that not a (natural) harmony, an (artificial) chaos was brought about. This is also the same outcome as contemporary art.
3. But it was not that the artist did not change and in fact, that is an interesting point. Above all, it is clear that the ‘will of modeling’ weakened in <The Backstroke Slower than a Walk>. The works of <Tropia> stuck to the original forms, even though the functions were varieties and the tension between the two functioned as the key of the works.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work applying a trophy as a substance. He re-assembled several props by using a trophy as the framework and at least, the appearance of the trophy was preserved as it was.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is type of will in this exhibition. Since all the works are laid out sideways on the floor, as explained earlier. There are some boards linked horizontally on the wall of the gallery, but it is difficult to see the will to construct. It rather st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plane due to the pink color. In other words, it is much closer to the language following arbitrary words and arbitrary grammar and clearly approaches the grammar spreading sideways from the will of modeling soaring over. “It is reaching the domain in which language・thinking・sight influence each other, beyond the retinal boundaries established in impressionism.” (Jennifer Johns) As Duchamp, the seismic centre of contemporary art, did, Dong-kwang Jo seems to cross the ‘world beyond the retina’ confidently and stably.
4. In modern art, colors and shapes might not be effective categories and a variety of styles have dismantled these categories in their own ways. Although some desire of a traditional category like neo-classicism used to come out several times on a regular basis, but commonly, it was regarded as a revolt or heresy in the context of modern art. This is the same as Dong-kwang Jo. The basic background intactly obeys with the tendency of modern art that is oriented towards the (linguistic) concept.
Nevertheless, it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even though it weakened, seeing that there is a creation not to conceal the desire of colors. In this creation, the blue plane is set on the wall like the background and the pink plastic bottle and the yellow foothold strongly stand out. It is like... it crossed the retina with difficulty, but encounters colors once again. It appears as if it reveals the desire of traditional art by revealing colors, though the will of modeling is hidden behind.
5. An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such desire ‘exists’. Therefore, I have a little impertinent imagination. What if we make the artificial order of things created by individuals and colors come into conflict ‘consciously’, irrespective of discovered things? Seeing him match the colors of the works just until the opening, I am curious of what outcome it would bring. If it is successful, we would see the world beyond the retina.
Sangwoo Kim (Art critic)
이 예언가들(초현실주의자들)은…이러한 사물들 속에 숨겨진 '분위기'의 엄청난 괴력을 폭발시킨다.(벤야민)
1. 색채와 형태는 미술사의 오래된 범주였다. 둘 간의 관계는 시대마다 엎치락뒤치락 하였다. 친숙한 동료일 때도 있었고 지고의 적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동료일 때라도 둘의 지위가 같은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개념을 지향하는 형태가 색채를 다스리고 억누르는 관계였다. 이것은 그림이 오랫동안 글자에 종속됐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역시 확인된다. ‘시는 회화와 함께ut pictura poesis’라는 테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일러준다. 그림은 글자를 닮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에 들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술에서 ‘선적인 것’이 점차 물러나고 ‘회화적인 것’이 득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렘브란트가 이러한 양상의 시작이라면 인상주의는 완성일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색채에게 마냥 유리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얼마 후 현대미술은 ‘망막 너머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지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곳은 대체 어떠한 곳일까. 조공광의 <걸음보다 느린 배영>이 흥미로운 것은 그 세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곳의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를 살며시 들추기 때문이다. 색채의 작은 반란, 혹은 감추기 힘든 욕망을 말이다.
2. 조동광은 사물의 변용(기능변화)을 작업의 원칙으로 삼는다. 이 방법은 첫 번째 개인전 <트로피아>(2010) 때부터 견지한 것으로, 주로 ‘발견된 사물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재조립한다. <걸음보다 느린 배영>도 이러한 방법이 역력히 작동한다. 고무호수, 철망, 솜, 화분, 밥상, 벽돌, 입간판이 모여서 생소한 설치가 구성된다. 서로가 어디서 구한 것들인지 모를 사물들이 조동광의 규칙에 따라 기묘한 ‘사물의 질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조동광이 선택한 질료와 방법은 언어와 비슷하다. 여기서 질료는 낱말이고 방법은 문법에 해당될 것이다. 자의적인 규칙에 따라 의미를 부여받고 서로 간에 관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러한 경향은 일찍이 아상블라주가 지향한 것이다. 제 1의 자연이 아니라 제 2의 자연(문화)에서 질료를 구하고, 조형의 의지를 버리고 문법과 같은 규칙을 따르는 것. 자연을 모방한 소리에서 문화의 찌꺼기 같은 소음을 수집해 ‘연주’를 했던 현대음악과 동일한 태도다. (자연적인) 조화가 아니라 (인공적인) 혼돈이 펼쳐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역시 현대미술과 동일한 결과다.
3. 하지만 작가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사실 그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무엇보다 <걸음보다 느린 배영>에서 ‘조형의지’가 확실하게 약화됐다. <트로피아>의 작품들은 기능이 변하더라도 애초의 형태를 견지했고, 둘 간의 긴장이 작품의 핵심으로 작동했다. 트로피를 질료로 삼았던 작품이 대표적이다. 트로피를 뼈대로 여러 가지 소품을 재조립했는데, 적어도 트로피의 외형은 온전히 유지됐다. 그러나 <걸음보다 느린 배영>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의지는 찾기 어렵다. 모든 작업들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닥에 옆으로 펼쳐놓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갤러리 벽면에 판자 몇 개를 수평으로 몇 개 이어붙인 작업이 있지만, 딱히 구성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분홍빛 색감 때문에 평면의 성격이 강조될 따름이다. 즉 자의적인 단어에 자의적인 문법에 따르는 언어에 전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위로 솟구치는 조형의지에서 옆으로 펼쳐지는 문법으로 확실하게 다가간 것이다. “인상주의에서 수립된 망막적인 경계들을 뚫고 언어・사유・시각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재스퍼 존스) 현대미술의 진앙인 뒤샹이 그랬던 것처럼, 조동광은 확실하고 착실하게 ‘망막 너머의 세계’로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4. 현대미술에서 색채와 형태는 유효한 범주가 아닐 것이며, 다양한 양식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범주를 해체했다. 신고전주의 등 몇 차례 주기적으로 전통적 범주의 욕망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현대미술이란 맥락에서 반동이나 이단처럼 간주되는 게 보통이었다. 조동광 역시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바탕은 (언어적) 개념을 지향하는 현대미술의 경향을 고스란히 따른다. 그런데 말이다. 약화됐다고 해서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색감의 욕망을 감추지 못한 작업이 있기 때문이다. 벽면에 파란색 계통의 평면이 배경처럼 자리하고, 분홍색 패트병과 노란색 발판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이 작업. 뭐랄까, 기껏 망막을 힘들게 넘었더니, 또 다시 마주친 게 색채라는 것이다. 예전과 같은 조형의지는 뒤로 숨었지만, 색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통적 미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5.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은 발칙한 상상을 해보게 된다. 발견된 사물에 구애받지 말고, 본인이 인위적으로 구성한 사물의 질서와 색채를 ‘의식적으로’ 충돌시켜 보면 어떨까. 오픈 직전까지 작품의 색감을 맞추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일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성공한다면, 망막 너머의 세계의 너머의 곳일 테니까 말이다.
김상우(미술평론)
< The Backstroke Slower than a Walk>: Beyond the retina and the order of things
These prophets (surrealists) explode super-ultra strength of an ‘atmosphere’ hidden in these things. (Walter Benjamin)
1. Colors and shapes were long categories in the history of ar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urned over and over every era. They were used to be friendly companions, or the severest enemies. However, the positions were not the same even when they were companions. Usually, colors were ruled and suppressed by shapes aiming at concepts.
This is found in a historical fact that pictures had been subordinate to letter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thesis, ‘Poetry is along with paintings’ – (ut pictura poesis) tells about this situation accurately. Pictures wanted to resemble letters. But things began to change in modern times. ‘Something linear’ disappeared in art by gradation and ‘something pictorial’ began to be dominant.
Provided Rembrandt is the beginner of this aspect, impressionism would be a finish. But the situation was not favorable to colors all the time. After a while, contemporary art began to aim at ‘the world beyond the retina’ in earnest. Then where is that place?
The reason why <The Backstroke Slower than a Walk> of Dong-kwang Jo is interesting is it shows a section of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it gently reveals the problems which are hard to ignore like a little revolt of colors, or a desire that is hard to conceal.
2. Dong-kwang Jo founds his principles of work on transformation (functional changes) of things. This has been insisted since his first private exhibition, ‘<Tropia>(2010) and mostly, he gathers ’discovered things’ and re-assemble them, based on his own rule. This method vividly works in <The Backstroke Slower than a Walk>. Rubber hose, wire netting, cotton, flower pots, tables, bricks and standing signboards form a unfamiliar installation together. Although you cannot know where things come from, an odd ‘order of things’ is created according to the rule of Dong-kwang Jo. Accordingly, the substance and the method chosen by Dong-kwang Jo are similar to language. Here, the substance refers to a word and the method refers to grammar. According to the arbitrary rule, they are given meanings and the relationship is formed. As you may know, this tendency was oriented towards by assemblage early. This is getting substances from the second nature (culture), not the first nature, giving up the will of modeling and following the rules, such as grammar. This is the same attitude as modern music which collected noise like waste of culture from sound copying nature and ‘played’. It is natural that not a (natural) harmony, an (artificial) chaos was brought about. This is also the same outcome as contemporary art.
3. But it was not that the artist did not change and in fact, that is an interesting point. Above all, it is clear that the ‘will of modeling’ weakened in <The Backstroke Slower than a Walk>. The works of <Tropia> stuck to the original forms, even though the functions were varieties and the tension between the two functioned as the key of the works.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work applying a trophy as a substance. He re-assembled several props by using a trophy as the framework and at least, the appearance of the trophy was preserved as it was.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is type of will in this exhibition. Since all the works are laid out sideways on the floor, as explained earlier. There are some boards linked horizontally on the wall of the gallery, but it is difficult to see the will to construct. It rather st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plane due to the pink color. In other words, it is much closer to the language following arbitrary words and arbitrary grammar and clearly approaches the grammar spreading sideways from the will of modeling soaring over. “It is reaching the domain in which language・thinking・sight influence each other, beyond the retinal boundaries established in impressionism.” (Jennifer Johns) As Duchamp, the seismic centre of contemporary art, did, Dong-kwang Jo seems to cross the ‘world beyond the retina’ confidently and stably.
4. In modern art, colors and shapes might not be effective categories and a variety of styles have dismantled these categories in their own ways. Although some desire of a traditional category like neo-classicism used to come out several times on a regular basis, but commonly, it was regarded as a revolt or heresy in the context of modern art. This is the same as Dong-kwang Jo. The basic background intactly obeys with the tendency of modern art that is oriented towards the (linguistic) concept.
Nevertheless, it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even though it weakened, seeing that there is a creation not to conceal the desire of colors. In this creation, the blue plane is set on the wall like the background and the pink plastic bottle and the yellow foothold strongly stand out. It is like... it crossed the retina with difficulty, but encounters colors once again. It appears as if it reveals the desire of traditional art by revealing colors, though the will of modeling is hidden behind.
5. An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such desire ‘exists’. Therefore, I have a little impertinent imagination. What if we make the artificial order of things created by individuals and colors come into conflict ‘consciously’, irrespective of discovered things? Seeing him match the colors of the works just until the opening, I am curious of what outcome it would bring. If it is successful, we would see the world beyond the retina.
Sangwoo Kim (Art critic)
도저킴 展 / DOZER KIM / 쉼을 위한 변주 Variation For Rest / 2017. 08. 07 - 09. 29
버려진 사물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의 또 다른 욕망의 깊이를 탐구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강박적 또는 암묵적인 욕망의 무게 속엔
마치 공기 중에 뿌옇게 떠도는 한 줌의 잿가루를 애써 삼키는 고행의
순간이 담겨있다.
지금, 나의 목구멍은 기억한다.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는다.
버려진 사물과 사물의 마주함 속에 비치는
잉여적 존재의 치부됨을
그리고 그 안의 불안감을
나는 그 불안을 만끽하며
나의 욕망을 마주한 체
멈출 수 없는 욕망의 무게를 관망한다.
그리고 기약한다.
그 어느 날의 쉼을
도저킴 작가노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강박적 또는 암묵적인 욕망의 무게 속엔
마치 공기 중에 뿌옇게 떠도는 한 줌의 잿가루를 애써 삼키는 고행의
순간이 담겨있다.
지금, 나의 목구멍은 기억한다.
다시금 호흡을 가다듬는다.
버려진 사물과 사물의 마주함 속에 비치는
잉여적 존재의 치부됨을
그리고 그 안의 불안감을
나는 그 불안을 만끽하며
나의 욕망을 마주한 체
멈출 수 없는 욕망의 무게를 관망한다.
그리고 기약한다.
그 어느 날의 쉼을
도저킴 작가노트
쉼을 위한 변주
도저 킴은 버려지거나 방치된 물건들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던진다. 최근의 작품 [쉼을 위한 변주] 시리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작업의 부품으로 사용되지만 의자가 공통적이다. 누군가의 자리였을 버려진 의자는 부재의 상징이자, 그자체가 다른 물건들을 아우르는 주어 같은 역할을 한다. 주어는 나머지 요소들에게 목적어나 서술어의 위치를 할당하면서 다양한 서사를 만든다. 작품을 이루는 몇몇 요소들은 문장을 이루는 어휘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가의 작업 목록에서 시리즈라고 할 만한 공통적인 기본 문법이 깔려 있다. 그의 작품에서 단어의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문장은 산문이기보다는 시이다. 도저 킴에서 수집된 사물은 산문처럼 건조하게 어떤 상황을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언어처럼 다양한 층위를 가진다. 응축적 층위들에 기대는 어법은 때로 난해할 수도 있지만, 공명하게 될 때 그 파장은 오래 남는다.
아직 작품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가 하루에 소비한 상품들의 영수증을 모아 시를 쓰려는 다다 같은 형식의 기획도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인이 생산보다는 소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낸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도저 킴이 주목한 것은 개체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는 소비품목의 증거물들이다. 게다가 거기에는 그 점포만의 메시지도 적혀 있어서 사물로 만든 시의 어휘는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진행 중인 영수증 작업은 나는 없지만 나를 대변하는 사물로 만든 서사라는 점에서, 설치작업과 연결된다. 그것들은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기 보다는 주어진 것들을 해체/구성한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에서 주로 보여 질 설치 작품에서 주체의 빈자리는 앞만 향해 달려왔을 현대인에게 휴식을 제안한다. 어떤 작품은 실제 앉아 볼 수도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어떤 작품은 현대적 삶의 조건이 그렇듯이 위태롭다.
재료들은 가창 창작 스튜디오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저 킴은 작업실을 벗어나 수개월째 구르마를 끌고 다니며 수집하는 넝마주의 같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은 초현실주의자처럼 공간을 배회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부응하는 오브제를 수집하는 여정이었다. 그 오브제들이 쉼과 관련되는 것은 초현실주의 미학에서도 발견된다. 1936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괴상한 오브제들’이 모인 전시회가 열렸다. 거기에서 초현실주의 운동의 수장인 앙드레 브르통은 ‘오브제의 위기’라는 텍스트를 쓴다. 초현실주의 오브제 전에서 브르통은 ‘오늘날 지적인 생활의 모든 병적인 증상은 휴식을 모르며,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객관화의 의지 안에 들어있음’을 성토하고, ‘몽환적인 기원을 가지는 초현실주의적 오브제를 옹호했다’고 미술사는 기록한다. 실용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은 예술이 된다. 그것도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호소하는 예술이 된다.
이때 예술은 사물에 가까워진다. 도저 킴은 우연과 필연이 복합된 이 과정을 어느 단계까지는 신나게 수행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집된 사물로 말하기는 점점 어려워졌을 것이다. 무익한 반복을 일삼는 안이함에 머물지 않는다면 말이다. 수집이 더 이상 불가능하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들기는 수집하기보다 주체의 의도와 목적, 방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된다. 사물과 예술의 차이이다. 도심에서 차로 2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마을은 땅값이 싼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는 않다. 도심도 마찬가지지만 개발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장소에서는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작가는 자기가 잠시나마 속해 있던 장소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한다. 작품의 구성요소들은 대부분 집의 일부나 집에서 나온 것들이다. 돌 위에 나무 기둥들을 세우고 그 아래 작은 의자가 있는 작품은 집을 이루는 최소한의 요소가 있다.
식탁 같은 구조를 사이에 두고 의자가 마주한 작품은 같이 먹는 식구(食口)의 의미를 떠오르게 한다. 그의 작품 속 집이나 가족은 버려진 물건들로 이루어져서인지 사라져가는 것들이 주는 멜랑콜리가 느껴진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다. 매우 현실성이 강하고 변화에도 민감한 현대의 한국인은 집이나 가족에 대한 상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현대가 전통을 변화시킨 것이지만, 압축된 근대화를 밟아온 우리의 경우 유독 속도는 빨랐다. 이러한 흐름에서 망각은 기억보다 더 진보(발전)적 가치였다. 나날의 새로움이 가능하려면 망각은 필수적이다. 기억의 억압은 새로움의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새로움은 진정 새롭지 않다. 기억은 억압되고, 예술가의 작업에서 다시 활성화된다. 고고학적 분위기를 풍기는 현대미술 작품은 폭력적 망각에 기대는 현대화에 대한 완곡한 발언인 셈이다. 낡은 사물들로 이루어진 도저 킴의 작품에서 억압되어 있던 기억은 하나씩 되살려진다.
작품의 구성요소들이 균형을 잡으러 애쓰는 것은 그러한 속도감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저항감일 수도 있다. 없어진 의자 다리 대신에 돌로 괴어 놓은 테이블은 가까스로 수평을 유지한다. 쌓인 돌들은 3개 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마치 인체처럼 보인다. 고풍스러운 의자의 디자인은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을 겹쳐 보이게 한다. 위태로운 균형 속에 걸쳐진 나무 의자가 있는 작품은 매우 복잡한 그림자를 떨군다. 쉼이란 자극이 없는 단순함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림자는 자신이 처한 심란한 상황을 감추지 않는다. 사다리 위에 침대의 매트리스가 걸쳐 있고 그 위에 옛날 초등학교 나무 의자가 걸쳐있는 작품은 불안정한 자리의 극치를 보여준다. 한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교란시키는 상시적인 해고의 그늘, 현대적 직업의 불안정성은 가장을 포함한 식구들을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다. 쇠 난로 위에 얹어 있는 의자는 그 위에 뾰족한 나무가 아니더라도 가시방석처럼 다가온다.
작은 의자 위에 죽은 식물이 있는 화분이 있는 작품은 보다 직접적으로 위기적 상황을 말한다. 사람 인(人)자 형태의 삭은 나무 위에 걸린 버려진 의자는, 그림자를 보면 더욱 확실하지만 참수된 인간을 떠올린다. 원래 나무에 있던 녹슨 못이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이다. ‘축 발전’이라고 새겨진 거대한 궤종 시계가 마룻바닥 같은 역할을 하며 의자와 나무가 마주한 작품은 광란의 속도로 질주하는 시간을 정지시킨다. 자연은 인간의 역사에 비한다면 거의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기에는 죽어야 진정한 휴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서늘한 예감마저 깔려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물건들은 도저 킴의 작품에서 먼 옛날 토템 상처럼 그렇게 서있다. 작품 재료들은 거의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한때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했던 상품이었을 것이다.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물신 되어야 성공적으로 유통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다시금 원시시대의 비합리주의를 끌어들인다. 이른바 계몽의 역설이다.
새로운 것이 밀려들어오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밀려난다. 그 속도가 빠른 만큼 낯설어지는 상품/사물도 많아진다. 역사상 그 주기가 자본주의처럼 빠른 사회는 없었다. 자본주의는 소비가 지체되면 그 자체가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빠른 폐기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며, 심지어 그것이 좋은 상품의 조건이 될 것이다. 한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은 자본가들에게는 재앙이다.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의미라도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해서 해석되는, 미술사의 반열에 올라간 예술작품들처럼 말이다. ‘쉼을 위한 변주’ 시리즈는 현대적 삶에 대한 시적 은유가 있지만 그것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오브제의 수집에 기초한 그의 작업은 애초에 재현이 아니라 제시이다. 그가 구사하는 사물의 어법은 수직, 수평, 사선 등으로 이루어진 안토니 카로나 데이비드 스미스의 조각처럼 형식주의적으로 분석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작업은 삶으로부터 분리된 정제된 재료를 사용하는 형식주의와 다르다.
그의 작업은 삶에서 나왔고 삶을 지향한다. 그것은 로잘린드 크라우스의 분류에 따른다면, ‘이성의 조각’이 아니라, 상황의 조각에 관련된다. 수집이나 발견이라는 초현실주의 미학은 맹목적 운명이나 신비 같은 계몽 이전의 가치와 보다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도 전통이 기반했던 자연과는 거리를 둔다. 초현실주의도 그렇고 도저 킴의 작품도 그렇고 자연은 배경에 머물러 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도시와 도시적 삶에서의 (무)의식이다. 그러나 도시 및 도시적 삶 또한 자연화 될 것이다. 자연은 신비하지만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부분이 밝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문명은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비합리주의를 숨긴다. 21세기의 도저 킴 작품에서는 문명의 자연화가 더 진전되어 있다. 삶은 자연과 문명 모두에 걸친다. ‘쉼’이라는 메시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지향조차도 발견된다. 그의 작품은 삶과 분명히 관계는 되지만 삶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그림이나 조각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인 재현을 따르지 않는 방식은 도저 킴이 29세에 그때까지 해왔던 음악에서 디지털 아트로 전공을 바꾸는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현대미술은 추상이 그러했듯이 ‘자유로운’--구체적인 참조대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함—음악의 상태를 갈망했지만, 음악 또한 자신의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던 것이다. 일찍이 재현주의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기도 했던 현대미술은 작곡가의 의도를 재현하는 클래식 음악이 줄 수 없는 자유로움을 주었을 것이다. ‘쉼을 위한 변주’ 시리즈에서 그는 작곡가의 의도를 재현하는 성악가가 아니라, 사물들을 직접 지휘하는 연출자가 되었다. 사물들은 작가의 의도에 완전히 투명하게 반응할 수 없다. 그것들은 제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연히 선택되어 예술계로 흘러들어 온 수수께끼의 사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설치작업 외에 사진 작업을 병행한다.
수집된 오브제들이 병치되듯이 그의 사진 작업은 꼴라주에 많이 의존한다. 개별적으로 찍어서 포토샵으로 붙여 작가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식은 설치작업과 궤를 같이 한다. 일회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설치작품을 사진으로 찍어둔 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사진을 수집의 도구로 삼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메커니즘을 설치와 공유한다는 것이다. 사진기는 공간을 배회하며 우연한 만남을 욕망하는 현대의 산책자들의 필수품이다. 또한 사진은 기계적 눈을 가지고 있어 작가의 의식만큼이나 무의식도 실어 나른다. ‘공간과 지역,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하는 도저 킴에게 도시의 주변부에는 작가의 관심을 끌만한 사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낡은 것에서 심미적인 것을 취하는 그의 작품은 대부분 이미 그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더 증폭시킨다. 30대 초반, 적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는 조형예술에 있어서만큼은 신생기의 신선함을 맘껏 누리고 있다.
이선영(미술평론가)
김소담 展 / KIM, SODAM / 金炤㘱 / Faceless / 2017. 06. 05 - 08. 05
“나의 얼굴은 풀로 되어있다”
멕시코 모든 예술계의 거장으로 활약한 ‘조도로프스키’감독은, ‘모든 예술은 인체에서 비롯 된다' 고 말했다. 나 역시 여러 소재 가운데 특히나 인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왔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인체의 부분 또는 얼굴을 변형하고 왜곡하면서 더 풍부한 인간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해 왔다.
일부 작업은 몸의 내부(장기)로부터 소재를 가지고 하거나 또는 몸의 외부(얼굴)를 이용해 왔다. 현재 하고 있는 “Portrait" 작업은 여러 얼굴이 겹쳐진다거나 지워가며 우연히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한다. 작업은 예측 불가능한 비예측성을 전제로 하며 (캔버스 위 4면을 돌려가며 작업)캔버스의 정해진 ‘봐야할 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무의식”이라는 것에 많이 의존 하게 됐다.
나는 꾸준히 내러티브적인 다른 회화방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관심이 있다.
그동안의 작업을 통해 나는 몸과 마음의 구성물들 즉, 삶의 부분을 이루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다양하게 연결 되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신체”, 즉 육체 너머의 심리적, 정신적인 무언가를 알기를 원해 왔다. 그것은 이성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며,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소통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나만의 상상력으로 소통의 체계를 만들어간다. 어쩌면 완벽한,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세상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의 태도가 나의 전부다.
김소담 작가노트
멕시코 모든 예술계의 거장으로 활약한 ‘조도로프스키’감독은, ‘모든 예술은 인체에서 비롯 된다' 고 말했다. 나 역시 여러 소재 가운데 특히나 인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왔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인체의 부분 또는 얼굴을 변형하고 왜곡하면서 더 풍부한 인간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해 왔다.
일부 작업은 몸의 내부(장기)로부터 소재를 가지고 하거나 또는 몸의 외부(얼굴)를 이용해 왔다. 현재 하고 있는 “Portrait" 작업은 여러 얼굴이 겹쳐진다거나 지워가며 우연히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한다. 작업은 예측 불가능한 비예측성을 전제로 하며 (캔버스 위 4면을 돌려가며 작업)캔버스의 정해진 ‘봐야할 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무의식”이라는 것에 많이 의존 하게 됐다.
나는 꾸준히 내러티브적인 다른 회화방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관심이 있다.
그동안의 작업을 통해 나는 몸과 마음의 구성물들 즉, 삶의 부분을 이루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다양하게 연결 되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신체”, 즉 육체 너머의 심리적, 정신적인 무언가를 알기를 원해 왔다. 그것은 이성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며,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소통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나만의 상상력으로 소통의 체계를 만들어간다. 어쩌면 완벽한,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세상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의 태도가 나의 전부다.
김소담 작가노트
이상권 展 / LEE, SANG KWON / 李相權 / 북정을 돌아보다 Bukjung, Here / 2017. 05. 01 - 06. 02
북정을 돌아보다
꽤 오래 전, 구경꾼으로 성북동 산성 길을 걷다 돌담 너머로 마을을 보았다.
비현실의 풍경처럼 마을은 멀리 있었다.
우연히 발견한 좁은 통로, 그곳으로 걸어가 마을을 만났다.
당연하게도 그 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마을의 통로였겠지만,
그때의 나에겐 마치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신기한 문처럼 느껴졌다.
오밀조밀한 길과 사연을 담은 담벼락이 내 시선에 들어왔다.
마을버스가 힘겹게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오래된 여느 마을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가끔 그곳을 찾았고, 알 수 없는 아늑함에 한결 가까워졌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인터넷의 위성촬영 지도 속에서 그곳을 보았다.
마을의 생김새가 특이했다. 올가미 모양을 닮았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뭐가 있을까, 걸으면서 가졌던 궁금증을 위성사진이 압도해 버렸다.
자연스럽게 북정마을을 그리게 되었다.
변한 듯 그대로인 듯 느리게 변화하는 마을은 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 자리엔 그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성북동 초입의 가로수 두 그루가 잘려나갔다. 가지치기 작업이려니 생각하고 무심히 봤다. 다음날 휑한 낯선 풍경! 사람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구나 싶었다. 시간이 지나 이런 저런 곡절 끝에 나무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거짓말처럼 잎을 틔어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 연한 잎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게 나무의 일이라고 말하듯이.
난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의 짓! 나무의 일!
이상권 작가노트
꽤 오래 전, 구경꾼으로 성북동 산성 길을 걷다 돌담 너머로 마을을 보았다.
비현실의 풍경처럼 마을은 멀리 있었다.
우연히 발견한 좁은 통로, 그곳으로 걸어가 마을을 만났다.
당연하게도 그 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마을의 통로였겠지만,
그때의 나에겐 마치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신기한 문처럼 느껴졌다.
오밀조밀한 길과 사연을 담은 담벼락이 내 시선에 들어왔다.
마을버스가 힘겹게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오래된 여느 마을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가끔 그곳을 찾았고, 알 수 없는 아늑함에 한결 가까워졌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인터넷의 위성촬영 지도 속에서 그곳을 보았다.
마을의 생김새가 특이했다. 올가미 모양을 닮았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뭐가 있을까, 걸으면서 가졌던 궁금증을 위성사진이 압도해 버렸다.
자연스럽게 북정마을을 그리게 되었다.
변한 듯 그대로인 듯 느리게 변화하는 마을은 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 자리엔 그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성북동 초입의 가로수 두 그루가 잘려나갔다. 가지치기 작업이려니 생각하고 무심히 봤다. 다음날 휑한 낯선 풍경! 사람은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구나 싶었다. 시간이 지나 이런 저런 곡절 끝에 나무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거짓말처럼 잎을 틔어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 연한 잎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게 나무의 일이라고 말하듯이.
난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의 짓! 나무의 일!
이상권 작가노트
3시 17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3시 17분은 생각을 하기에 좋은 시각이라고.
3시 37분. 버스가 올라간다.
4시 13분. 버스가 내려간다.
7시 26분. 버스가 올라간다.
7시 27분. 버스가 주춤한다.
7시 28분. 버스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항상 저 시각에 버스는 주춤한다. 동시에 아기를 등에 업은 할머니가 흘러내린 포대기를 바짝 챙긴다. 버스가 살짝 뒤로 밀리는 가 싶더니 바퀴가 공회전을 한다. 그러면 주춤한 할머니 등에서 어느새 껑충 올라간 아기가 기침을 한다, 콜록. 아기의 두 다리가 할머니 허리 아래서 달랑거린다. 버스가 다시 힘겹게 출발한다. 어부바를 하기엔 아기의 다리가 유난히 길게 내려와 있었다.
할머니 아직이야?
- 으응?
아직이냐고!
- 올 때 안됐다.
아니다. 올 때다. 7시 27분, 주춤한 버스가 올라가고 나면 지혜는 매연을 마시고 한 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기침을 하지 않게 됐다. 매연에 익숙해져 그런지 버스가 올라갈 때까지 지혜는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지혜가 없다.
7시 29분. 지혜가 내리지 않았다.
8시 41분. 지혜가 내리지 않았다.
9시 3분. 버스가 가볍게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유난히 긴 다리를 달랑거리던 아기와 할머니는 어느새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가로등이 켜진지 오래다. 날벌레 몇 마리가 공회전을 흉내 낸다. 가로등이 꺼진다.
6시 1분. 가벼운 버스에서 지혜가 내린다.
6시 2분. 할머니와 다리가 긴 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6시 3분. 지혜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6시 3분. 날벌레는 보이지 않았다.
지혜는 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와 아기는 꼭 붙어 잠이 들었다. 자면서도 어부바를 하고 있는 듯 아기는 할머니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 지혜는 조용히 교복을 벗고 아기 옆에 눕는다. 아기는 인기척에 할머니 등으로 더욱 밀착하고 지혜는 벽에 몸을 붙인다. 피곤한 눈이 저절로 감기다 차갑고 눅눅한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할머니의 마른기침 소리. 진짜 아침이 시작될 모양이다. 그 소리에 쓕쓕 아기가 힘차게 손가락을 빤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아기쪽으로 몸을 돌려 눕니다. 아기의 손 위에 할머니의 손이 겹쳐진다. 아기의 다른 손이 할머니의 굵은 파마머리로 향한다.
지혜 왔나?
- 응.
전화라도 하지.
- 할머니가 하면 되잖아.
……. 애기 깬다.
- 애기 아니야. 다섯 살이면 어린이야. 이제 그만 업어. 피곤해. 잔다.
토요일 아침이면 다섯 살 어린이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난다. 지혜가 잠들고 바로 어린이가 깨어난다. 어린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자 할머니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댄다, 쉬-.
할머니, 쉬? 응.
어린이가 쉬를 한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런 어린이의 고추를 턴다.
아가, 누나 자니께 쉬쉬.
- 쉬 했어.
쉬쉬-.
할머니는 연신 쉬-다. 아가는 티비를 틀어 달라 한다. 할머니는 볼륨을 최대한 줄여 아가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틀어준다. 아가는 티비에 바짝 붙어 작은 소리에 집중한다. 지혜가 돌아눕는다. 정말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간간히 작은 티비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지혜가 꿈을 꾼다. 지혜가 꿈을 꾸면 나도 꿈을 꾼다. 나는 벽이다.1)
꿈속에 지혜가 서 있다. 5시 29분.
새벽안개가 공기를 채운다, 5시 29분.
쓰레기차 한 대가 힘겹게 경사를 올라간다, 5시 29분.
참새가 내려 앉아, 작은 돌멩이를 콩콩 쪼다 날아간다, 5시 29분.
첫 차가 오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이른 시각에 대한 지혜의 꿈이다. 지혜는 한 남자를 기다렸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한 남자가 보인다. 아빠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린다. 손가락을 넣어 그 말을 꺼내고 싶다고 지혜가 생각하는 듯하다. 지혜는 연신 벙긋거린다. 아빠, 아빠, 아빠라는 벙긋거림이 지혜의 입안을 채운다. 남자가 지혜 앞에 섰다. 얼굴이 희미한 남자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첫 차가 온다. 한 바퀴 종점을 돌고 온 버스가 위태롭게 내리막길에 정차한다. 남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지혜가 버스를 탄다. 지혜는 결국 아빠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누나.
아가가 누나를 깨운다. 좋아하는 만화가 끝났다. 누나를 깨워야 한다. 흔들어 깨워도 안 되자 발로 누나 배를 찬다.
너, 죽을래?
누나가 벌떡 일어난다. 지혜다. 지혜는 누나다. 지혜가 어린이라 생각하는 저 아가의 누나.
끝났어. 틀어줘.
- 야! 그만 봐.
할머니, 누나가 나보고 ‘야’라 그랬어!
- 야! 남창수 까불지마.
남창수와 지혜가 다투는 사이 할머니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온다. 지혜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상을 받아 온다. 할머니, 남창수, 지혜가 상에 나란히 둘러앉는다. 지혜는 지혜밥을 먹고, 할머니는 할머니밥을 먹고, 남창수는 자기 밥을 먹지 못한다. 할머니 숟가락이 자꾸만 남창수 입으로 들어간다.
자꾸 그러지마. 야! 남창수 니가 먹어.
그러다 지혜가 한마디 한다. 남창수는 그냥 그대로 입만 벌린다. 식사가 끝났다. 지혜가 티브이를 튼다. 소리를 키우고 채널을 돌린다. 남창수가 좋아하는 프로에 채널을 멈춘다. 할머니가 세탁기를 돌리려 지혜의 블라우스에서 명찰을 떼어낸다. 오지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엄마다. 오지혜와 남창수의 엄마. 할머니의 딸. 여자는 집으로 들어와 지혜가 막 나온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말도 안하고 갔냐며 지혜에게 눈을 흘긴다. 남창수가 지혜보다 먼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간다. 여자는 남창수를 꼭 껴안는다. 지혜도 이불속으로 들어간다. 이불이 산처럼 높아졌다.
그냥, 잠이 안와서.
- 방에 없어서 놀랬잖아. 언제 올 거야? 어때? 방 마음에 들지?
응. 근데 몰라, 나도.
여자와 지혜가 말하는 사이, 남창수가 잠이 들었다. 할머니가 들어온다.
차는 어데 댔나.
- 몰라, 그냥 빈 데 아무데나 주차했어. 여자와 할머니의 대화가 이어진다.
전화 오겠지 뭐.
주차장이 있는 여자의 집과는 달리 지혜 동네는 주차장이 따로 없다. 지정주차구역이 있을 뿐. 지혜의 집에는 차가 없다. 여자는 지혜더러 언제 올거냐며 재촉한다. 여자는 결혼을 새로 했다. 이번엔 시집을 잘 갔다는 소문이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렸다. 지혜는 금요일마다 여자의 집에 갔다. 자신의 집과는 달리 커다란 대문이 따로 있고 그 안으로 한 참을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그야말로 대궐 같은 집이었다. 여자의 집은 지혜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마을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면 바로다. 그런 거리를 여자는 기어코 차를 가지고 온다. 구두 때문이다.
그럼, 창수는?
여자는 갑자기 조용해진다.
창수는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창수 없이는. 그리고 지혜 니는 성도 다르면서 그런다.
할머니가 톡 쏘아 붙인다. 지혜 너라도 가서 편해지고 싶다고도 덧붙인다. 여자가 서둘러 집을 나선다. 지혜가 마중을 나온다. 생각해 볼게라는 말과 함께 운전에 서툰 여자를 바라본다.
10시 10분. 버스가 내려온다.
여자는 당황한다. 버스가 멈춘다. 10시 11분.
여자는 핸들을 이리저리 돌린다. 10시 11분에서 15분.
버스가 여자 차를 스치듯 간신히 지나간다. 10시 17분.
버스 안 사람들이 여자와 차를 쳐다본다. 10시 17분까지.
간신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한다. 10시 30분.
동네가 조용하다. 간간히 버스가 지나간다. 지혜와 남창수는 성이 다르다. 그래도 둘은 여자를 엄마로 부른다. 간간히 창문 사이로 티브이 소리가 들린다. 같은 버스가 시간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지혜는 생각한다. 그 생각이 너무도 긴밀해서 알 수 가 없다. 주말 낮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티브이 소리처럼.
8시 40분. 교복을 입은 지혜가 버스에 오른다.
8시 40분. 버스가 지나간 자리에 할머니와 남창수가 서 있다.
8시 40분.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남창수가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든다.
⁝
7시 29분. 지혜가 내리지 않았다.
8시 41분. 지혜가 내리지 않았다.
할머니 등에 업힌 남창수 다리가 축 늘어진다. 잠이 들었다. 다음날 지혜는 버스에 타지 않았다. 그 다음 다음 다음 날도. 남창수는 이제 할머니 등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더 이상 지혜를 기다리지 않는다.
00: 10분. 막차가 내려간다. 할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
피서라
1) 구효서 「풍경소리』 중 “나, 나를 드러내고야 말았으니(···) 나는 다만 그런 소리일 뿐이다.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3시 17분은 생각을 하기에 좋은 시각이라고.
3시 37분. 버스가 올라간다.
4시 13분. 버스가 내려간다.
7시 26분. 버스가 올라간다.
7시 27분. 버스가 주춤한다.
7시 28분. 버스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항상 저 시각에 버스는 주춤한다. 동시에 아기를 등에 업은 할머니가 흘러내린 포대기를 바짝 챙긴다. 버스가 살짝 뒤로 밀리는 가 싶더니 바퀴가 공회전을 한다. 그러면 주춤한 할머니 등에서 어느새 껑충 올라간 아기가 기침을 한다, 콜록. 아기의 두 다리가 할머니 허리 아래서 달랑거린다. 버스가 다시 힘겹게 출발한다. 어부바를 하기엔 아기의 다리가 유난히 길게 내려와 있었다.
할머니 아직이야?
- 으응?
아직이냐고!
- 올 때 안됐다.
아니다. 올 때다. 7시 27분, 주춤한 버스가 올라가고 나면 지혜는 매연을 마시고 한 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기침을 하지 않게 됐다. 매연에 익숙해져 그런지 버스가 올라갈 때까지 지혜는 그렇게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지혜가 없다.
7시 29분. 지혜가 내리지 않았다.
8시 41분. 지혜가 내리지 않았다.
9시 3분. 버스가 가볍게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유난히 긴 다리를 달랑거리던 아기와 할머니는 어느새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가로등이 켜진지 오래다. 날벌레 몇 마리가 공회전을 흉내 낸다. 가로등이 꺼진다.
6시 1분. 가벼운 버스에서 지혜가 내린다.
6시 2분. 할머니와 다리가 긴 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6시 3분. 지혜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6시 3분. 날벌레는 보이지 않았다.
지혜는 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와 아기는 꼭 붙어 잠이 들었다. 자면서도 어부바를 하고 있는 듯 아기는 할머니 등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 지혜는 조용히 교복을 벗고 아기 옆에 눕는다. 아기는 인기척에 할머니 등으로 더욱 밀착하고 지혜는 벽에 몸을 붙인다. 피곤한 눈이 저절로 감기다 차갑고 눅눅한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할머니의 마른기침 소리. 진짜 아침이 시작될 모양이다. 그 소리에 쓕쓕 아기가 힘차게 손가락을 빤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아기쪽으로 몸을 돌려 눕니다. 아기의 손 위에 할머니의 손이 겹쳐진다. 아기의 다른 손이 할머니의 굵은 파마머리로 향한다.
지혜 왔나?
- 응.
전화라도 하지.
- 할머니가 하면 되잖아.
……. 애기 깬다.
- 애기 아니야. 다섯 살이면 어린이야. 이제 그만 업어. 피곤해. 잔다.
토요일 아침이면 다섯 살 어린이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난다. 지혜가 잠들고 바로 어린이가 깨어난다. 어린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자 할머니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댄다, 쉬-.
할머니, 쉬? 응.
어린이가 쉬를 한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런 어린이의 고추를 턴다.
아가, 누나 자니께 쉬쉬.
- 쉬 했어.
쉬쉬-.
할머니는 연신 쉬-다. 아가는 티비를 틀어 달라 한다. 할머니는 볼륨을 최대한 줄여 아가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틀어준다. 아가는 티비에 바짝 붙어 작은 소리에 집중한다. 지혜가 돌아눕는다. 정말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간간히 작은 티비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지혜가 꿈을 꾼다. 지혜가 꿈을 꾸면 나도 꿈을 꾼다. 나는 벽이다.1)
꿈속에 지혜가 서 있다. 5시 29분.
새벽안개가 공기를 채운다, 5시 29분.
쓰레기차 한 대가 힘겹게 경사를 올라간다, 5시 29분.
참새가 내려 앉아, 작은 돌멩이를 콩콩 쪼다 날아간다, 5시 29분.
첫 차가 오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 이른 시각에 대한 지혜의 꿈이다. 지혜는 한 남자를 기다렸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한 남자가 보인다. 아빠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린다. 손가락을 넣어 그 말을 꺼내고 싶다고 지혜가 생각하는 듯하다. 지혜는 연신 벙긋거린다. 아빠, 아빠, 아빠라는 벙긋거림이 지혜의 입안을 채운다. 남자가 지혜 앞에 섰다. 얼굴이 희미한 남자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첫 차가 온다. 한 바퀴 종점을 돌고 온 버스가 위태롭게 내리막길에 정차한다. 남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지혜가 버스를 탄다. 지혜는 결국 아빠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누나.
아가가 누나를 깨운다. 좋아하는 만화가 끝났다. 누나를 깨워야 한다. 흔들어 깨워도 안 되자 발로 누나 배를 찬다.
너, 죽을래?
누나가 벌떡 일어난다. 지혜다. 지혜는 누나다. 지혜가 어린이라 생각하는 저 아가의 누나.
끝났어. 틀어줘.
- 야! 그만 봐.
할머니, 누나가 나보고 ‘야’라 그랬어!
- 야! 남창수 까불지마.
남창수와 지혜가 다투는 사이 할머니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온다. 지혜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상을 받아 온다. 할머니, 남창수, 지혜가 상에 나란히 둘러앉는다. 지혜는 지혜밥을 먹고, 할머니는 할머니밥을 먹고, 남창수는 자기 밥을 먹지 못한다. 할머니 숟가락이 자꾸만 남창수 입으로 들어간다.
자꾸 그러지마. 야! 남창수 니가 먹어.
그러다 지혜가 한마디 한다. 남창수는 그냥 그대로 입만 벌린다. 식사가 끝났다. 지혜가 티브이를 튼다. 소리를 키우고 채널을 돌린다. 남창수가 좋아하는 프로에 채널을 멈춘다. 할머니가 세탁기를 돌리려 지혜의 블라우스에서 명찰을 떼어낸다. 오지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엄마다. 오지혜와 남창수의 엄마. 할머니의 딸. 여자는 집으로 들어와 지혜가 막 나온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말도 안하고 갔냐며 지혜에게 눈을 흘긴다. 남창수가 지혜보다 먼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간다. 여자는 남창수를 꼭 껴안는다. 지혜도 이불속으로 들어간다. 이불이 산처럼 높아졌다.
그냥, 잠이 안와서.
- 방에 없어서 놀랬잖아. 언제 올 거야? 어때? 방 마음에 들지?
응. 근데 몰라, 나도.
여자와 지혜가 말하는 사이, 남창수가 잠이 들었다. 할머니가 들어온다.
차는 어데 댔나.
- 몰라, 그냥 빈 데 아무데나 주차했어. 여자와 할머니의 대화가 이어진다.
전화 오겠지 뭐.
주차장이 있는 여자의 집과는 달리 지혜 동네는 주차장이 따로 없다. 지정주차구역이 있을 뿐. 지혜의 집에는 차가 없다. 여자는 지혜더러 언제 올거냐며 재촉한다. 여자는 결혼을 새로 했다. 이번엔 시집을 잘 갔다는 소문이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렸다. 지혜는 금요일마다 여자의 집에 갔다. 자신의 집과는 달리 커다란 대문이 따로 있고 그 안으로 한 참을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그야말로 대궐 같은 집이었다. 여자의 집은 지혜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마을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면 바로다. 그런 거리를 여자는 기어코 차를 가지고 온다. 구두 때문이다.
그럼, 창수는?
여자는 갑자기 조용해진다.
창수는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창수 없이는. 그리고 지혜 니는 성도 다르면서 그런다.
할머니가 톡 쏘아 붙인다. 지혜 너라도 가서 편해지고 싶다고도 덧붙인다. 여자가 서둘러 집을 나선다. 지혜가 마중을 나온다. 생각해 볼게라는 말과 함께 운전에 서툰 여자를 바라본다.
10시 10분. 버스가 내려온다.
여자는 당황한다. 버스가 멈춘다. 10시 11분.
여자는 핸들을 이리저리 돌린다. 10시 11분에서 15분.
버스가 여자 차를 스치듯 간신히 지나간다. 10시 17분.
버스 안 사람들이 여자와 차를 쳐다본다. 10시 17분까지.
간신히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한다. 10시 30분.
동네가 조용하다. 간간히 버스가 지나간다. 지혜와 남창수는 성이 다르다. 그래도 둘은 여자를 엄마로 부른다. 간간히 창문 사이로 티브이 소리가 들린다. 같은 버스가 시간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지혜는 생각한다. 그 생각이 너무도 긴밀해서 알 수 가 없다. 주말 낮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티브이 소리처럼.
8시 40분. 교복을 입은 지혜가 버스에 오른다.
8시 40분. 버스가 지나간 자리에 할머니와 남창수가 서 있다.
8시 40분.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남창수가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든다.
⁝
7시 29분. 지혜가 내리지 않았다.
8시 41분. 지혜가 내리지 않았다.
할머니 등에 업힌 남창수 다리가 축 늘어진다. 잠이 들었다. 다음날 지혜는 버스에 타지 않았다. 그 다음 다음 다음 날도. 남창수는 이제 할머니 등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더 이상 지혜를 기다리지 않는다.
00: 10분. 막차가 내려간다. 할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
피서라
1) 구효서 「풍경소리』 중 “나, 나를 드러내고야 말았으니(···) 나는 다만 그런 소리일 뿐이다.
정규옥 展 / JEONG, GYUOK / 鄭圭鈺 / 무의미의 축제 The Festival of Insignificance / 2017. 3. 01 - 4. 28
무의미의 축제
#1. The world_ pencil on paper_ 24cm x 33cm _2017 (정면28p)
#2. The world_ oil stick on paper_ 45cmx 45cm _2017 (좌3p,정면1p)
하나의 선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기계적인 선이다. 선은 내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만 어떤 세계를 보여준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한없이 멀어지기도 한다. 나는 그 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순간이 가장 황홀하다.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추락하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또 추락하고... 선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며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그대로 기꺼이 기록한다.
공간과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우주의 어떠한 점과도 다시 연결 될 수 있는 것이 이 선이다. 나의 길은 세계를 다시 새롭게 지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고 싶다.
#3. It is a small world_ Mixed Media_ installation_ 2017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그것이 사실은 곧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나는 임신 중에 하찮거나 작고 우습게 여겨지는 삶의 무의미한 행위들이 거대한 의미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면서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찾은 삶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중략) 이제 나한테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더 강력하고 더 의미심장하게 보여요.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심지어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는 곳에도, 그러니까 공포 속에도, 참혹한 전투 속에도, 최악의 불행 속에도 말이에요. 그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려면, 그리고 그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기, 이 공원에, 우리 앞에, 무의미는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무구하게,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름답게요. 바로 당신 입으로, 완벽한,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공연... ... 이유도 모른 채 까르르 웃는 아이들... ...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들이마셔 봐요, 다르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의미를 들이마셔 봐요, 그것은 지혜의 열쇠이고, 좋은 기분의 열쇠이며... ...."(147p)
밀란 쿤데라_ 무의미의 축제 중에서
정규옥 작가노트
#1. The world_ pencil on paper_ 24cm x 33cm _2017 (정면28p)
#2. The world_ oil stick on paper_ 45cmx 45cm _2017 (좌3p,정면1p)
하나의 선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기계적인 선이다. 선은 내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만 어떤 세계를 보여준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한없이 멀어지기도 한다. 나는 그 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순간이 가장 황홀하다.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추락하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또 추락하고... 선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며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그대로 기꺼이 기록한다.
공간과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우주의 어떠한 점과도 다시 연결 될 수 있는 것이 이 선이다. 나의 길은 세계를 다시 새롭게 지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고 싶다.
#3. It is a small world_ Mixed Media_ installation_ 2017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그것이 사실은 곧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나는 임신 중에 하찮거나 작고 우습게 여겨지는 삶의 무의미한 행위들이 거대한 의미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면서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찾은 삶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중략) 이제 나한테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더 강력하고 더 의미심장하게 보여요. 하찮고 의미 없다는 것은 말입니다, 존재의 본질이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심지어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는 곳에도, 그러니까 공포 속에도, 참혹한 전투 속에도, 최악의 불행 속에도 말이에요. 그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려면, 그리고 그걸 무의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려면 대체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여기, 이 공원에, 우리 앞에, 무의미는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무구하게,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름답게요. 바로 당신 입으로, 완벽한,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공연... ... 이유도 모른 채 까르르 웃는 아이들... ...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들이마셔 봐요, 다르델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의미를 들이마셔 봐요, 그것은 지혜의 열쇠이고, 좋은 기분의 열쇠이며... ...."(147p)
밀란 쿤데라_ 무의미의 축제 중에서
정규옥 작가노트
치읔 *르프랭 치읔
어느 시절 마녀가 살았다.
마녀의 얼굴은 새하얗다 못해 붉기까지 했다. 머리칼이 얼마 없는 슬픈 마녀는 형용사와 같은 이름 그대로 외로운 여인이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들판으로 나갔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바다로 발길을 돌렸다. 발가락 끝까지 치맛자락을 끌어내린 마녀는 저만치서 풍겨오는 인간들의 체취를 한껏 들이킨다. 알싸하고 콜콜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통해 폐부로 전해지려는 찰나, 마녀의 숱 적은 머리칼이 쑥쑥 자란다....... . . . . . 그녀는 마녀다.
파도가 있었다.
고독한 파도는 달빛에 쫓겨 서쪽으로 몸을 달린다. 달빛에 쫓기어 부리나케 내달린 파도의 부재 속에 널빤지 한 장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널빤지 아래로 탄력 있는 용수철이 균형을 잡는다. 고독한 파도, 잔인한 달빛, 냉철한 널빤지, 고고한 용수철, 숱 적은 마녀, 이들은 그 자체로 단두대가 된다.
발가락 끝을 고이고이 싼 마녀의 조신한 발걸음이 단두대로 향한다. 아이 같은 즐거움을 바라는 마녀는 널빤지 위로 몸을 싣는다. 동쪽 달빛에 쫓기는 파도는 마녀를 향해 돌진하고, 마녀는 본능적으로 널빤지에 납작 엎드린다. 온 힘을 다해 파도와 바람을 버텨보지만, 마녀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용수철은 달빛의 울부짖음에 힘입어 그녀를 저 멀리 바다의 끝으로 이끈다. 철없는 마녀는 ‘용수철 그네’를 타고 바다의 끝을 보고, 다시 널을 뛰어 바다 속을 내려다본다. 퐁당, 마녀가 추락한다. 바다는 미쳤다. 추락하는 순간에도 마녀는 바람이 전해주는 인간의 콜콜한 냄새를 추억하며 치렁치렁한 치맛자락을 자꾸만 끌어내린다. . . . . . .그녀가 추락한다. . . . . . .얼마 되지 않는 마녀의 숱 적은 머리칼이 자란다. . . . . . .숱 적은 머리칼이 흩날린다. . . . . . .마녀가 떨어진다.
∞
치읔치읔 도시엔 치약이 없다는 걸 명심해.
여자는 남자의 그 말을 잊었다. 오늘밤 남자와 여자는 치읔치읔 도시에 도착했다. 둘은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었다. 도시엔 정말 치약이 없었다. 치약대신 무엇으로 이를 닦아야 할까 고민하다 여자는 화장실 변기 위에 놓인 반투명색 병을 보았다. 조명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진주빛깔 병에 샴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오래 되었는지, 여자가 병을 들어 올리자 좌우로 진척하게 기울었다. 여자는 화장실 문을 빠금히 열고 남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남자는 침대 대각선으로 누워 TV를 보는 척 한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잠들어 있다. 여자는 샴푸를 한번 펌핑해 입에 넣었다. 향기로운 당근향이 입 안 가득 퍼진다. 서너 번의 칫솔질로 풍성한 거품이 인다. 여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리모컨을 꼭 쥔 채 꼼짝하지 않았다. 손에서 리모컨을 빼내려 하자 손가락에 힘을 준다. 여자는 대각선으로 뻗은 남자를 그대로 둔 채 삼각형으로 난 작은 공간에 간신히 몸을 누인다.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다리를 구부리고는 무릎에 머리를 묻는다. 깊은 숨을 내쉬자 무릎과 가슴 사이로 샴푸향이 전해진다. 여자는 그것이 재미있는 듯 연신 숨을 크게 내신다. 코끝과 인중 위로 작은 이슬이 맺힌다.
치읔치읔 도시를 다녀왔지.
내가 모두 망쳐버린 도시. 나 같은 여자는 정말 최악이라며 면전에서 침을 뱉은 도시. 추억도 없는 도시. 반추할 수 없는 도시. ㅊ의 ㅊ은 너무 가벼워. 새벽녘 입 벌린 사내 옆에서 혼자 중얼거렸지. 치읓보다 치읔. 위가 하나 더 는 기분야. 이제 세 개. 하나만 더하면 반추위(反芻胃)를 완성할 수 있을 지도. “한번 삼킨 음식을 다시 입안으로 토하여 잘 씹은 후 삼키는 것”을 반추라고 말했던가. 아마도 반추적 인간이라는 학명을 만들어야겠지. 호모 레미니시아? 호모 리콜리니우스? 호모 리코보엔스? 그럴듯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누군가에게 물었더니, 너가 시인이냐며 머리통을 갈겼지. 그래서 시인이 되었어. 그날, 치읔치읔 도시에서 침 세례를 받고 난 후 시인이 되었지. 숱 적인 시인. 마녀의 치렁치렁한 벨벳 치마를 빌려 입고 귓바퀴 뒤에 담배를 꽂은 채, 시인인척 얼굴을 숨겼지. 아마 드러냈다고 하는 말이 더 솔직할 거야. 그럴 거야. 그렇겠지.
날이 밝자 여자의 입안에서 샴푸 향이 사라졌다.
여자는 점점 무거워지는 눈을 이겨내려 연신 겹 쌍꺼풀을 만든다. 남자는 아직도 손에서 리모컨을 놓지 않았다. 여자 또한 작은 삼각형 안에 안전하게 누워있다. 침대 옆으로 난 커다란 창문에 매달린 커튼이 조금씩 살랑이기 시작한다. 아침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다. 새벽바람이라고 해야 할까? 바람이 불자 이불을 덮지 않은 남녀가 동시에 오그라든다. 여자는 더 이상 오그릴 것이 없어 오른쪽으로 돌아눕는다. 그러자 자신과 똑같이 오그라든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리모컨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잠이 들었다. 여자의 머리위로 남자의 뜨거운 날숨이 규칙적으로 불어온다. 남자가 숨을 들이쉴 때 서늘한 새벽바람이 여자의 왼쪽 팔뚝을 스치고 지나간다. 황금빛 솜털을 머금고 알맞게 부풀어 오른 털구멍들이 일제히 솟아오른다. 여자는 몸을 한 번 떨더니 남자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쳐든다. 코털을 제거한 남자의 콧구멍 속으로 오톨도톨 돌기가 솟아있다. 코 속에 털이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던 남자는 과연 이 도시에 작은 가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수염과 함께 코털도 쑥쑥 자랄 것이다. 숱 적은 마녀의 머리칼이 언젠가 자란 것처럼.
∞
마녀가 빠진 바다는 좀처럼 잔잔해 지지 않았다.
마녀가 빠지거나 빠지지 않거나 바다는 마찬가지다. 바다는 바다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추억을 하지 않는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마녀의 추억과 인간의 추억과 낙타의 추억과 악어새의 추억을 집어 삼킬 뿐이다. 파도가 서늘한 마녀를 삼키자, 뜨거운 인간의 피가 해수의 온도를 전과 동일하게 맞춰 주었다. 뜨거운 인간이 또 한 번 추락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인간의 피로 뜨거워진 바다는 얼음을 녹인다. 그 후로 인간은 추락 없이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바다가 된 지 오래다. 옛날엔 마녀가 있었지. 어느 시절 마녀가 있었다.
여자는 이상한 꿈을 꿨다.
치약이 없는 치읔치읔 도시에서 칫솔 위에 작은 해삼 하나를 얹어 놓는다. 물컹하지만 심지 있는 그것은 여자의 입 속에 들어가자마자 윗니 아랫니를 자유롭게 오가며 여자의 이빨을 훑는다. 그러다 유독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들어간 어금니 사이에 정성을 쏟는다. 여자는 어릴 적 오른쪽 두 번째 어금니에 아말감을 박아 넣은 적이 있었다. 해삼은 용케도 그것을 찾아내고 특유의 빨판을 이용해 붙였다 떼기를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쩍쩍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욕실 안으로 울려 퍼진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언제 양치질을 끝내야 할지, 언제 이것을 뱉어내야 할 지 난감해했다. 그럴 때 여자는 꿈에서 깼다. 턱뼈가 뻐근한 듯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여 본다. 여자의 콧등위로 수염이 자라 있다. 남자의 것이다. 남자의 해삼이 목젖을 건드리자 여자는 등을 거세게 요동치더니 마른 토악질을 뱉어낸다. ㅊ억-하며 해삼이 입 밖으로 튕겨 나간다. 남자의 겨드랑이에서 리모컨이 떨어진다.
∞
파도가 잠잠해질 때, 인간들은 바다가 추억을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머리에 깃털을 꽂고 왼발 오른발 이상한 발걸음으로 쩔뚝거리는 남자는 그 거짓말을 언젠가 자신이 말했었다며 추억에 잠긴다. 바다가 추억할 때 비로소 인간들은 반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수억 년 전 파도가 삼켰던 생선들이 다시 바다의 식도를 타고 기어 올라오는 것이라고. 뜨거운 피를 가진 인간들은 그것을 믿었다. 바다가 반추할 때 그 속으로 그물과 막대기와 앞뒤로 뚫린 유리병과 작살들을 내던졌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는 많은 것을 반추했다. 쓰도록 짠 위액들이 거짓말처럼 넘쳐났다. 간혹 바닷물이 인간들의 발톱 사이로 파고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면 인간들은 미간을 찡그렸다. 때론 발톱 사이가 벌어져 붉은 살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자 왼발 오른발 쩔뚝이는 한 남자가 얼른 그곳을 나오라고 소리쳤다. 잘못하다가는 발 전체가 녹아내릴 수 있다며, 바다의 소화력에 대해 떠들어댔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기억도 없이 여자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치읔치읔 도시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잠을 잔다. 당분간 그 누구도 깨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잠이 필요했고, 남자는 언제나 잠을 자는 습관을 가졌었다. 틀렸다. 남자가 눈을 뜬다. 실내화를 신지 앉은 채, 화장실로 향한다. 잠이 덜 깬 듯 터덜터덜 걷는 남자의 엉덩이 뒤로 힘없는 해삼 하나가 함께 터덜거린다. 해삼이 물을 토한다. 노란 물이 위액이라고 해도 괜찮을까? 노란 오줌을 토해낸다. 쏟아낸다. 비워낸다. 힘겹지만 시원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쏟아지는 오줌소리에 여자도 잠에서 깼다. 모든 것이 틀렸다. 여자는 잠이 더 필요했지만 깨고 말았다. 변기 속으로 거품이 인다. 남자는 거품이 이는 것을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물을 내린다. 뜨거운 오줌이 소용돌이치며 내려간다. 침대로 향하는 남자의 엉덩이 사이로 해삼이 보인다. 해삼은 물을 토해 내고 기진맥진이다. 끝에 매달린 오줌 한 방울이 핑크색 카펫 위로 떨어진다. 오줌이 떨어진 자리가 붉은 색으로 변한다. 여자는 재빨리 눈을 감는다. 여자의 눈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빛이 들어와 있었다. 눈을 감자 주홍빛 원들이 떠다닌다. 자꾸만 눈에 힘이 들어간다. 눈동자가 흔들린다. 감긴 눈꺼풀 위로 눈동자가 구른다.
∞
숱 적은 마녀가 태어난 날,
같은 움막에서 살던 한 소년의 발이 바다 속으로 녹아내렸다. 마녀와 함께 떠내려 온 양수로 소년의 문드러진 발을 씻긴다. 마녀는 태어나던 날 울지 않아 마녀가 되었다. 마녀는 입을 앙 다물고 눈을 크게 뜬 채 벌겋고 누런 양수에 발을 담근 소년을 바라본다.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날에 치르는 의식이라고 마녀는 굳게 믿었다. 마녀는 단두대에 오르기 전까지 아니, 올라서는 날에도 자신이 ‘마녀’인지 몰랐다. 그저 ‘마녀’가 자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계집아이에게 붙이는 그저 그런 이름 중의 하나. 누군가 ‘마녀’라고 부를 때, 돌아보는 이는 마녀 자신밖에 없었으므로.
양수로 발을 닦은 소년은 더 이상 바다 근처에 가지 않았다. 소년이 청년이 되던 시기, 소년은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소리들로 마녀뿐만 아니라 움막 사람들을 모조리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 언제나 앉아만 있던 청년이 된 소년은 어느 순간 스스로 일어나더니, 왼발 오른발 쩔뚝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말했고, 청년은 기적이 아니라 수 억 년 전 자신이 걸었던 때를 반추했을 뿐이라고 사람들의 말을 바꿔 주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청년의 머리위로 길고 가느다란 깃털을 하나씩 꽂아 주었다. 제법 많은 깃털이 청년의 머리위로 빽빽해지자 청년은 움막에서 가장 키가 큰 사내가 되어 있었다. 그 시절 마녀가 살았다.
그것은 앵무새 입 같기도 했다.
남자의 반이 잘려나간 검지손톱은 보기 좋을 정도로 오그라들어 있었다. 앵무새 입처럼. 꼭 감은 눈꺼풀 아래로 속눈썹이 삐져나온다. 남자는 여자의 왼쪽 눈에 오른쪽 검지를 살며시 갖다 댄다. 눈은 이내 잠잠해진다. 어느 시절 바다가 반추할 적처럼 여자의 눈은 평온해졌다. 뜨거운 눈물이 성긴 속눈썹 사이를 메운다. 살짝만 움직여도 눈물이 떨어질 태세다. 여자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눈동자를 의식한다. 남자는 그것을 알아챘는지 여자의 얼굴로 입김을 분다. 야릇한 냄새가 여자의 코를 통해 폐부로 전해진다. 밤새 위는 비워졌으리라. 텅 빈 위속으로 위액이 분비된다. 먹은 것도 없는데 남자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액을 발산했다. 때로는 그것이 식도까지 넘어오기도 했다. 식도까지 넘어온 그것을 남자는 다시 삼킨다. 그러면 위는 또다시 위액을 뿜어대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녹아내릴 만큼 강력했다. 삼켜진 위액이 다시 위액으로 소화된다. 모든 것이 소화됐다. 녹아내렸다. 위액으로 찌든 남자의 입 냄새를 맡고 있자니 여자의 속이 뒤틀린다.
손가락이 잘렸다.
언제나 바른 곳을 가리키던 손가락이었는데, 나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잘려진 손가락이 아물기 시작했다. 독수리 발톱처럼 남은 손톱이 안으로 오그라들었다. 때론 앵무새의 입 같기도 했다. 모든 것이 흔들린다. 손톱보다 작게 떨어져 나간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흔들려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지. 깨진 유리창 바람에 날리는 커튼 뒤집힌 우산 생각했다 추억의 축억 뒤집혀진 기역자 주먹쥔 연사 주먹핀 소녀 강박의 다른말 미친바람 지하의 추억 지상의 반추 우리의 저편 점증되는 인간 댄져러스 비드 틈새시장 공격 속쓰림 생각의 생각 생각했다 아는 이름 이름의 다른 말 막말 바른말 추위와 취 날것의 익힘 멍게의 냄새 콘 한 묶음 취기의 추태 ㅊ의 ㅊ 이불의 혈 새어나와 묻어나와 달리고 달려 걷기의 향수 향수의 향수 냄새의 야릇함 내음과 냄시 악지와 찔통 ㅃㅃ 땡땡의 땡땡 도열의 도열 드리의 드리 ㄷ의 ㄸ 따다가 따드려 싹뚝의 뚝딱 기억의 저편 저편의 내편..........................................................................................프로폴션널리티
∞
청년은 움막에서 가장 키가 큰 사내가 되었다. 어쩐지 머리위로 솟은 빽빽한 깃털들이 의족 같이 여겨져 사내는 그것을 벗을 수가 없었다. 의족을 벗는 순간, 깃털을 내려놓는 순간 사내는 또다시 왼발 오른발 쩔뚝거리게 되리라. 쩔뚝쩔뚝. 마녀는 사내가 옆으로 걸어갈 적에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쩔뚝쩔뚝. 그러면 키가 큰 사내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라도 한 듯 앞으로 멀어져 가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키가 큰 사내는 자신의 움막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움막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주위를 하염없이 돌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언젠가는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은 키가 큰 사내가 다시는 비와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다.
어느 시절 비가 왔었다. 키가 큰 사내는 그런 채로 밖으로 나갔다. 빽빽한 깃털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뻣뻣한 줄기에서 돋아난 낙타 속눈썹 같은 털들은 이내 물기를 머금고 사그라졌다. 사내의 키도 사그라진다. 마녀도, 움막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볼품없고 꼴 보기 싫은 모습으로 사내의 키가 사그라진다. 아이 꼴 보기 싫어, 마녀가 말했던가. 어느 시절 마녀는 사내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 그 뒤로 키가 큰 사내는 비가 오는 날이면 움막 안을 서성였다. 그렇게 해도 비가 그치지 않는 날이면,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여자의 눈꺼풀은 앵무새 입 때문에 혹은 독수리 발톱 때문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남자는 발개진 여자의 눈꺼풀을 보고 다시 입김을 분다. 끈적해진 입안에서 입김과 함께 간혹 실타래 같은 침이 나오기도 했다. 날이 완연하게 밝았지만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치읔치읔 도시의 남녀는 잠에서 완전하게 깨 있었다. 여자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여자가 눈을 뜬다. 여자의 부드러운 속눈썹이 남자의 손바닥을 쓸어내린다. 낙타의 속눈썹 같다고 남자가 반추한다. 낙타조차 본 적이 없으면서, 남자는 그렇게 추억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까?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반추할 수가 있을까? 남자는 생각했다. 생각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 생각의 생각을 하면 반추할 수 있으리라고 어느 시절 키가 큰 사내가 거짓된 진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리가 됐다.
여자가 한 칸짜리 냉장고 문을 연다. 어젯밤 넣어 두었던 뉴질랜드 산 삼겹살이 꽁꽁 얼어 있었다. 성능 나쁜 냉장고의 온도를 최대치로 내려놓은 덕이었다. 치읔치읔 도시에 오면 먹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것인데, 어젯밤 남녀는 식욕을 잃었다. 이곳에 올 적만 해도 남녀는 10인분이나 되는 뉴질랜드 산 삼겹살에 흥이 나 있었다. 여자의 팔꿈치 길이만한 삼겹살이 네 개씩 진공포장 돼 있었다. 검붉은 살 사이로 오돌뼈가 박혀 있기도 했다. 여자는 그것을 먹을 때, 오독오독 모조리 씹어 삼키곤 했었다. 그러면 남자는 인상을 썼다. 다행히 치읔치읔 도시에서 식욕을 잃은 남녀는 더 이상 인상을 쓰거나 어금니를 쓸 필요가 없게 됐다. 식욕을 잃었지만, 잠이 부족했지만, 보지도 않은 것을 반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추할 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필요 없게 된다고 어느 시절 키가 큰 사내가 또 하나의 진리를 만들고 있었다.
∞
비가 오는 날 나무를 깎으면 자꾸만 칼이 엇나갔다.
비는 움막 안으로 새어 들어와 키가 큰 사내의 어깨 위로 떨어지곤 했다. 그래서 사내는 원뿔형 천장에 커다란 천을 덧대 놓았다. 그래도 비는 간혹 움막 안으로 떨어졌다. 사내의 품안에 커다란 나무판자가 안겨 있다. 사내는 그것을 부둥켜안고 더욱 판판하게 깎기 시작한다. 칼은 나무에 꽂힐 적부터 말을 듣지 않았다. 원시적인 칼이라고 사내는 조용히 불평한다. 비가 그칠 때까지 빗물에 젖은 눅눅한 나무를 부여잡고 작업에 열중했다. 그 시절 마녀가 살았지만, 마녀는 비가 오는 어느 날부턴가 키가 큰 사내를 볼 수 없었다. 마녀는 어김없이 바다로 나갔다. 비가 오는 날엔 바다는 추억을 하지 않았다. 거센 파도가 마녀의 발목까지 차오른다. 파도를 피해 저만치 물러나도 파도는 자꾸만 마녀의 발목을 훔쳤다. 마녀는 언젠가 발목이 댕강 잘려나간 소년을 추억한다. 추억은 추억하지 않아도 추억을 몰고 온다고 마녀는 생각한다. 굳이 반추하지 않아도 붉은 양수에 다리를 담근 소년이 마녀의 눈 속에 머릿속에 허공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계속 따라다녔다.
치렁치렁한 치마 끝자락은 바닷물에 젖은 지 오래다. 마녀는 파도에서 더 멀리 달아나서는 허리를 구부려 젖은 치맛자락을 꼭 짠다. 꼬깃꼬깃 마녀의 지문이 묻어나지 않는다. 비가 그치자 마녀가 움막으로 돌아온다. 치맛자락엔 허연 소금이 묻어 있다. 마녀가 태어난 움막을 지날 때 언젠가 들었던 비명소리가 들렸다. 양수에 발을 담근 소년이 또다시 빽빽거린다. 빽빽거리다 못해 꺽꺽거린다. 마녀는 무례하게도 소리가 들리는 움막으로 들어간다. 키가 큰 사내가 자신의 손을 부여잡고 피를 흘린다. 텁텁한 나무냄새 때문에 마녀는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쓴다. 키가 큰 사내의 손가락이 잘렸다. 그래도 여전히 사내는 움막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다.
남자는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먹은 것만으로도 백 만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자는 대답 대신 눈을 한 번 깜박인다. 이제 곧 떠나야 할 시간이다. 밖은 고요했지만 남녀가 있는 방만큼 조밀하지는 않았다. 남자는 1층으로 내려가 아이스박스를 들고 왔다. 뉴질랜드 산 삼겹살이 가지런히 박스에 담긴다. 남자는 뉴질랜드 산 삼겹살을 켜켜이 잘 정돈한 후 화장실로 향한다. 이제 코털을 정리할 시간이다. 주위를 둘러본다. 진주색 샴푸통, 그 옆으로 양 갈래로 벌어진 칫솔 하나, 흉물스럽게 보풀이 돋은 샤워타올, 반은 젖어 눅눅해진 변기뚜껑의 종이띠, 어젯밤 여자가 쓰고 그대로 욕실에 걸어둔 헝클어진 수건, 찐득하게 비누 때가 낀 양치용 유리컵, 정확히 반이 잘려나간 초록색 알뜨랑 비누, 그것뿐이었다. 이제 남자는 치읔치읔 도시에 작은 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분명해 졌다. 작은 가위가 없다는 것, 코털을 손질할 수 없다는 것, 모두. 남자는 손가락집게로 자신의 코를 꼬집어본다. 자잘하게 돋아난 털들이 코방울 안쪽을 사정없이 찌른다. 잘려나갈 것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법이라고 누군가 반추한다.
∞
손가락이 잘려 나간 자리는 그런대로 아물어 갔다.
다행히 손톱 반이 남아 있어, 멀리서 보면 키가 큰 사내의 손가락이 잘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 수 없었다. 오그라든 발목과 오그라든 손톱이 어쩐지 균형을 이루는 것만 같았다. 키가 큰 사내는 점점 더 그럴듯해졌다. 잘려진 손가락으로 움막 사람들에게 바다가 반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여전히 알려 주었다. 손가락 끝이 둥글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간혹 그 때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키가 큰 사내가 알려준 대로 바다로 나갔고 바다에서 돌아왔다.
키가 큰 사내는 얼마동안 나무판자에 손을 대지 않았다. 뒤틀린 나무판자 사이로 손가락 피가 새어 들어가 기괴한 무늬가 생겼다. 동그란 나무 눈 사이에 검붉은 눈동자가 생기더니 그 위로 수지(樹脂)가 새어나와 둥글고 딱딱한 호박을 만들어냈다. 움막 사람들은 그 호박을 상서로이 여겨 점점 더 커지는 그것 위로 언젠가부터 손바닥을 얹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박은 매끈해졌고, 그것은 다시 납작해졌다. 호박은 더할 나위 없이 투명해졌다. 투명해질수록 핏빛 눈동자는 더욱 사납게 빛을 발했다. 호박의 머리를 쓰다듬던 움막 사람들은 호박 속 눈동자가 빛을 내자 발길을 끊었고, 밤이 되면 핏빛 눈동자가 떠다닌다고 떠들어 댔다. 키가 큰 사내는 나무판자에 저주가 내린 것이라며, 바다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시절 바다는 한 달 내내 큰 파도를 품에 안았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행여나 자신의 아이가 바다로 나가 발목이 댕강 잘려버리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바다는 더 이상 추억하지 않는 것일까? 움막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키가 큰 사내의 깃털은 점점 수그러져 갔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사내에게 새로운 깃털을 꽂아주는 것을 잊었다. 기억도 추억도 반추도 두려움 앞에선 모두가 없는 것이다. 털이 하나둘 빠지자 사내는 조금씩 왼발 오른발 쩔뚝거리기 시작했다. 그 시절 마녀의 숱 적은 머리칼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마녀의 머리칼이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여자는 뉴질랜드 산 삼겹살을 잘라 먹으려고 가져온, 날이 잘 선 재단용 가위를 남자에게 내밀었다. 엄청나게 길고 두꺼운 날을 가진 가위를 보자 남자는 슬며시 짜증이 일었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얼굴을 살피고는 가위를 아이스박스 속에 넣었다. 여자는 어젯밤 입에 넣었던 샴푸로 머리를 감고, 어젯밤 아무렇게나 구겨 널었던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욕실에서 나온다. 남자는 아이스박스에서 가위를 꺼냈는지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가며 뾰족한 가위 끝 날을 콧속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귀밑머리에서 땀이 흐른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연신 허벅지 옆으로 문지른다. 그러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제 여자 차례다. 가위를 건네받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남자 앞으로 다가간다. 고개를 숙여 남자의 콧구멍을 살피고 어떻게 가위를 넣어야 할 지 이리저리 고개를 기울인다. 짹깍. 가위 날이 남자의 콧구멍 속에서 일자로 모아진다. 피가 솟구치지 않는다. 피가 솟구쳤음 좋겠다. 여자의 얼굴로 남자의 침이 떨어진다.
∞
어느 시절 숱 적은 마녀의 머리칼이 자랐다.
허리까지 자란 머리칼은 마녀를 바다로 이끌었다. 바다는 파도를 추억하고 파도는 어느 시절 마녀의 숱 적은 머리칼을 반추한다. 추락도 없이 인간이 바다에 빠지던 때, 바다는 뜨거웠고 뜨거운 바다위로 숱 적은 머리칼이 둥둥 떠다녔다. 그것이 마녀의 머리칼이라고 왼발 오른발 쩔뚝이는 사내는 말했다. 그것은 오랜만에 움막에서 진리가 되었다. 잔잔한 파도가 숱 적은 머리칼을 반추하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쓰디 쓴 위액을 식도로 떠밀었다. 생선도 멍게도 해삼도 그 시절 모두 녹아내렸다. 살아남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런 바다가 두려웠으며, 그저 또 다른 제언이 있기만을 바랐다. 날이 가면 갈수록 바다는 부재로 채워졌고, 부재로 채워진 바다는 낮이면 엄청난 소금을 움막 바로 앞까지 밀어내곤 했다.
모두 마녀 탓이다.
움막 사람들 사이에선 붉은 눈의 전설과 함께 또 다른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마녀가 단두대에 오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침 세례를 받고 나자 여자는 한없이 깨끗해진 기분이 들었다. 가위의 왼쪽 날에선 피가 일직선으로 흐른다. 여자는 가위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린다. 가위가 바닥에 꽂힌다. 여자는 어젯밤 빠져 나왔던 톨게이트에서 받은 영수증을 가방에서 꺼내고 무언가 끄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젠가 시로 기억될 것이다. 혹은 추억될 지도.
피서라
* 르프랭(refrain) : 1.반복구, 후렴 2.후렴이 있는 노래 3.늘 되풀이하는 말
어느 시절 마녀가 살았다.
마녀의 얼굴은 새하얗다 못해 붉기까지 했다. 머리칼이 얼마 없는 슬픈 마녀는 형용사와 같은 이름 그대로 외로운 여인이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들판으로 나갔고, 비가 오는 날이면 바다로 발길을 돌렸다. 발가락 끝까지 치맛자락을 끌어내린 마녀는 저만치서 풍겨오는 인간들의 체취를 한껏 들이킨다. 알싸하고 콜콜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통해 폐부로 전해지려는 찰나, 마녀의 숱 적은 머리칼이 쑥쑥 자란다....... . . . . . 그녀는 마녀다.
파도가 있었다.
고독한 파도는 달빛에 쫓겨 서쪽으로 몸을 달린다. 달빛에 쫓기어 부리나케 내달린 파도의 부재 속에 널빤지 한 장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 널빤지 아래로 탄력 있는 용수철이 균형을 잡는다. 고독한 파도, 잔인한 달빛, 냉철한 널빤지, 고고한 용수철, 숱 적은 마녀, 이들은 그 자체로 단두대가 된다.
발가락 끝을 고이고이 싼 마녀의 조신한 발걸음이 단두대로 향한다. 아이 같은 즐거움을 바라는 마녀는 널빤지 위로 몸을 싣는다. 동쪽 달빛에 쫓기는 파도는 마녀를 향해 돌진하고, 마녀는 본능적으로 널빤지에 납작 엎드린다. 온 힘을 다해 파도와 바람을 버텨보지만, 마녀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용수철은 달빛의 울부짖음에 힘입어 그녀를 저 멀리 바다의 끝으로 이끈다. 철없는 마녀는 ‘용수철 그네’를 타고 바다의 끝을 보고, 다시 널을 뛰어 바다 속을 내려다본다. 퐁당, 마녀가 추락한다. 바다는 미쳤다. 추락하는 순간에도 마녀는 바람이 전해주는 인간의 콜콜한 냄새를 추억하며 치렁치렁한 치맛자락을 자꾸만 끌어내린다. . . . . . .그녀가 추락한다. . . . . . .얼마 되지 않는 마녀의 숱 적은 머리칼이 자란다. . . . . . .숱 적은 머리칼이 흩날린다. . . . . . .마녀가 떨어진다.
∞
치읔치읔 도시엔 치약이 없다는 걸 명심해.
여자는 남자의 그 말을 잊었다. 오늘밤 남자와 여자는 치읔치읔 도시에 도착했다. 둘은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었다. 도시엔 정말 치약이 없었다. 치약대신 무엇으로 이를 닦아야 할까 고민하다 여자는 화장실 변기 위에 놓인 반투명색 병을 보았다. 조명에 따라 색을 달리하는 진주빛깔 병에 샴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오래 되었는지, 여자가 병을 들어 올리자 좌우로 진척하게 기울었다. 여자는 화장실 문을 빠금히 열고 남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남자는 침대 대각선으로 누워 TV를 보는 척 한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잠들어 있다. 여자는 샴푸를 한번 펌핑해 입에 넣었다. 향기로운 당근향이 입 안 가득 퍼진다. 서너 번의 칫솔질로 풍성한 거품이 인다. 여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리모컨을 꼭 쥔 채 꼼짝하지 않았다. 손에서 리모컨을 빼내려 하자 손가락에 힘을 준다. 여자는 대각선으로 뻗은 남자를 그대로 둔 채 삼각형으로 난 작은 공간에 간신히 몸을 누인다.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다리를 구부리고는 무릎에 머리를 묻는다. 깊은 숨을 내쉬자 무릎과 가슴 사이로 샴푸향이 전해진다. 여자는 그것이 재미있는 듯 연신 숨을 크게 내신다. 코끝과 인중 위로 작은 이슬이 맺힌다.
치읔치읔 도시를 다녀왔지.
내가 모두 망쳐버린 도시. 나 같은 여자는 정말 최악이라며 면전에서 침을 뱉은 도시. 추억도 없는 도시. 반추할 수 없는 도시. ㅊ의 ㅊ은 너무 가벼워. 새벽녘 입 벌린 사내 옆에서 혼자 중얼거렸지. 치읓보다 치읔. 위가 하나 더 는 기분야. 이제 세 개. 하나만 더하면 반추위(反芻胃)를 완성할 수 있을 지도. “한번 삼킨 음식을 다시 입안으로 토하여 잘 씹은 후 삼키는 것”을 반추라고 말했던가. 아마도 반추적 인간이라는 학명을 만들어야겠지. 호모 레미니시아? 호모 리콜리니우스? 호모 리코보엔스? 그럴듯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누군가에게 물었더니, 너가 시인이냐며 머리통을 갈겼지. 그래서 시인이 되었어. 그날, 치읔치읔 도시에서 침 세례를 받고 난 후 시인이 되었지. 숱 적인 시인. 마녀의 치렁치렁한 벨벳 치마를 빌려 입고 귓바퀴 뒤에 담배를 꽂은 채, 시인인척 얼굴을 숨겼지. 아마 드러냈다고 하는 말이 더 솔직할 거야. 그럴 거야. 그렇겠지.
날이 밝자 여자의 입안에서 샴푸 향이 사라졌다.
여자는 점점 무거워지는 눈을 이겨내려 연신 겹 쌍꺼풀을 만든다. 남자는 아직도 손에서 리모컨을 놓지 않았다. 여자 또한 작은 삼각형 안에 안전하게 누워있다. 침대 옆으로 난 커다란 창문에 매달린 커튼이 조금씩 살랑이기 시작한다. 아침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다. 새벽바람이라고 해야 할까? 바람이 불자 이불을 덮지 않은 남녀가 동시에 오그라든다. 여자는 더 이상 오그릴 것이 없어 오른쪽으로 돌아눕는다. 그러자 자신과 똑같이 오그라든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리모컨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잠이 들었다. 여자의 머리위로 남자의 뜨거운 날숨이 규칙적으로 불어온다. 남자가 숨을 들이쉴 때 서늘한 새벽바람이 여자의 왼쪽 팔뚝을 스치고 지나간다. 황금빛 솜털을 머금고 알맞게 부풀어 오른 털구멍들이 일제히 솟아오른다. 여자는 몸을 한 번 떨더니 남자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쳐든다. 코털을 제거한 남자의 콧구멍 속으로 오톨도톨 돌기가 솟아있다. 코 속에 털이 있다는 것을 참을 수 없다던 남자는 과연 이 도시에 작은 가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수염과 함께 코털도 쑥쑥 자랄 것이다. 숱 적은 마녀의 머리칼이 언젠가 자란 것처럼.
∞
마녀가 빠진 바다는 좀처럼 잔잔해 지지 않았다.
마녀가 빠지거나 빠지지 않거나 바다는 마찬가지다. 바다는 바다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추억을 하지 않는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저 마녀의 추억과 인간의 추억과 낙타의 추억과 악어새의 추억을 집어 삼킬 뿐이다. 파도가 서늘한 마녀를 삼키자, 뜨거운 인간의 피가 해수의 온도를 전과 동일하게 맞춰 주었다. 뜨거운 인간이 또 한 번 추락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인간의 피로 뜨거워진 바다는 얼음을 녹인다. 그 후로 인간은 추락 없이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바다가 된 지 오래다. 옛날엔 마녀가 있었지. 어느 시절 마녀가 있었다.
여자는 이상한 꿈을 꿨다.
치약이 없는 치읔치읔 도시에서 칫솔 위에 작은 해삼 하나를 얹어 놓는다. 물컹하지만 심지 있는 그것은 여자의 입 속에 들어가자마자 윗니 아랫니를 자유롭게 오가며 여자의 이빨을 훑는다. 그러다 유독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들어간 어금니 사이에 정성을 쏟는다. 여자는 어릴 적 오른쪽 두 번째 어금니에 아말감을 박아 넣은 적이 있었다. 해삼은 용케도 그것을 찾아내고 특유의 빨판을 이용해 붙였다 떼기를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쩍쩍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욕실 안으로 울려 퍼진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언제 양치질을 끝내야 할지, 언제 이것을 뱉어내야 할 지 난감해했다. 그럴 때 여자는 꿈에서 깼다. 턱뼈가 뻐근한 듯 아래턱을 좌우로 움직여 본다. 여자의 콧등위로 수염이 자라 있다. 남자의 것이다. 남자의 해삼이 목젖을 건드리자 여자는 등을 거세게 요동치더니 마른 토악질을 뱉어낸다. ㅊ억-하며 해삼이 입 밖으로 튕겨 나간다. 남자의 겨드랑이에서 리모컨이 떨어진다.
∞
파도가 잠잠해질 때, 인간들은 바다가 추억을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머리에 깃털을 꽂고 왼발 오른발 이상한 발걸음으로 쩔뚝거리는 남자는 그 거짓말을 언젠가 자신이 말했었다며 추억에 잠긴다. 바다가 추억할 때 비로소 인간들은 반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수억 년 전 파도가 삼켰던 생선들이 다시 바다의 식도를 타고 기어 올라오는 것이라고. 뜨거운 피를 가진 인간들은 그것을 믿었다. 바다가 반추할 때 그 속으로 그물과 막대기와 앞뒤로 뚫린 유리병과 작살들을 내던졌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는 많은 것을 반추했다. 쓰도록 짠 위액들이 거짓말처럼 넘쳐났다. 간혹 바닷물이 인간들의 발톱 사이로 파고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면 인간들은 미간을 찡그렸다. 때론 발톱 사이가 벌어져 붉은 살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자 왼발 오른발 쩔뚝이는 한 남자가 얼른 그곳을 나오라고 소리쳤다. 잘못하다가는 발 전체가 녹아내릴 수 있다며, 바다의 소화력에 대해 떠들어댔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기억도 없이 여자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치읔치읔 도시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잠을 잔다. 당분간 그 누구도 깨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잠이 필요했고, 남자는 언제나 잠을 자는 습관을 가졌었다. 틀렸다. 남자가 눈을 뜬다. 실내화를 신지 앉은 채, 화장실로 향한다. 잠이 덜 깬 듯 터덜터덜 걷는 남자의 엉덩이 뒤로 힘없는 해삼 하나가 함께 터덜거린다. 해삼이 물을 토한다. 노란 물이 위액이라고 해도 괜찮을까? 노란 오줌을 토해낸다. 쏟아낸다. 비워낸다. 힘겹지만 시원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쏟아지는 오줌소리에 여자도 잠에서 깼다. 모든 것이 틀렸다. 여자는 잠이 더 필요했지만 깨고 말았다. 변기 속으로 거품이 인다. 남자는 거품이 이는 것을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물을 내린다. 뜨거운 오줌이 소용돌이치며 내려간다. 침대로 향하는 남자의 엉덩이 사이로 해삼이 보인다. 해삼은 물을 토해 내고 기진맥진이다. 끝에 매달린 오줌 한 방울이 핑크색 카펫 위로 떨어진다. 오줌이 떨어진 자리가 붉은 색으로 변한다. 여자는 재빨리 눈을 감는다. 여자의 눈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빛이 들어와 있었다. 눈을 감자 주홍빛 원들이 떠다닌다. 자꾸만 눈에 힘이 들어간다. 눈동자가 흔들린다. 감긴 눈꺼풀 위로 눈동자가 구른다.
∞
숱 적은 마녀가 태어난 날,
같은 움막에서 살던 한 소년의 발이 바다 속으로 녹아내렸다. 마녀와 함께 떠내려 온 양수로 소년의 문드러진 발을 씻긴다. 마녀는 태어나던 날 울지 않아 마녀가 되었다. 마녀는 입을 앙 다물고 눈을 크게 뜬 채 벌겋고 누런 양수에 발을 담근 소년을 바라본다.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날에 치르는 의식이라고 마녀는 굳게 믿었다. 마녀는 단두대에 오르기 전까지 아니, 올라서는 날에도 자신이 ‘마녀’인지 몰랐다. 그저 ‘마녀’가 자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계집아이에게 붙이는 그저 그런 이름 중의 하나. 누군가 ‘마녀’라고 부를 때, 돌아보는 이는 마녀 자신밖에 없었으므로.
양수로 발을 닦은 소년은 더 이상 바다 근처에 가지 않았다. 소년이 청년이 되던 시기, 소년은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소리들로 마녀뿐만 아니라 움막 사람들을 모조리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 언제나 앉아만 있던 청년이 된 소년은 어느 순간 스스로 일어나더니, 왼발 오른발 쩔뚝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말했고, 청년은 기적이 아니라 수 억 년 전 자신이 걸었던 때를 반추했을 뿐이라고 사람들의 말을 바꿔 주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청년의 머리위로 길고 가느다란 깃털을 하나씩 꽂아 주었다. 제법 많은 깃털이 청년의 머리위로 빽빽해지자 청년은 움막에서 가장 키가 큰 사내가 되어 있었다. 그 시절 마녀가 살았다.
그것은 앵무새 입 같기도 했다.
남자의 반이 잘려나간 검지손톱은 보기 좋을 정도로 오그라들어 있었다. 앵무새 입처럼. 꼭 감은 눈꺼풀 아래로 속눈썹이 삐져나온다. 남자는 여자의 왼쪽 눈에 오른쪽 검지를 살며시 갖다 댄다. 눈은 이내 잠잠해진다. 어느 시절 바다가 반추할 적처럼 여자의 눈은 평온해졌다. 뜨거운 눈물이 성긴 속눈썹 사이를 메운다. 살짝만 움직여도 눈물이 떨어질 태세다. 여자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눈동자를 의식한다. 남자는 그것을 알아챘는지 여자의 얼굴로 입김을 분다. 야릇한 냄새가 여자의 코를 통해 폐부로 전해진다. 밤새 위는 비워졌으리라. 텅 빈 위속으로 위액이 분비된다. 먹은 것도 없는데 남자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액을 발산했다. 때로는 그것이 식도까지 넘어오기도 했다. 식도까지 넘어온 그것을 남자는 다시 삼킨다. 그러면 위는 또다시 위액을 뿜어대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녹아내릴 만큼 강력했다. 삼켜진 위액이 다시 위액으로 소화된다. 모든 것이 소화됐다. 녹아내렸다. 위액으로 찌든 남자의 입 냄새를 맡고 있자니 여자의 속이 뒤틀린다.
손가락이 잘렸다.
언제나 바른 곳을 가리키던 손가락이었는데, 나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잘려진 손가락이 아물기 시작했다. 독수리 발톱처럼 남은 손톱이 안으로 오그라들었다. 때론 앵무새의 입 같기도 했다. 모든 것이 흔들린다. 손톱보다 작게 떨어져 나간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흔들려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기 마련이지. 깨진 유리창 바람에 날리는 커튼 뒤집힌 우산 생각했다 추억의 축억 뒤집혀진 기역자 주먹쥔 연사 주먹핀 소녀 강박의 다른말 미친바람 지하의 추억 지상의 반추 우리의 저편 점증되는 인간 댄져러스 비드 틈새시장 공격 속쓰림 생각의 생각 생각했다 아는 이름 이름의 다른 말 막말 바른말 추위와 취 날것의 익힘 멍게의 냄새 콘 한 묶음 취기의 추태 ㅊ의 ㅊ 이불의 혈 새어나와 묻어나와 달리고 달려 걷기의 향수 향수의 향수 냄새의 야릇함 내음과 냄시 악지와 찔통 ㅃㅃ 땡땡의 땡땡 도열의 도열 드리의 드리 ㄷ의 ㄸ 따다가 따드려 싹뚝의 뚝딱 기억의 저편 저편의 내편..........................................................................................프로폴션널리티
∞
청년은 움막에서 가장 키가 큰 사내가 되었다. 어쩐지 머리위로 솟은 빽빽한 깃털들이 의족 같이 여겨져 사내는 그것을 벗을 수가 없었다. 의족을 벗는 순간, 깃털을 내려놓는 순간 사내는 또다시 왼발 오른발 쩔뚝거리게 되리라. 쩔뚝쩔뚝. 마녀는 사내가 옆으로 걸어갈 적에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쩔뚝쩔뚝. 그러면 키가 큰 사내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라도 한 듯 앞으로 멀어져 가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키가 큰 사내는 자신의 움막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움막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주위를 하염없이 돌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언젠가는 밖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은 키가 큰 사내가 다시는 비와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다.
어느 시절 비가 왔었다. 키가 큰 사내는 그런 채로 밖으로 나갔다. 빽빽한 깃털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뻣뻣한 줄기에서 돋아난 낙타 속눈썹 같은 털들은 이내 물기를 머금고 사그라졌다. 사내의 키도 사그라진다. 마녀도, 움막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볼품없고 꼴 보기 싫은 모습으로 사내의 키가 사그라진다. 아이 꼴 보기 싫어, 마녀가 말했던가. 어느 시절 마녀는 사내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 그 뒤로 키가 큰 사내는 비가 오는 날이면 움막 안을 서성였다. 그렇게 해도 비가 그치지 않는 날이면,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여자의 눈꺼풀은 앵무새 입 때문에 혹은 독수리 발톱 때문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남자는 발개진 여자의 눈꺼풀을 보고 다시 입김을 분다. 끈적해진 입안에서 입김과 함께 간혹 실타래 같은 침이 나오기도 했다. 날이 완연하게 밝았지만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치읔치읔 도시의 남녀는 잠에서 완전하게 깨 있었다. 여자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여자가 눈을 뜬다. 여자의 부드러운 속눈썹이 남자의 손바닥을 쓸어내린다. 낙타의 속눈썹 같다고 남자가 반추한다. 낙타조차 본 적이 없으면서, 남자는 그렇게 추억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까?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반추할 수가 있을까? 남자는 생각했다. 생각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 생각의 생각을 하면 반추할 수 있으리라고 어느 시절 키가 큰 사내가 거짓된 진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리가 됐다.
여자가 한 칸짜리 냉장고 문을 연다. 어젯밤 넣어 두었던 뉴질랜드 산 삼겹살이 꽁꽁 얼어 있었다. 성능 나쁜 냉장고의 온도를 최대치로 내려놓은 덕이었다. 치읔치읔 도시에 오면 먹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것인데, 어젯밤 남녀는 식욕을 잃었다. 이곳에 올 적만 해도 남녀는 10인분이나 되는 뉴질랜드 산 삼겹살에 흥이 나 있었다. 여자의 팔꿈치 길이만한 삼겹살이 네 개씩 진공포장 돼 있었다. 검붉은 살 사이로 오돌뼈가 박혀 있기도 했다. 여자는 그것을 먹을 때, 오독오독 모조리 씹어 삼키곤 했었다. 그러면 남자는 인상을 썼다. 다행히 치읔치읔 도시에서 식욕을 잃은 남녀는 더 이상 인상을 쓰거나 어금니를 쓸 필요가 없게 됐다. 식욕을 잃었지만, 잠이 부족했지만, 보지도 않은 것을 반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추할 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필요 없게 된다고 어느 시절 키가 큰 사내가 또 하나의 진리를 만들고 있었다.
∞
비가 오는 날 나무를 깎으면 자꾸만 칼이 엇나갔다.
비는 움막 안으로 새어 들어와 키가 큰 사내의 어깨 위로 떨어지곤 했다. 그래서 사내는 원뿔형 천장에 커다란 천을 덧대 놓았다. 그래도 비는 간혹 움막 안으로 떨어졌다. 사내의 품안에 커다란 나무판자가 안겨 있다. 사내는 그것을 부둥켜안고 더욱 판판하게 깎기 시작한다. 칼은 나무에 꽂힐 적부터 말을 듣지 않았다. 원시적인 칼이라고 사내는 조용히 불평한다. 비가 그칠 때까지 빗물에 젖은 눅눅한 나무를 부여잡고 작업에 열중했다. 그 시절 마녀가 살았지만, 마녀는 비가 오는 어느 날부턴가 키가 큰 사내를 볼 수 없었다. 마녀는 어김없이 바다로 나갔다. 비가 오는 날엔 바다는 추억을 하지 않았다. 거센 파도가 마녀의 발목까지 차오른다. 파도를 피해 저만치 물러나도 파도는 자꾸만 마녀의 발목을 훔쳤다. 마녀는 언젠가 발목이 댕강 잘려나간 소년을 추억한다. 추억은 추억하지 않아도 추억을 몰고 온다고 마녀는 생각한다. 굳이 반추하지 않아도 붉은 양수에 다리를 담근 소년이 마녀의 눈 속에 머릿속에 허공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계속 따라다녔다.
치렁치렁한 치마 끝자락은 바닷물에 젖은 지 오래다. 마녀는 파도에서 더 멀리 달아나서는 허리를 구부려 젖은 치맛자락을 꼭 짠다. 꼬깃꼬깃 마녀의 지문이 묻어나지 않는다. 비가 그치자 마녀가 움막으로 돌아온다. 치맛자락엔 허연 소금이 묻어 있다. 마녀가 태어난 움막을 지날 때 언젠가 들었던 비명소리가 들렸다. 양수에 발을 담근 소년이 또다시 빽빽거린다. 빽빽거리다 못해 꺽꺽거린다. 마녀는 무례하게도 소리가 들리는 움막으로 들어간다. 키가 큰 사내가 자신의 손을 부여잡고 피를 흘린다. 텁텁한 나무냄새 때문에 마녀는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쓴다. 키가 큰 사내의 손가락이 잘렸다. 그래도 여전히 사내는 움막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다.
남자는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먹은 것만으로도 백 만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자는 대답 대신 눈을 한 번 깜박인다. 이제 곧 떠나야 할 시간이다. 밖은 고요했지만 남녀가 있는 방만큼 조밀하지는 않았다. 남자는 1층으로 내려가 아이스박스를 들고 왔다. 뉴질랜드 산 삼겹살이 가지런히 박스에 담긴다. 남자는 뉴질랜드 산 삼겹살을 켜켜이 잘 정돈한 후 화장실로 향한다. 이제 코털을 정리할 시간이다. 주위를 둘러본다. 진주색 샴푸통, 그 옆으로 양 갈래로 벌어진 칫솔 하나, 흉물스럽게 보풀이 돋은 샤워타올, 반은 젖어 눅눅해진 변기뚜껑의 종이띠, 어젯밤 여자가 쓰고 그대로 욕실에 걸어둔 헝클어진 수건, 찐득하게 비누 때가 낀 양치용 유리컵, 정확히 반이 잘려나간 초록색 알뜨랑 비누, 그것뿐이었다. 이제 남자는 치읔치읔 도시에 작은 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분명해 졌다. 작은 가위가 없다는 것, 코털을 손질할 수 없다는 것, 모두. 남자는 손가락집게로 자신의 코를 꼬집어본다. 자잘하게 돋아난 털들이 코방울 안쪽을 사정없이 찌른다. 잘려나갈 것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법이라고 누군가 반추한다.
∞
손가락이 잘려 나간 자리는 그런대로 아물어 갔다.
다행히 손톱 반이 남아 있어, 멀리서 보면 키가 큰 사내의 손가락이 잘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 수 없었다. 오그라든 발목과 오그라든 손톱이 어쩐지 균형을 이루는 것만 같았다. 키가 큰 사내는 점점 더 그럴듯해졌다. 잘려진 손가락으로 움막 사람들에게 바다가 반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여전히 알려 주었다. 손가락 끝이 둥글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간혹 그 때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키가 큰 사내가 알려준 대로 바다로 나갔고 바다에서 돌아왔다.
키가 큰 사내는 얼마동안 나무판자에 손을 대지 않았다. 뒤틀린 나무판자 사이로 손가락 피가 새어 들어가 기괴한 무늬가 생겼다. 동그란 나무 눈 사이에 검붉은 눈동자가 생기더니 그 위로 수지(樹脂)가 새어나와 둥글고 딱딱한 호박을 만들어냈다. 움막 사람들은 그 호박을 상서로이 여겨 점점 더 커지는 그것 위로 언젠가부터 손바닥을 얹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박은 매끈해졌고, 그것은 다시 납작해졌다. 호박은 더할 나위 없이 투명해졌다. 투명해질수록 핏빛 눈동자는 더욱 사납게 빛을 발했다. 호박의 머리를 쓰다듬던 움막 사람들은 호박 속 눈동자가 빛을 내자 발길을 끊었고, 밤이 되면 핏빛 눈동자가 떠다닌다고 떠들어 댔다. 키가 큰 사내는 나무판자에 저주가 내린 것이라며, 바다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시절 바다는 한 달 내내 큰 파도를 품에 안았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행여나 자신의 아이가 바다로 나가 발목이 댕강 잘려버리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바다는 더 이상 추억하지 않는 것일까? 움막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키가 큰 사내의 깃털은 점점 수그러져 갔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사내에게 새로운 깃털을 꽂아주는 것을 잊었다. 기억도 추억도 반추도 두려움 앞에선 모두가 없는 것이다. 털이 하나둘 빠지자 사내는 조금씩 왼발 오른발 쩔뚝거리기 시작했다. 그 시절 마녀의 숱 적은 머리칼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마녀의 머리칼이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
여자는 뉴질랜드 산 삼겹살을 잘라 먹으려고 가져온, 날이 잘 선 재단용 가위를 남자에게 내밀었다. 엄청나게 길고 두꺼운 날을 가진 가위를 보자 남자는 슬며시 짜증이 일었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얼굴을 살피고는 가위를 아이스박스 속에 넣었다. 여자는 어젯밤 입에 넣었던 샴푸로 머리를 감고, 어젯밤 아무렇게나 구겨 널었던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욕실에서 나온다. 남자는 아이스박스에서 가위를 꺼냈는지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가며 뾰족한 가위 끝 날을 콧속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귀밑머리에서 땀이 흐른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연신 허벅지 옆으로 문지른다. 그러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이제 여자 차례다. 가위를 건네받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남자 앞으로 다가간다. 고개를 숙여 남자의 콧구멍을 살피고 어떻게 가위를 넣어야 할 지 이리저리 고개를 기울인다. 짹깍. 가위 날이 남자의 콧구멍 속에서 일자로 모아진다. 피가 솟구치지 않는다. 피가 솟구쳤음 좋겠다. 여자의 얼굴로 남자의 침이 떨어진다.
∞
어느 시절 숱 적은 마녀의 머리칼이 자랐다.
허리까지 자란 머리칼은 마녀를 바다로 이끌었다. 바다는 파도를 추억하고 파도는 어느 시절 마녀의 숱 적은 머리칼을 반추한다. 추락도 없이 인간이 바다에 빠지던 때, 바다는 뜨거웠고 뜨거운 바다위로 숱 적은 머리칼이 둥둥 떠다녔다. 그것이 마녀의 머리칼이라고 왼발 오른발 쩔뚝이는 사내는 말했다. 그것은 오랜만에 움막에서 진리가 되었다. 잔잔한 파도가 숱 적은 머리칼을 반추하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쓰디 쓴 위액을 식도로 떠밀었다. 생선도 멍게도 해삼도 그 시절 모두 녹아내렸다. 살아남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런 바다가 두려웠으며, 그저 또 다른 제언이 있기만을 바랐다. 날이 가면 갈수록 바다는 부재로 채워졌고, 부재로 채워진 바다는 낮이면 엄청난 소금을 움막 바로 앞까지 밀어내곤 했다.
모두 마녀 탓이다.
움막 사람들 사이에선 붉은 눈의 전설과 함께 또 다른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마녀가 단두대에 오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
침 세례를 받고 나자 여자는 한없이 깨끗해진 기분이 들었다. 가위의 왼쪽 날에선 피가 일직선으로 흐른다. 여자는 가위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린다. 가위가 바닥에 꽂힌다. 여자는 어젯밤 빠져 나왔던 톨게이트에서 받은 영수증을 가방에서 꺼내고 무언가 끄적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젠가 시로 기억될 것이다. 혹은 추억될 지도.
피서라
* 르프랭(refrain) : 1.반복구, 후렴 2.후렴이 있는 노래 3.늘 되풀이하는 말
김은영展 / KIM, EUNYOUNG / 金恩暎 / 지키고 싶은 성(城) My Castle/2016. 11. 14 - 2017. 02. 04
지키고 싶은 성
성북동 성곽아래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마주한 순간, 그녀가 오롯이 쏟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숨결이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어릴 적 동화 속 작은 성을 보는 듯한.
처녀시절 나는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불안이란 것은 없었다. 하지만, 결혼 그리고 출산과 함께 나는 이 사회가 두렵고 불안하다. 이 불안한 사회로부터 나는 내 아이와 가정과 나의 성을 내모든 것을 쏟아 가꿔야하고 지켜야한다.
이를 표현하는 나의 그림에서 선택한 대표적인 기호는 사랑초이다. 사랑초는 어머니가 키우셔서 어릴 적부터 무심히 보아온 길고 가녀린 옅은 연둣빛 줄기 끝에 세장의 검은 보랏빛 혹은 자줏빛 잎이 달린 식물이다. 그 빛깔이 처음에는 검고 어두워 음산해보이나 그 빛깔 사이로 보이는 보랏빛 혹은 자줏빛은 매혹적이어서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햇빛의 여부에 따라 잎이 펼쳐지고 닫히니 마치 숨겨진 비밀이 있어보였다. 생명력 또한 강인한 이 식물의 꽃말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이다. 나는 이 어원을 차용, 확장하여 ‘당신의 평온한 보호막이 되어줄게요.’라고 해석하며 마치 액을 막기 위한 부적처럼 수 만개의 사랑초를 화폭에 그리고 지키고 싶은 대상을 감싸 안는다.
이 세상이 서로를 지켜주고 안아주는 따뜻한 세상이길 그림을 통해 바래본다.
김은영 작가노트
성북동 성곽아래에 위치한 스페이스 이끼와 마주한 순간, 그녀가 오롯이 쏟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숨결이 느껴졌다. 마치 그녀의 어릴 적 동화 속 작은 성을 보는 듯한.
처녀시절 나는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불안이란 것은 없었다. 하지만, 결혼 그리고 출산과 함께 나는 이 사회가 두렵고 불안하다. 이 불안한 사회로부터 나는 내 아이와 가정과 나의 성을 내모든 것을 쏟아 가꿔야하고 지켜야한다.
이를 표현하는 나의 그림에서 선택한 대표적인 기호는 사랑초이다. 사랑초는 어머니가 키우셔서 어릴 적부터 무심히 보아온 길고 가녀린 옅은 연둣빛 줄기 끝에 세장의 검은 보랏빛 혹은 자줏빛 잎이 달린 식물이다. 그 빛깔이 처음에는 검고 어두워 음산해보이나 그 빛깔 사이로 보이는 보랏빛 혹은 자줏빛은 매혹적이어서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햇빛의 여부에 따라 잎이 펼쳐지고 닫히니 마치 숨겨진 비밀이 있어보였다. 생명력 또한 강인한 이 식물의 꽃말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이다. 나는 이 어원을 차용, 확장하여 ‘당신의 평온한 보호막이 되어줄게요.’라고 해석하며 마치 액을 막기 위한 부적처럼 수 만개의 사랑초를 화폭에 그리고 지키고 싶은 대상을 감싸 안는다.
이 세상이 서로를 지켜주고 안아주는 따뜻한 세상이길 그림을 통해 바래본다.
김은영 작가노트
창문에서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가 지나갔다.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가 지나갔다.
또 지나간다. 지나갔다.
기차는 매일 이곳으로 지나간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으며, 어제 전에도 그랬다. 아마도 내일도 그럴 것이다. 기차는 내가 잠을 잘 때도 지나간다. 꿈속에서도 지나가고 실제로 내 머리 위에서도 지나간다. 한번은 자다가 손을 뻗어 이마위로 지나가는 기차를 잡은 적이 있었다. 그래봤자 어제다. 갑작스럽게 눈물이 고인다. 이럴 땐 눈을 크게 뜨고 코피가 났을 적처럼 재빨리 하늘을 봐야 한다. 그러면 눈물은 큰 샘을 이루다 고개를 떨어뜨렸을 때 거대한 방울로 무겁게 아래로 떨어진다. 나는 개미를 가두고 싶었다. 왈칵 눈물이 고이는 날이면 그렇게 눈물폭탄을 아래로 떨어뜨려 작은 개미를 맞추고 싶어지는 것이다. 작지만 그 녀석에겐 무지막지한 눈물세례는 아마도 홍수와 다름없을 것이다. 허우적거리는 개미를 보고 있으면 왈칵 쏟아지는 눈물 또한 잊게 된다. 왜 눈물이 났던 것일까. 왈칵거리는 뜨겁고 속이 메슥거리고 얼굴이 더워지는 그런 기분 따위는 아마도 개미가 다 뒤집어썼을 것이다. 미안해, 개미. 고마워, 개미.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가 지나갔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지금보다 더 꼬마였던 시절, 엄마가 자꾸만 책을 가져와 내게 읽어주던 나의 옛날 시절, 기차가 한 참 전에, 내가 기차를 몰랐을 아주 한 참 전에 지나갔던 시절,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녀석들을 물고기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렇다면 불고기는 불에서 살까? 불고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뜨겁지 않을까? 왈칵 샘솟는 눈물보다 더. 뜨거워지는 볼보다 더. 불을 만져 본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리 뜨거운 것은 아닐 것이다. 불은 따뜻하고 나의 꽁꽁 언 발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가끔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덥고 냄새나고 자꾸만 불을 보고 있으면 불은 없어진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앞의 불은 불이 아니었다. 불은 기차로 변해 지나갔다. 그리고 엄마로 변해 말했다. “불고기? 호호호.”라고. 그러고 보니, 나는 아직 불고기를 만난 적이 없다.
불이 엄마로 변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쪼그려 앉은 나를 앉은 그대로 힘겹게 들어 한 발짝 뒤로 옮겨 놓았다. 어쩐지 불이 엄마로 변하면 나는 할아버지를 기다린다. 왜냐면 그때쯤은 나는 많이 덥고 더운 것보다 더 더워서 볼이 붉어지는 것이 내가 더워서 그런 것인지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고, 속은 울렁거리고 갑자기 토악질이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는 그만 사라지고 다시 불이 불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쩜 할아버지는 그런 때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어른들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나 가끔은 모르는 것투성이 일 때도 있다. 할아버지는 내 머리위로 지나가는 기차를 모른다. 어젯밤에도 내 이마로 지나갔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요란하게 지나가는 데도 할아버지는 잠도 쿨쿨 잘 잔다. 이러다 할아버지 말대로 밤새 안녕일지도.
나는 일곱 살인데 한글을 다 알지 못한다. 요즘 세상에 일곱 살에 한글을 다 알지 못하면……, 아이구. 이게 어른들 말이다. 하지만 난 다 모르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대신에 나는 한글을 다 아는 일곱 살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 우리의 몸엔 물고기가 산다는 것을. 눈물샘에서 콧물샘에서 녀석은 지느러미를 흔들며 자유자재로 수영을 한다. 간혹 나는 녀석이 보고 싶어 콧물을 흘리기도 한다. 눈물은 엄청 많이 흘린다. 그러나 약아 빠진 녀석은 한 번도 내게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며 운 적이 있다. 기어코 녀석을 보리라 마음먹고 거울을 보며 울고 있는데, 그만 나는 진짜로 울어 버렸다. 그건 언젠가 엄마가 우는 나를 보고 같이 크게 울어 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다. 진짜로 우는 내 모습은 슬펐다. 우는 엄마 얼굴만큼이나 슬펐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울었다. 그것은 진짜 울음이었다. 물고기 따윈 잊은 지 오래였지만 울고 있는 거울 속의 모습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도 기차가 지나갔다.
나는 가끔 불이 불인 것도 잊고 눈물샘 속의 물고기를 찾는 것도 잊지만 도대체 저 기차만큼은 잊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자꾸만 잊었다. “기차가 지나갔어, 할아버지.” 말해도 “그랬냐~?” 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크게 울어대는 기차를 잊을 수 있을까? 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떨어뜨릴 때도 어디선가 나타나 와락 나를 끌어안으면서. 이상하다. 조용하고 눈도 안 떠지는 새벽엔 벌떡 잘도 일어나면서, 내 이마위로 소리 지르며 기차가 지나가는 데도 할아버지는 죽은 듯이 잠을 잘도 잔다. 밤새 안녕 하는 것이다. 엄마는 말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밤새 안녕이에요, 네!”라고.
엄마랑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나는 개집에 개가 없어 실망했다. 개를 개라고 한다고 엄마는 나를 나무랐다. 강아지라고 하라면서. 개를 개라고 하는데, 나를 왜 혼내는 것일까? 처음 보는 흙이 내 발아래 있었다. 할아버지 집에는 마당이 있었고, 나는 마당 흙을 처음 보았다. 아주 딱딱했지만 만져보면 엄마가 수시로 얼굴에 두들겨 대는 파우더처럼 고운 가루가 묻어났다. 해님이 한 창 나와 있을 때면 그것은 엄마 살결처럼 희고 고운 빛이었다. 그러다 내가 왈칵 눈물이 쏟아낼 때는 붉은 빛으로 변했다. 처음엔 내가 눈에서 코피를 쏟는 줄 알았다. 눈에서 코피가 난다며 엉엉 우는 내게 할아버지는 그것이 황토라고 일러 주었다. 나는 황토에 눈물을 쏟아낸 것이다. 엄마는 황토가 붉은 빛으로 변한 어느 날, 내가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어느 날, 황토가 밀가루 반죽처럼 말랑해진 어느 날 떠났다. 또각또각 소리도 없이 콕콕 뾰족한 발자국으로 황토를 찌르고 도망갔다. 엄마는 도망갔다 나에게서!
엄마는 저 놈의 기차를 타고 도망갔을 것이다. 아니 확실하다. 내가 이마로 지나가는 기차를 잡은 어젯밤, 거기 작은 창문 하나에 엄마 얼굴이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지 엄청 놀라 기차를 그만 내팽개치고 말았다. 엄마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 어젯밤을 지나 오늘까지도. 그리고 방금 기차가 지나간다. 지나갔다.
기차는 잠도 없고 불고 끄지 않고, 오밤중에 소리를 빽빽 지르며 쿵쾅거린다. 우리는 같은 땅에 같은 층에 있는 데도 녀석이 어찌나 방정을 떠는지 내가 누운 자리까지 쿵쾅거린다. 엄마가 있었다면 기차를 혼냈을 텐데. 칫, 엄마는 기차를 타고 도망갔잖아. 둘이 분명 같은 편일 거야. 절대로 엄마를 만나면 안아주지 않을 거야. 거울 속의 우는 나를 보여 줄 거야. 진짜 우는 얼굴로 바꾸고 엄마한테 안길거야. 아니야. 안기지 않을 거야. 엄마를 개미처럼 눈물폭탄 안에 가둬 둘 거야. 꼼짝 못하게,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콕콕 황토를 찌르고 도망 못 가게. 기차가 지나간다. 이마 위에서 기차가 도망간다. 할아버지는 잠도 잘 잔다. 밤새 안녕처럼.
이불에서 메주 냄새가 난다. 이건 메주 냄새라 했다. 메주라서 괜찮다고. 코를 잡고 있는 나를 보고 하는 할아버지 말이다. 메주가 덮던 것은 괜찮은가 보다. 엄마는 포미가 덮던 이불은 안 된다고 했는데. 포미는 내 개다. 포미는 포미냄새가 난다고 엄마가 포미라고 불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포미는 포미냄새라는 것이다. 포미는 이제 없다고 했다, 엄마는. 그리고 진짜 내 개 포미는 이제 없다. 엄마랑 도망갔다. 나만 빼고. 근데 엄마는 왜 도망간 것일까? 내가 무서워서? 난 괴물일까? 그렇다면 괜찮다, 난 가끔 괴물이 돼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비밀이다.
기찻길과 우리 집, 그러니까 할아버지집인데 이제 우리 집에 못가니 우리 집이 된 할아버지 집은 아주 가깝다. 할아버지가 대문에서 기찻길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방 작은 창문으로 몰래 본 적이 있는데, 세어보니 백걸음이 안되었다. 다행히 나는 한글을 다 알진 못하지만 숫자는 다 안다. 백은 숫자의 끝이다. 백걸음 정도면 엄청 가까운 편일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와 할아버지 집에 오기 전 학교를 두 군데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 엄마는 백걸음이 조금 안 되는 곳으로 나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래, 집이랑 가까운 곳이 최고지 뭐.”하면서 묻지도 않는 말에 대답을 했다. 아마도 저 기찻길은 학교보다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난 여기 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 최고니까.
할아버지는 집을 두 개나 갖고 있다. 하나는 부엌이랑 붙은 집,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자는 아궁이만 붙은 집. 부엌이 붙은 조금 넓은 집은 메주가 한 가득이고, 우리는 예전에 막내 삼촌이 썼다는 아궁이만 붙은 집에서 잔다. 삼촌은 치과 선생님인데, 본 적은 별로 없다. 대신에 이 방엔 삼촌이 학교 다닐 때 썼다는 돌로 된 틀니 같은 것이 몇 개 있다. 난 그것들이 참 좋다. 특히 그중에서도 핑크색이랑 레몬색이. 할아버지도 틀니를 낀다. 잘 때 그것을 쑥 빼서 물이 담긴 컵에 담가 두는데, 그러면 거기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온다. 마치 사이다처럼 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일어나면 메주 냄새나는 이불 하나만 바닥에 깔아 두고 나머지는 개서 한 쪽에 밀어두는데, 그러면 나는 그것을 힘껏 밀어 창문 앞으로 옮겨 놓는다. 그리고 이불 계단을 올라 창문에 두 팔을 괴고 기차를 본다. 두 팔 양 옆으로 난 창틀 작은 자리엔 핑크 틀니 하나, 레몬 틀니 하나씩을 올려놓는다. 걔네들은 이제 내 친구들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기가 막히게 웃긴 친구들.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더러 혼잣말을 한다고 가끔 야단을 친다. 기차소리도 못 듣고, 틀니소리도 못 듣다니, 쯧쯧. 할아버지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나 보다. 기차가 지나간다. 지나가고 지나가고 또 지나간다…… 그러다 “식는다, 창문 닫아라.”라고 할아버지가 말한다. 그럴 때 또 기차가 지나간다. 지나갔다.
오늘밤은 꼭 이마로 지나가는 기차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불고기도 꼭 찾을 것이다. 둘 다 잡아서 엄마가 반성하고 돌아오면 내어 주어야지. 그래도 엄마는 매일 밤 내 이마위로 지나가니까. 또 보랏빛 밤이 되면 꽃비처럼 내 이마로 내려와 반짝이는 별이 된 무수히 많은 엄마가 나를 안아주니까. 엄마 품은 정말… 정말… 정말이다. 하나지만 여럿인 엄마가 나를 꼭 안으면 도망간 엄마도 그냥 ‘우리 엄마’가 된다. 엄마는 말했지, 너니까 안 미워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도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밤새 안녕이겠지.
피서라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가 지나갔다.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가 지나갔다.
또 지나간다. 지나갔다.
기차는 매일 이곳으로 지나간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으며, 어제 전에도 그랬다. 아마도 내일도 그럴 것이다. 기차는 내가 잠을 잘 때도 지나간다. 꿈속에서도 지나가고 실제로 내 머리 위에서도 지나간다. 한번은 자다가 손을 뻗어 이마위로 지나가는 기차를 잡은 적이 있었다. 그래봤자 어제다. 갑작스럽게 눈물이 고인다. 이럴 땐 눈을 크게 뜨고 코피가 났을 적처럼 재빨리 하늘을 봐야 한다. 그러면 눈물은 큰 샘을 이루다 고개를 떨어뜨렸을 때 거대한 방울로 무겁게 아래로 떨어진다. 나는 개미를 가두고 싶었다. 왈칵 눈물이 고이는 날이면 그렇게 눈물폭탄을 아래로 떨어뜨려 작은 개미를 맞추고 싶어지는 것이다. 작지만 그 녀석에겐 무지막지한 눈물세례는 아마도 홍수와 다름없을 것이다. 허우적거리는 개미를 보고 있으면 왈칵 쏟아지는 눈물 또한 잊게 된다. 왜 눈물이 났던 것일까. 왈칵거리는 뜨겁고 속이 메슥거리고 얼굴이 더워지는 그런 기분 따위는 아마도 개미가 다 뒤집어썼을 것이다. 미안해, 개미. 고마워, 개미.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가 지나갔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지금보다 더 꼬마였던 시절, 엄마가 자꾸만 책을 가져와 내게 읽어주던 나의 옛날 시절, 기차가 한 참 전에, 내가 기차를 몰랐을 아주 한 참 전에 지나갔던 시절,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녀석들을 물고기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렇다면 불고기는 불에서 살까? 불고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뜨겁지 않을까? 왈칵 샘솟는 눈물보다 더. 뜨거워지는 볼보다 더. 불을 만져 본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리 뜨거운 것은 아닐 것이다. 불은 따뜻하고 나의 꽁꽁 언 발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가끔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덥고 냄새나고 자꾸만 불을 보고 있으면 불은 없어진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앞의 불은 불이 아니었다. 불은 기차로 변해 지나갔다. 그리고 엄마로 변해 말했다. “불고기? 호호호.”라고. 그러고 보니, 나는 아직 불고기를 만난 적이 없다.
불이 엄마로 변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쪼그려 앉은 나를 앉은 그대로 힘겹게 들어 한 발짝 뒤로 옮겨 놓았다. 어쩐지 불이 엄마로 변하면 나는 할아버지를 기다린다. 왜냐면 그때쯤은 나는 많이 덥고 더운 것보다 더 더워서 볼이 붉어지는 것이 내가 더워서 그런 것인지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고, 속은 울렁거리고 갑자기 토악질이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는 그만 사라지고 다시 불이 불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쩜 할아버지는 그런 때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어른들은 정말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나 가끔은 모르는 것투성이 일 때도 있다. 할아버지는 내 머리위로 지나가는 기차를 모른다. 어젯밤에도 내 이마로 지나갔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요란하게 지나가는 데도 할아버지는 잠도 쿨쿨 잘 잔다. 이러다 할아버지 말대로 밤새 안녕일지도.
나는 일곱 살인데 한글을 다 알지 못한다. 요즘 세상에 일곱 살에 한글을 다 알지 못하면……, 아이구. 이게 어른들 말이다. 하지만 난 다 모르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대신에 나는 한글을 다 아는 일곱 살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 우리의 몸엔 물고기가 산다는 것을. 눈물샘에서 콧물샘에서 녀석은 지느러미를 흔들며 자유자재로 수영을 한다. 간혹 나는 녀석이 보고 싶어 콧물을 흘리기도 한다. 눈물은 엄청 많이 흘린다. 그러나 약아 빠진 녀석은 한 번도 내게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며 운 적이 있다. 기어코 녀석을 보리라 마음먹고 거울을 보며 울고 있는데, 그만 나는 진짜로 울어 버렸다. 그건 언젠가 엄마가 우는 나를 보고 같이 크게 울어 버린 것과 같은 것이었다. 진짜로 우는 내 모습은 슬펐다. 우는 엄마 얼굴만큼이나 슬펐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울었다. 그것은 진짜 울음이었다. 물고기 따윈 잊은 지 오래였지만 울고 있는 거울 속의 모습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도 기차가 지나갔다.
나는 가끔 불이 불인 것도 잊고 눈물샘 속의 물고기를 찾는 것도 잊지만 도대체 저 기차만큼은 잊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자꾸만 잊었다. “기차가 지나갔어, 할아버지.” 말해도 “그랬냐~?” 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크게 울어대는 기차를 잊을 수 있을까? 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떨어뜨릴 때도 어디선가 나타나 와락 나를 끌어안으면서. 이상하다. 조용하고 눈도 안 떠지는 새벽엔 벌떡 잘도 일어나면서, 내 이마위로 소리 지르며 기차가 지나가는 데도 할아버지는 죽은 듯이 잠을 잘도 잔다. 밤새 안녕 하는 것이다. 엄마는 말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밤새 안녕이에요, 네!”라고.
엄마랑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나는 개집에 개가 없어 실망했다. 개를 개라고 한다고 엄마는 나를 나무랐다. 강아지라고 하라면서. 개를 개라고 하는데, 나를 왜 혼내는 것일까? 처음 보는 흙이 내 발아래 있었다. 할아버지 집에는 마당이 있었고, 나는 마당 흙을 처음 보았다. 아주 딱딱했지만 만져보면 엄마가 수시로 얼굴에 두들겨 대는 파우더처럼 고운 가루가 묻어났다. 해님이 한 창 나와 있을 때면 그것은 엄마 살결처럼 희고 고운 빛이었다. 그러다 내가 왈칵 눈물이 쏟아낼 때는 붉은 빛으로 변했다. 처음엔 내가 눈에서 코피를 쏟는 줄 알았다. 눈에서 코피가 난다며 엉엉 우는 내게 할아버지는 그것이 황토라고 일러 주었다. 나는 황토에 눈물을 쏟아낸 것이다. 엄마는 황토가 붉은 빛으로 변한 어느 날, 내가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어느 날, 황토가 밀가루 반죽처럼 말랑해진 어느 날 떠났다. 또각또각 소리도 없이 콕콕 뾰족한 발자국으로 황토를 찌르고 도망갔다. 엄마는 도망갔다 나에게서!
엄마는 저 놈의 기차를 타고 도망갔을 것이다. 아니 확실하다. 내가 이마로 지나가는 기차를 잡은 어젯밤, 거기 작은 창문 하나에 엄마 얼굴이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지 엄청 놀라 기차를 그만 내팽개치고 말았다. 엄마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 어젯밤을 지나 오늘까지도. 그리고 방금 기차가 지나간다. 지나갔다.
기차는 잠도 없고 불고 끄지 않고, 오밤중에 소리를 빽빽 지르며 쿵쾅거린다. 우리는 같은 땅에 같은 층에 있는 데도 녀석이 어찌나 방정을 떠는지 내가 누운 자리까지 쿵쾅거린다. 엄마가 있었다면 기차를 혼냈을 텐데. 칫, 엄마는 기차를 타고 도망갔잖아. 둘이 분명 같은 편일 거야. 절대로 엄마를 만나면 안아주지 않을 거야. 거울 속의 우는 나를 보여 줄 거야. 진짜 우는 얼굴로 바꾸고 엄마한테 안길거야. 아니야. 안기지 않을 거야. 엄마를 개미처럼 눈물폭탄 안에 가둬 둘 거야. 꼼짝 못하게,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콕콕 황토를 찌르고 도망 못 가게. 기차가 지나간다. 이마 위에서 기차가 도망간다. 할아버지는 잠도 잘 잔다. 밤새 안녕처럼.
이불에서 메주 냄새가 난다. 이건 메주 냄새라 했다. 메주라서 괜찮다고. 코를 잡고 있는 나를 보고 하는 할아버지 말이다. 메주가 덮던 것은 괜찮은가 보다. 엄마는 포미가 덮던 이불은 안 된다고 했는데. 포미는 내 개다. 포미는 포미냄새가 난다고 엄마가 포미라고 불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포미는 포미냄새라는 것이다. 포미는 이제 없다고 했다, 엄마는. 그리고 진짜 내 개 포미는 이제 없다. 엄마랑 도망갔다. 나만 빼고. 근데 엄마는 왜 도망간 것일까? 내가 무서워서? 난 괴물일까? 그렇다면 괜찮다, 난 가끔 괴물이 돼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비밀이다.
기찻길과 우리 집, 그러니까 할아버지집인데 이제 우리 집에 못가니 우리 집이 된 할아버지 집은 아주 가깝다. 할아버지가 대문에서 기찻길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방 작은 창문으로 몰래 본 적이 있는데, 세어보니 백걸음이 안되었다. 다행히 나는 한글을 다 알진 못하지만 숫자는 다 안다. 백은 숫자의 끝이다. 백걸음 정도면 엄청 가까운 편일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와 할아버지 집에 오기 전 학교를 두 군데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 엄마는 백걸음이 조금 안 되는 곳으로 나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래, 집이랑 가까운 곳이 최고지 뭐.”하면서 묻지도 않는 말에 대답을 했다. 아마도 저 기찻길은 학교보다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난 여기 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 최고니까.
할아버지는 집을 두 개나 갖고 있다. 하나는 부엌이랑 붙은 집,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자는 아궁이만 붙은 집. 부엌이 붙은 조금 넓은 집은 메주가 한 가득이고, 우리는 예전에 막내 삼촌이 썼다는 아궁이만 붙은 집에서 잔다. 삼촌은 치과 선생님인데, 본 적은 별로 없다. 대신에 이 방엔 삼촌이 학교 다닐 때 썼다는 돌로 된 틀니 같은 것이 몇 개 있다. 난 그것들이 참 좋다. 특히 그중에서도 핑크색이랑 레몬색이. 할아버지도 틀니를 낀다. 잘 때 그것을 쑥 빼서 물이 담긴 컵에 담가 두는데, 그러면 거기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온다. 마치 사이다처럼 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일어나면 메주 냄새나는 이불 하나만 바닥에 깔아 두고 나머지는 개서 한 쪽에 밀어두는데, 그러면 나는 그것을 힘껏 밀어 창문 앞으로 옮겨 놓는다. 그리고 이불 계단을 올라 창문에 두 팔을 괴고 기차를 본다. 두 팔 양 옆으로 난 창틀 작은 자리엔 핑크 틀니 하나, 레몬 틀니 하나씩을 올려놓는다. 걔네들은 이제 내 친구들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기가 막히게 웃긴 친구들.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더러 혼잣말을 한다고 가끔 야단을 친다. 기차소리도 못 듣고, 틀니소리도 못 듣다니, 쯧쯧. 할아버지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되나 보다. 기차가 지나간다. 지나가고 지나가고 또 지나간다…… 그러다 “식는다, 창문 닫아라.”라고 할아버지가 말한다. 그럴 때 또 기차가 지나간다. 지나갔다.
오늘밤은 꼭 이마로 지나가는 기차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불고기도 꼭 찾을 것이다. 둘 다 잡아서 엄마가 반성하고 돌아오면 내어 주어야지. 그래도 엄마는 매일 밤 내 이마위로 지나가니까. 또 보랏빛 밤이 되면 꽃비처럼 내 이마로 내려와 반짝이는 별이 된 무수히 많은 엄마가 나를 안아주니까. 엄마 품은 정말… 정말… 정말이다. 하나지만 여럿인 엄마가 나를 꼭 안으면 도망간 엄마도 그냥 ‘우리 엄마’가 된다. 엄마는 말했지, 너니까 안 미워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도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밤새 안녕이겠지.
피서라
노승복展 / ROH, SEUNGBOK / 盧承福 / 1366 프로젝트 1366 project /2016. 10. 04 - 11. 11
1366프로젝트
1366은 여성폭력 긴급 상담 전화번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관한 작업으로 남편에게 매 맞은 여성의 몸을 찍은 사진을 이용하였다. 이 사진들은 매 맞은 여성들이 이혼을 할 때, 가정 폭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적 증거 혹은 자료로 사용하던 사진들이다. 나는 ‘여성의 전화’ 단체에서 자원 봉사로 일한 경험으로 이 사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스캔 한 다음 멍을 확대하였다. 크게 확대한 사진은 아픈 내용을 담고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내용과는 달리 표면적으로 영롱한 색상을 띤 아름다운 추상적 ‘회화사진’이 되었다. 색은 보라, 핑크에서부터 노란색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의 결과를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희망과 생명력이 넘치는 이미지로 보이게 한다. 즉 폭력을 은닉 시킨 것이다. 이 사회에는 드러나 있는 폭력보다 가려진 폭력이 더 잔인하고 심각하다. 따라서 1366 프로젝트는 아름다움, 사랑, 화려함, 행복의 표면에 숨겨진 폭력을 의미한다.
노승복 작가노트
1366은 여성폭력 긴급 상담 전화번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관한 작업으로 남편에게 매 맞은 여성의 몸을 찍은 사진을 이용하였다. 이 사진들은 매 맞은 여성들이 이혼을 할 때, 가정 폭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적 증거 혹은 자료로 사용하던 사진들이다. 나는 ‘여성의 전화’ 단체에서 자원 봉사로 일한 경험으로 이 사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스캔 한 다음 멍을 확대하였다. 크게 확대한 사진은 아픈 내용을 담고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내용과는 달리 표면적으로 영롱한 색상을 띤 아름다운 추상적 ‘회화사진’이 되었다. 색은 보라, 핑크에서부터 노란색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폭력의 결과를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희망과 생명력이 넘치는 이미지로 보이게 한다. 즉 폭력을 은닉 시킨 것이다. 이 사회에는 드러나 있는 폭력보다 가려진 폭력이 더 잔인하고 심각하다. 따라서 1366 프로젝트는 아름다움, 사랑, 화려함, 행복의 표면에 숨겨진 폭력을 의미한다.
노승복 작가노트
한나
반짝이는 은색 스타킹.
지문 하나 묻어 있지 않은 검정색 에나멜 하이힐.
엉덩이 위로 올라갈까 조마조마한 미니스커트.
브라선 위로 살집 하나 비집어 나오지 않은 매끈한 등선.
이마에서부터 곡선 가르마를 타고 내려온 탈력 진 웨이브 머리칼.
한 올 한 올 뭉치지 않고 올라간 마스카라.
한 듯 안 한 듯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한나의 모습이다. 그녀의 이름은 나한나.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한나라고 소개한다. ‘나’라는 글자가 그녀를 귀찮게 한다. “거꾸로 해도 나한나네요?” “네……” 이런 지겨운 대화라니. 그래서 그녀는 그냥 한나다.
한나예요.
그런 그녀의 입이 새초롬하다. 그러나 그녀가 한나라고 불리는 곳은 흔치 않다.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아이들의 집을 방문한다. 말끔한 구두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중력의 힘을 덜 받는 듯하다. 행여나 보도블록 틈새에 힐이 끼지 않을 까 조심하며 허벅지에 힘을 주고, 발목에는 힘을 빼고 마치 날아오르듯 걷는 것이다. 상처는 좋지 않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다. 상처는 나쁜 것이다. 학습지 교사는 아이들에게 상처 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직업이다. 한나의 걸음걸이는 아이들에게서도 발휘된다. 아이들의 틈새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속내를 들여다 볼 필요도 그들의 생활에 관여할 필요도 없다. 한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스타킹을 마음껏 신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정색 무난한 것부터 빨강, 노랑, 은색까지 한나의 스타킹은 한나의 기분을 대신하는 것 같다. 스타킹 색이 눈에 띄도록 되도록이면 짧은 스커트를 입는다. 물론 아이들 집에 방문할 때 치마 길이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하면서도 빛나게 아름다운 외모가 치마길이 따위에 눈살을 찌푸리지 못하게 한다. 15분 동안의 학습코칭과 교재전달이 끝나면 그 누구도 아쉬워하는 일 없이 한나는 구두를 신는다. 그런데 어느 날.
왜 만날 스타킹을 신어요?
라고 한 아이가 물었다. 아이의 엄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매일 늦는 것 같다. 처음 방문한 날을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다. 한나는 살짝 당황스러웠다. 아이들의 질문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는 이골이 나 있다.
추워서.
하고 역시나 새초롬하게 답하고는 학습지에 무수히 반복되는 문제 중 세 개를 아무렇게나 골라 동그라미 쳤다.
풀어.
아이는 두 문제를 풀 다 말고
추운데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요? 그냥 바지를 입거나 긴 코트를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한나.
성은요?
그냥 한나야. 시간 다 됐다. 다음에 보자.
배 안 고파요?
한나는 아이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다. 이 집은 한나가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으로 다른 집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이미 저녁 8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안 고프다고 말함과 동시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것 만 같았다.
한나 선생님, 저랑 라면 먹을래요? 저 학교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미안. 혼자 먹어. 난 가봐야 해.
하지만 전 혼자 가스 불 못 켜요. 저번에도 혼자 라면 먹으려다 집에 불 낼 뻔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밥도 없고요. 엄마는 내가 잘 때나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한나는 그냥 나가려다 엄마가 늦게 들어온다는 말에 다시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미 저녁 시간이 한 참 지난 때였다. 가스 불을 켜고 라면 두 개를 끓이는 데 아이가 냉장고에서 달걀 두 개를 꺼내왔다. 한나는 달걀을 먹진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무 말없이 깨 넣었다. 순식간에 먹어치운 둘은 어느새 친해진 기분이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들 틈새에 끼지 않는다.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선다. 따뜻해진 몸이 찬바람을 쐬니 부르르 떨린다. 아이는 아마도 푹 잘 수 있겠지 하고 한나는 생각하다 곧 도리질을 한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스타킹을 벗었다. 맨다리에 정성스럽게 로션을 바르고 새 스타킹을 신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의 틈새에 끼어 아이의 말이 생각났다. 꿈에서 아이는.
왜 스타킹을 신고자요?
추워서.
거짓말.
날이 밝았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한 한나는 모르는 번호로 여러 차례 온 부재중 통화를 확인했다. 여러 차례 온 것으로 봐서는 잘 못 걸려온 전화는 아닌 것 같다. 통화버튼을 누른다.
한나 선생님?
누구니?
아이의 목소리다. 눈물로 가득 찬. 한나가 기억하는 눈물로 가득 찬 목소리. 한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울고 있는지, 울지 않아도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지.
저예요. 준이요, 김준.
김준? 누구지, 누굴까? 한나는 머릿속의 학습지 리스트를 한 장 씩 넘겨본다.
어제 라면……
어, 그래. 무슨 일이니?
우리 엄마가 죽었대요.
응, 뭐라고?
엄마가 죽었대요. 엄마가 어제 안 들어 왔어요.
아이의, 그러니까 김준의 엄마는 죽었다. 한나는 준이가 알려준 병원 영안실로 가 보았다.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심장이 오랜만에 요란스럽게 뛰었다. 아이는 멍하니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친척도 없는지 아이만 덩그러니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의 죽음이 죽음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한나는 단정 지었다. 한나는 자신이 그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한나와 준이는 병원 앞 김밥 집에 갔다. 준이는 따뜻한 떡국이 먹고 싶다고 했다. 한나는 주문할 때 달걀 하나를 더 넣어 달라고 한다. 어제 저녁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자길 잘 했다고 준이를 바라보다 생각한다. 그래서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다고. 준이는 먹다 말고.
우리 엄마도 항상 스타킹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결혼 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볼 때마다 왜 스타킹을 신는지 궁금했어요. 난 아빠랑 따로 살 면 엄마가 이제 스타킹을 안 신을 줄 알았어요. 우리엄마는 다리가 정말 예쁘거든요. 빨강파랑 멍이 안들 때 봤는데, 정말 새하얗고 예뻤어요…… 아빠가 엄마를 죽였대요. 들었어요, 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번 들었으니까 맞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라면만 먹자고 안했으면 선생님이 나가시다가 우리 엄마를 만났을 텐데. 그러면 엄마는 아빠를 안 만나고 집으로 바로 들어왔을 텐데. 나는 이제 다시는 라면 안 먹을 거예요.
울지 않는데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눈물이 떡국에 똑똑. 한나는.
우리 엄마도 항상 스타킹을 신으셨어. 그래서 나도 그래. 난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먹었니?
한나는 계산을 한 후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벗는다. 싸늘한 공기가 맨다리로 전해진다. 준이는 검은 상복에 묻은 국물을 닦고 있다.
이거 빌려준 거래요. 뭐 묻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돈 내야 한다고. 아이씨, 달걀이 묻어서 안 지워져요. 혼나겠다. 잘 먹었습니다.
준이는 인사를 하고 영안실로 다시 들어갔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내내 한나의 머릿속에선 넌 나쁜 사람이 아냐, 넌 나쁜 사람이 아냐, 넌 나쁜 사람이 아냐, 넌 나쁜 사람이 아냐, 난 나쁜 사람이 아냐, 난 나쁜 사람이 아냐. 단지 무서웠었어. 나도 멍이 들까봐. 두려웠어. 시커먼 멍이 내 인생을 뒤덮을 까봐. 그래서 그런 거야. 난 나쁜 사람이 아냐. 단지 무서워서 도망친 것뿐이야. 그 뿐이야.
라고.
피서라
반짝이는 은색 스타킹.
지문 하나 묻어 있지 않은 검정색 에나멜 하이힐.
엉덩이 위로 올라갈까 조마조마한 미니스커트.
브라선 위로 살집 하나 비집어 나오지 않은 매끈한 등선.
이마에서부터 곡선 가르마를 타고 내려온 탈력 진 웨이브 머리칼.
한 올 한 올 뭉치지 않고 올라간 마스카라.
한 듯 안 한 듯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한나의 모습이다. 그녀의 이름은 나한나.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한나라고 소개한다. ‘나’라는 글자가 그녀를 귀찮게 한다. “거꾸로 해도 나한나네요?” “네……” 이런 지겨운 대화라니. 그래서 그녀는 그냥 한나다.
한나예요.
그런 그녀의 입이 새초롬하다. 그러나 그녀가 한나라고 불리는 곳은 흔치 않다.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아이들의 집을 방문한다. 말끔한 구두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중력의 힘을 덜 받는 듯하다. 행여나 보도블록 틈새에 힐이 끼지 않을 까 조심하며 허벅지에 힘을 주고, 발목에는 힘을 빼고 마치 날아오르듯 걷는 것이다. 상처는 좋지 않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다. 상처는 나쁜 것이다. 학습지 교사는 아이들에게 상처 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직업이다. 한나의 걸음걸이는 아이들에게서도 발휘된다. 아이들의 틈새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아이들의 속내를 들여다 볼 필요도 그들의 생활에 관여할 필요도 없다. 한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스타킹을 마음껏 신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정색 무난한 것부터 빨강, 노랑, 은색까지 한나의 스타킹은 한나의 기분을 대신하는 것 같다. 스타킹 색이 눈에 띄도록 되도록이면 짧은 스커트를 입는다. 물론 아이들 집에 방문할 때 치마 길이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하면서도 빛나게 아름다운 외모가 치마길이 따위에 눈살을 찌푸리지 못하게 한다. 15분 동안의 학습코칭과 교재전달이 끝나면 그 누구도 아쉬워하는 일 없이 한나는 구두를 신는다. 그런데 어느 날.
왜 만날 스타킹을 신어요?
라고 한 아이가 물었다. 아이의 엄마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매일 늦는 것 같다. 처음 방문한 날을 제외하고는 본 적이 없다. 한나는 살짝 당황스러웠다. 아이들의 질문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는 이골이 나 있다.
추워서.
하고 역시나 새초롬하게 답하고는 학습지에 무수히 반복되는 문제 중 세 개를 아무렇게나 골라 동그라미 쳤다.
풀어.
아이는 두 문제를 풀 다 말고
추운데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요? 그냥 바지를 입거나 긴 코트를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한나.
성은요?
그냥 한나야. 시간 다 됐다. 다음에 보자.
배 안 고파요?
한나는 아이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다. 이 집은 한나가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으로 다른 집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이미 저녁 8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안 고프다고 말함과 동시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것 만 같았다.
한나 선생님, 저랑 라면 먹을래요? 저 학교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미안. 혼자 먹어. 난 가봐야 해.
하지만 전 혼자 가스 불 못 켜요. 저번에도 혼자 라면 먹으려다 집에 불 낼 뻔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밥도 없고요. 엄마는 내가 잘 때나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한나는 그냥 나가려다 엄마가 늦게 들어온다는 말에 다시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미 저녁 시간이 한 참 지난 때였다. 가스 불을 켜고 라면 두 개를 끓이는 데 아이가 냉장고에서 달걀 두 개를 꺼내왔다. 한나는 달걀을 먹진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무 말없이 깨 넣었다. 순식간에 먹어치운 둘은 어느새 친해진 기분이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들 틈새에 끼지 않는다.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선다. 따뜻해진 몸이 찬바람을 쐬니 부르르 떨린다. 아이는 아마도 푹 잘 수 있겠지 하고 한나는 생각하다 곧 도리질을 한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스타킹을 벗었다. 맨다리에 정성스럽게 로션을 바르고 새 스타킹을 신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이의 틈새에 끼어 아이의 말이 생각났다. 꿈에서 아이는.
왜 스타킹을 신고자요?
추워서.
거짓말.
날이 밝았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한 한나는 모르는 번호로 여러 차례 온 부재중 통화를 확인했다. 여러 차례 온 것으로 봐서는 잘 못 걸려온 전화는 아닌 것 같다. 통화버튼을 누른다.
한나 선생님?
누구니?
아이의 목소리다. 눈물로 가득 찬. 한나가 기억하는 눈물로 가득 찬 목소리. 한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울고 있는지, 울지 않아도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지.
저예요. 준이요, 김준.
김준? 누구지, 누굴까? 한나는 머릿속의 학습지 리스트를 한 장 씩 넘겨본다.
어제 라면……
어, 그래. 무슨 일이니?
우리 엄마가 죽었대요.
응, 뭐라고?
엄마가 죽었대요. 엄마가 어제 안 들어 왔어요.
아이의, 그러니까 김준의 엄마는 죽었다. 한나는 준이가 알려준 병원 영안실로 가 보았다.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심장이 오랜만에 요란스럽게 뛰었다. 아이는 멍하니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친척도 없는지 아이만 덩그러니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의 죽음이 죽음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한나는 단정 지었다. 한나는 자신이 그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한나와 준이는 병원 앞 김밥 집에 갔다. 준이는 따뜻한 떡국이 먹고 싶다고 했다. 한나는 주문할 때 달걀 하나를 더 넣어 달라고 한다. 어제 저녁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자길 잘 했다고 준이를 바라보다 생각한다. 그래서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다고. 준이는 먹다 말고.
우리 엄마도 항상 스타킹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결혼 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볼 때마다 왜 스타킹을 신는지 궁금했어요. 난 아빠랑 따로 살 면 엄마가 이제 스타킹을 안 신을 줄 알았어요. 우리엄마는 다리가 정말 예쁘거든요. 빨강파랑 멍이 안들 때 봤는데, 정말 새하얗고 예뻤어요…… 아빠가 엄마를 죽였대요. 들었어요, 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번 들었으니까 맞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라면만 먹자고 안했으면 선생님이 나가시다가 우리 엄마를 만났을 텐데. 그러면 엄마는 아빠를 안 만나고 집으로 바로 들어왔을 텐데. 나는 이제 다시는 라면 안 먹을 거예요.
울지 않는데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눈물이 떡국에 똑똑. 한나는.
우리 엄마도 항상 스타킹을 신으셨어. 그래서 나도 그래. 난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먹었니?
한나는 계산을 한 후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벗는다. 싸늘한 공기가 맨다리로 전해진다. 준이는 검은 상복에 묻은 국물을 닦고 있다.
이거 빌려준 거래요. 뭐 묻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돈 내야 한다고. 아이씨, 달걀이 묻어서 안 지워져요. 혼나겠다. 잘 먹었습니다.
준이는 인사를 하고 영안실로 다시 들어갔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내내 한나의 머릿속에선 넌 나쁜 사람이 아냐, 넌 나쁜 사람이 아냐, 넌 나쁜 사람이 아냐, 넌 나쁜 사람이 아냐, 난 나쁜 사람이 아냐, 난 나쁜 사람이 아냐. 단지 무서웠었어. 나도 멍이 들까봐. 두려웠어. 시커먼 멍이 내 인생을 뒤덮을 까봐. 그래서 그런 거야. 난 나쁜 사람이 아냐. 단지 무서워서 도망친 것뿐이야. 그 뿐이야.
라고.
피서라
최원석展 / CHOI, WONSUK / 崔原碩 / 꽃구경 Flower Seeing / 2016. 09. 05 - 9. 30
꽃구경
사진이라는 매체를 처음 다룰 때부터 나도 모르게 도시에 이끌려 작업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것도 3류 도시, 짝퉁도시 같은 곳에서 말이다. 이번엔 3류도 짝퉁도 아닌 정치적인 도시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공간을 발견한다. 우연히 세종시를 지나다가 발견한 내일이면 사라질 빈방의 피어난 꽃이 참으로 대견해 보였다. 요즘말로 웃프다고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사람으로 치면 죽어서 주민등록상에 사라진 것처럼 연기군이란 주소는 이제 지도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한 연기군 죽은 집에서 세종시란 이름으로 태어난 꽃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찾아간 여행에서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니 나는 죽음의 공간에서 꽃구경을 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했다. 20대 시절 내가 제일 좋아하던, 우울한 날이면 가장 듣고 싶었던 안치환의 ‘마른잎 다시 살아나’라는 노래가 문득 머리에 스쳐간다.
서울을 닮고 싶었던 시골의 한마을에서 좌우대립의 싸움을 말리는 듯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난 시골 농부의 할머니를 위로하듯, 또는 다시 태어날 세종시의 안녕을 기원하듯이 활짝 피어있는 꽃들이 지쳐있는 나와 우리 현대인들을 위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착시를 안겨준다.
이렇게 점점 도시화되는 세상에서 영원한 도시인인 나에게 또 새로운 도시는 공간을 죽이기 살리기 하면서 세상을 교묘히 조작한다.
최원석 작가노트
사진이라는 매체를 처음 다룰 때부터 나도 모르게 도시에 이끌려 작업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것도 3류 도시, 짝퉁도시 같은 곳에서 말이다. 이번엔 3류도 짝퉁도 아닌 정치적인 도시에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공간을 발견한다. 우연히 세종시를 지나다가 발견한 내일이면 사라질 빈방의 피어난 꽃이 참으로 대견해 보였다. 요즘말로 웃프다고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사람으로 치면 죽어서 주민등록상에 사라진 것처럼 연기군이란 주소는 이제 지도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한 연기군 죽은 집에서 세종시란 이름으로 태어난 꽃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찾아간 여행에서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니 나는 죽음의 공간에서 꽃구경을 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했다. 20대 시절 내가 제일 좋아하던, 우울한 날이면 가장 듣고 싶었던 안치환의 ‘마른잎 다시 살아나’라는 노래가 문득 머리에 스쳐간다.
서울을 닮고 싶었던 시골의 한마을에서 좌우대립의 싸움을 말리는 듯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난 시골 농부의 할머니를 위로하듯, 또는 다시 태어날 세종시의 안녕을 기원하듯이 활짝 피어있는 꽃들이 지쳐있는 나와 우리 현대인들을 위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착시를 안겨준다.
이렇게 점점 도시화되는 세상에서 영원한 도시인인 나에게 또 새로운 도시는 공간을 죽이기 살리기 하면서 세상을 교묘히 조작한다.
최원석 작가노트
꽃잎이 진다. 첨벙, 꽃신을 신은 개구리가 물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무진을 떠났다. 먼지를 날리며 멀어져 가는 버스가 안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침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다. 참으니 눈물이 고였다. 목이 간지러웠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눈이 아파왔다. 눈물이 떨어진다. 무엇의 눈물인지 모르겠다. 아니 알겠다. 편지 한 장 안남기고 떠나다니, 어쩌면 썼지만 주지 못했을 지도 모르겠다. 왜 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까. 또 그렇게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꼭 같이 가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서울에 절 데려다 주시겠어요?’ 밤새 이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어쩐지 그를 처음 본 술자리에서부터 그는 나를 서울로 데려다 줄 것만 같았다. 분명 데려다 주지 않을 테지만 꼭 이 말을 뱉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느 개인 날> 대신 <목포의 항구>를 부를 때부터.
그와 헤어지고 잠자리에 눕자 자꾸만 같이 서울행 버스를 타는 상상을 하게 됐다. 자정을 넘기자 개구리가 요란스레 울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개구리 울음소리가 최면 마냥 더 깊은 공상을 가능케 했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넘어올 무렵 잠이 든 것 같다. 개운한 불면의 밤이었다.
무진의 새벽이다. 동이 트면 안개의 색을 더욱 짙게 만드는 무진의 새벽. 그 안개를 들이마시면 어쩐지 숨이 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했다. 무수한 안개 포자들이 얼굴 솜털에 달라붙어 동글동글 소름끼치는 무늬를 만들어 낸다. 손등으로 쓱 문질러 포자들을 떨어내고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숨을 참은 채 얼마나 오랫동안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무의식중에 숫자를 세다 그만둔다. 멀리서 목쉰 개구리가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며 하품을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첨벙! 발을 헛디뎌 냇가에 빠졌다. 첨벙! 냇가에 빠진 발은 그대로 인데 또 한 번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물도 산처럼 메아리를 치는 것인가.
그는 부인이 있다. 그것도 돈도 많고 예쁜 부인. 다시 결혼한다 해도 나 같은 시골 음악선생을 택할 리 없다. 그래도 서울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끈끈한 공기로 숨 막힌 무진에서 그 말을 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다시는 <목포의 항구>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유행가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느 개인 날>을 달리 부르고 싶지도 않았다. 어쩐지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면……. 알면서도 모르고 싶다. 그와 바닷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분홍 꽃들이 만개한 그 방안에서 담배연기를 맡으며 잠이 든 채, 잠이 들지 않은 채 들었던, 듣지 않았던 목소리. 인숙이 인숙이. 그 다음 말을 나는 꿈에서 이었다. 꿈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일까. 동이 틀 무렵 나는 담배 연기에 숨이 막혀 잠에서 깼다. 매캐한 담배연기 가득한 방 어디쯤에서 분홍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무진의 공기에서 첨벙! 무언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장날 사 두었던 ‘푸른 꽃무늬 하얀 고무신’을 꺼내 들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고무신을 신었다. 밤안개는 밤이라서 더 하얗다. 물가 가장자리를 걷다 보니 신 안으로 물이 들어와 걸을 적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 개구리는 개굴개굴 울진 않지만 고무신도 개굴개굴 울진 않지만 어쩐지 모두가 개구리 소리 같다고 생각했다. 개구리와 꽃신이 함께 운다. 첨벙! 어디선가 호전적인 개구리가 요란하게 물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조심스럽게 물가를 건너 마지막 발자국을 진흙위에 새겨 두었다. 그는 떠났다. 서울에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약속도 편지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이 새벽녘 안개처럼 짙게 머물렀다 한낮의 뙤약볕만을 남기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나는 물에 뛰어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청범 거리는 소리와 푸른 꽃무늬 하얀 고무신이 나 또한 안개 속에 몸을 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저 서울행 버스를 멀리서 보내고 있을 뿐이다. 다시는 유행가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시는 <목포의 항구>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나는 다시 <목포의 항구>를 아리아처럼 바꿔 부르며 무진의 안개에 젖어 꽃신을 고쳐 신는다. 서울행 버스를 잡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시 그가 온다 해도, 그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후회는 언제나 후회로 남을 것이다. 꽃잎이 다 떨어진 그 방에서 홀로 <어느 멋진 날>을 소리 없이 부르지 않았다.
_글 피서라(*김승옥 「무진기행」‘인숙’ 차용)
피서라
-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이 안개를, 외롭게 미쳐 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 _김승옥 「무진기행」
그는 무진을 떠났다. 먼지를 날리며 멀어져 가는 버스가 안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침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다. 참으니 눈물이 고였다. 목이 간지러웠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눈이 아파왔다. 눈물이 떨어진다. 무엇의 눈물인지 모르겠다. 아니 알겠다. 편지 한 장 안남기고 떠나다니, 어쩌면 썼지만 주지 못했을 지도 모르겠다. 왜 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까. 또 그렇게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꼭 같이 가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서울에 절 데려다 주시겠어요?’ 밤새 이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어쩐지 그를 처음 본 술자리에서부터 그는 나를 서울로 데려다 줄 것만 같았다. 분명 데려다 주지 않을 테지만 꼭 이 말을 뱉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느 개인 날> 대신 <목포의 항구>를 부를 때부터.
그와 헤어지고 잠자리에 눕자 자꾸만 같이 서울행 버스를 타는 상상을 하게 됐다. 자정을 넘기자 개구리가 요란스레 울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개구리 울음소리가 최면 마냥 더 깊은 공상을 가능케 했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넘어올 무렵 잠이 든 것 같다. 개운한 불면의 밤이었다.
무진의 새벽이다. 동이 트면 안개의 색을 더욱 짙게 만드는 무진의 새벽. 그 안개를 들이마시면 어쩐지 숨이 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했다. 무수한 안개 포자들이 얼굴 솜털에 달라붙어 동글동글 소름끼치는 무늬를 만들어 낸다. 손등으로 쓱 문질러 포자들을 떨어내고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숨을 참은 채 얼마나 오랫동안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무의식중에 숫자를 세다 그만둔다. 멀리서 목쉰 개구리가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며 하품을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첨벙! 발을 헛디뎌 냇가에 빠졌다. 첨벙! 냇가에 빠진 발은 그대로 인데 또 한 번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물도 산처럼 메아리를 치는 것인가.
그는 부인이 있다. 그것도 돈도 많고 예쁜 부인. 다시 결혼한다 해도 나 같은 시골 음악선생을 택할 리 없다. 그래도 서울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끈끈한 공기로 숨 막힌 무진에서 그 말을 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다시는 <목포의 항구>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유행가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느 개인 날>을 달리 부르고 싶지도 않았다. 어쩐지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면……. 알면서도 모르고 싶다. 그와 바닷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분홍 꽃들이 만개한 그 방안에서 담배연기를 맡으며 잠이 든 채, 잠이 들지 않은 채 들었던, 듣지 않았던 목소리. 인숙이 인숙이. 그 다음 말을 나는 꿈에서 이었다. 꿈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일까. 동이 틀 무렵 나는 담배 연기에 숨이 막혀 잠에서 깼다. 매캐한 담배연기 가득한 방 어디쯤에서 분홍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무진의 공기에서 첨벙! 무언가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장날 사 두었던 ‘푸른 꽃무늬 하얀 고무신’을 꺼내 들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고무신을 신었다. 밤안개는 밤이라서 더 하얗다. 물가 가장자리를 걷다 보니 신 안으로 물이 들어와 걸을 적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 개구리는 개굴개굴 울진 않지만 고무신도 개굴개굴 울진 않지만 어쩐지 모두가 개구리 소리 같다고 생각했다. 개구리와 꽃신이 함께 운다. 첨벙! 어디선가 호전적인 개구리가 요란하게 물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조심스럽게 물가를 건너 마지막 발자국을 진흙위에 새겨 두었다. 그는 떠났다. 서울에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약속도 편지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이 새벽녘 안개처럼 짙게 머물렀다 한낮의 뙤약볕만을 남기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나는 물에 뛰어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청범 거리는 소리와 푸른 꽃무늬 하얀 고무신이 나 또한 안개 속에 몸을 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저 서울행 버스를 멀리서 보내고 있을 뿐이다. 다시는 유행가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시는 <목포의 항구>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나는 다시 <목포의 항구>를 아리아처럼 바꿔 부르며 무진의 안개에 젖어 꽃신을 고쳐 신는다. 서울행 버스를 잡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시 그가 온다 해도, 그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후회는 언제나 후회로 남을 것이다. 꽃잎이 다 떨어진 그 방에서 홀로 <어느 멋진 날>을 소리 없이 부르지 않았다.
_글 피서라(*김승옥 「무진기행」‘인숙’ 차용)
- 들어봐, 스즈키. 곧 어느 화창한 날에 저 수평선에 하얀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오르는 거야. 그리고 배 한 척이 나타나는 거지. 하얀 배가 천천히 항구로 들어와. 가까이 다가와서 예포를 쏘고 있어. 귀향을 알리는 거야.
- 자, 보여? 그가 돌아왔어, 그가!
- 하지만 난 마중하러 안 나갈 거야. 안 나가. 대신에 언덕배기 능선에 꼭꼭 숨어서 기다릴 거야. 그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기다리는 건 이제 전혀 힘든 게 아니거든.
- 이제 항구에 몰린 인파를 헤치고 배에서 내린 한 남자가 보여. 꼭 찍어놓은 점처럼 작게 보이는 그가 언덕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해. 그가 누구게? 누구일 것 같아? 올라오는 걸 좀 봐! 와서 뭐라고 하게? 뭐라고 할 것 같아?
- 멀리서부터 ‘나의 나비’라고 부르면서 오고 있잖아. 그래도 난 대답 안 하고 숨을 거야. 조금은 골려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안 숨으면... 내가 가슴이 터져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를 마주치면 말야... 그러면 그도 초조해져서 나를 막 불러대겠지. 내 작은 비둘기, 내 작은 아내, 향기로운 베르베나... 날 보러 올 때마다 나한테 붙여준 이름들을 부르면서 나를 찾아 헤매겠지.
- 봐, 스즈키. 꼭 이렇게 된다니까. 약속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 걱정은 넣어 둬. 난 그를 믿고 있으니까, 그를 믿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야.
- _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느 개인 날'
피서라
차진현展 / CHA, JINHYUN / 車珍玄 / Portrait of 108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omen / 2016. 07. 11 – 2016. 09. 02
기억이 흐려진 이후
니체는 자신의 저서, 권력에의 의지를 통해 역사는 허구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가 사실에 대한 기록일거라 믿는다. 또한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어떤 사건이나 사실은 개별의 역사가 아닌 파편화된 역사이며, 보편에 의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지금까지의 역사관에 대하여 심각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지나온 길을 거슬러 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함이 바로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아우성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중심의 역사가 아닌 주변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가 지난 과거에 대해 재해석하려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지금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념으로 얼룩진 인간과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 한국이라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바로 ‘역사의 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써 말이다. 인간이 공동체 삶을 지향한 후, 이상적 삶을 같이 고민하였고, 같이 꿈꾸었으며, 무책임한 이론들 일지라도 그것들을 믿었고, 그 주장들을 수긍하고 긍정해 왔다. 국가 통치를 위한 이념, 그들만의 변명을 위한 이념들 일지라도 말이다. 결국 권력유지를 위해 쏟아낸 수많은 외침들은 서로 간의 대립과 충돌로 막을 올렸고 폭력이라는 꽃을 피웠으며, 또한 죽음을 통해 그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무대 뒤엔 얼룩진 유령들만 남았다. 곱디고운 나이에 온몸으로 시대의 잔학성을 경험하였던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죽은 영혼에 대신할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억은 대체 불가능한 그들만의 잠상일터,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이다.
이러하듯, “108인의 초상”은 이념으로 얼룩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작업이다. 우리의 참혹했던 지난 역사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치부된 여성인권에 대한 묵묵한 성찰을 그렸다. 하지만 이 작업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진 틀 속에 불러 세움과 마주 세움이라는 의미적 확장이다. 불러 세움은 망각과 기억의 경계를 지시하며, 마주 세움은 사변적 혹은 변증법적 성찰을 유도한다. 특히, 검은 배경 속에 출몰한 유령처럼 선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부유하는 망자의 흔적인 양 우리를 엄습한다. 본래 사진은 비가시적인 가시성을, 현재였던 어떤 과거와 있던 그대로의 현재가 되어 있을 바로 그 과거 사이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던가!
나는 그들 앞에 섰고 그들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그들은 이제 한 분 한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다. 어쩌면 내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 망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역사 속에 머물러야 할지 여전히 의문만을 남긴 채 말이다. 그것이 내가 이 사진들을 통해 고민하는 바이기도 하고, 지시하는 바이기도 하다. “사진에는 과거와 현실이 결합된 이중적 상황이 있다”라고 바르트가 언급했던가...
이러한 사진적 지시체, 그것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실에 대한 가능성이기를 나는 희망한다.
차진현 작가노트
니체는 자신의 저서, 권력에의 의지를 통해 역사는 허구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가 사실에 대한 기록일거라 믿는다. 또한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어떤 사건이나 사실은 개별의 역사가 아닌 파편화된 역사이며, 보편에 의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지금까지의 역사관에 대하여 심각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지나온 길을 거슬러 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함이 바로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아우성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중심의 역사가 아닌 주변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가 지난 과거에 대해 재해석하려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지금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이념으로 얼룩진 인간과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 한국이라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바로 ‘역사의 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써 말이다. 인간이 공동체 삶을 지향한 후, 이상적 삶을 같이 고민하였고, 같이 꿈꾸었으며, 무책임한 이론들 일지라도 그것들을 믿었고, 그 주장들을 수긍하고 긍정해 왔다. 국가 통치를 위한 이념, 그들만의 변명을 위한 이념들 일지라도 말이다. 결국 권력유지를 위해 쏟아낸 수많은 외침들은 서로 간의 대립과 충돌로 막을 올렸고 폭력이라는 꽃을 피웠으며, 또한 죽음을 통해 그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무대 뒤엔 얼룩진 유령들만 남았다. 곱디고운 나이에 온몸으로 시대의 잔학성을 경험하였던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죽은 영혼에 대신할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억은 대체 불가능한 그들만의 잠상일터,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이다.
이러하듯, “108인의 초상”은 이념으로 얼룩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작업이다. 우리의 참혹했던 지난 역사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치부된 여성인권에 대한 묵묵한 성찰을 그렸다. 하지만 이 작업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진 틀 속에 불러 세움과 마주 세움이라는 의미적 확장이다. 불러 세움은 망각과 기억의 경계를 지시하며, 마주 세움은 사변적 혹은 변증법적 성찰을 유도한다. 특히, 검은 배경 속에 출몰한 유령처럼 선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부유하는 망자의 흔적인 양 우리를 엄습한다. 본래 사진은 비가시적인 가시성을, 현재였던 어떤 과거와 있던 그대로의 현재가 되어 있을 바로 그 과거 사이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던가!
나는 그들 앞에 섰고 그들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그들은 이제 한 분 한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다. 어쩌면 내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이미 망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역사 속에 머물러야 할지 여전히 의문만을 남긴 채 말이다. 그것이 내가 이 사진들을 통해 고민하는 바이기도 하고, 지시하는 바이기도 하다. “사진에는 과거와 현실이 결합된 이중적 상황이 있다”라고 바르트가 언급했던가...
이러한 사진적 지시체, 그것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실에 대한 가능성이기를 나는 희망한다.
차진현 작가노트
소녀가 온다
그것은 무거운 것임에 틀림없었다.
나의 몸뚱이로 쏟아지는 흙들 위로 너의 땀이 촉촉이 내려왔다가 이내 흙으로 뒤덮인다. 간혹 ‘생각이 많은 부엉이’들이 너의 삽질에 박자를 맞춰 우우-.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적의 소음으로 숨이 멎을 듯 헐떡이는 너의 숨소리. 너는 지금 숨 쉬는 법을 잊는다. 삽질의 리듬도 엉망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흙이 너의 땀을 덮지 못한다. 흙은 먼지가 되어 공기 중으로 흩날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교묘히 자리 잡은 부엉이의 눈 속으로 침입한다. 그것의 눈마저 멀게 하고픈 너의 심정일까. 우우- 거리는 그것의 주둥이마저 틀어막고픈 너의 헐떡임. 허공으로 흩날리는 삽질의 아우성이 그저 우습게 보이는 것 뿐 이라고 ‘생각이 많은 부엉이’는 우우- 한다. 너는 우는 것이다. 헐떡이다 못해 우는 것이다. 아래로 쏟아지고 위로 날리는 흙의 냄새를 너는 맡는다. 오로지 열려 있는 감각이라고는 후각뿐. 진한 흙냄새가 비릿하기까지 하다. 어둠보다 어두운 어둠속에서 부엉이의 눈만이 너를 비추고, 정적의 데시벨은 이미 너의 귀를 멎게 했다. 마치 너는 바다 속에서 삽질을 하듯 우아한 듯 우스운 꼴이다. 마침내 흙이 구덩이를 메웠을 때, 너는 안도의 숨을 잊는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할 일을 잊은 사람처럼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네가 덮은 흙들을 쏘아본다. 다시 파라, 우우-. 부엉이는 말한다. 너는 마치 최면에 빠진 듯 흙을 다시 파기 시작한다. 너는 전투를 하듯 철모도 벗지 않은 채 열심이다. 나를 어디에 묻던 너는 나를 다시 파고 다시 묻고 다시 파고 다시 묻고 다시 파고 다시묻고 다시파고 다시묻고 다시파고다시묻고다시파고다시묻고다시파고다시묻고……
엄마, 나는 죽었어. 아부지, 나는 드디어 죽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는 나를 보지 않았다. 네가 천막을 걷고 들어왔을 때 너는 분명 무언가에 머뭇거렸지만 용감한 척, 무심한 척, 잔인한 척, 비인간적인 척, 비동물적인 척, 비생물적인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시선을 돌렸다. 너는 분명 두려웠었다. 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던 차에 나는 그것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나의 숨이 끊어진 후 이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치마는 없어진지 오래다. 나는 죽었지만 나의 몸뚱이를 덮어줄 천 쪼가리 하나 조차 없어진 지 오래다. 너의 허리띠 버클이 끌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너의 바지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죽었다. 너는 나를 보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너는 달랐다. 나는 요 근래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천막의 문이 걷히고 너의 용감한 척, 무심한 척, 잔인한 척, 비인간적인 척, 비동물적인 척, 비생물적인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하는 눈빛이 다시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척이라도 하는 너의 애씀마저도 고마울 따름이었다. 너는 나를 봤고 반사적으로 나를 덮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를 덮을 무언가를 찾지 못해 당황해하고 있었다. 나의 치마는 이 천막 어디에서 굴러다니고 있는지 나조차 알지 못했고 너도 알지 못했다. 너는 심히 괴로워보였다. 그래, 생각해 보면 너의 인 척 하는 기만의 눈빛은 천막의 문을 걷어내는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너는 착한 사람인가 보다. 나의 착함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언젠가부터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너는 어디선가 모포 따위를 가져와 그것으로 나를 둘둘 말아 들쳐 업고는 정신없이 숲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너의 무게와 나의 무게만큼 너의 군화는 숲을 엉망으로 패어 놓았다. 너는 왜 나를 묻으려 하는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정신없이 숲을 오르면서도 너는 왜 나를 묻어야 하는지 왜 자신이 그래야만 하는지 갈등했지만 너의 발은 이미 긴 발자국을 내며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나는 그것이 어둠속에서 반짝이는 부엉이 눈동자만한 희망이라 생각했다. 그런 작은 희망이라니. 희망이, 희망이 될 수 없는 차가운 몸뚱이로 느끼는 절망적인 희망이라니. 순간 나는 너의 머리를 너의 어깨에 걸린 긴 총으로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나의 손은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너와 나를 내려다 볼 뿐이었다. 흘러넘치다 못해 미끈하게 너의 온 몸을 감아 쥔 땀이 나를 위한 눈물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 순간만이라도 천막의 문을 들어 올렸던 너의 손이 부끄러웠다고 느끼기를.
이제 내려놔, 우우-.
부엉이가 우우- 한다. 나는 몇 초라도 평온해지고 싶어 힘들어하는 너의 등에서 빨리 내려오려 했지만 역시 나는 주검일 뿐이다. 너는 나를 내동댕이치다 시피 바닥에 던져 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분노, 후회, 책망,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을 너의 감정들이 땀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그리고 땅으로 흡수됐다. 나의 치마를 찾아와 줬더라면 아마도 나는 너를 용서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말하겠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 다만 호기심에 들 ……. 그래도 난 널 이렇게 묻어 주…….’ 그래, 나의 판단기준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 너의 땀방울마저, 너의 주저함마저 고마울 따름이다. 드디어 너는 땅에 나를 묻었다. 저고리 하나 간신히 입은,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헐벗은 나를 차가운 진흙으로 덮어 주었다. 나의 주검에 착 붙어 점점 짓누르는 그것의 무게가 포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파헤쳐지고 다시 묻히고 다시 파헤쳐지고 다시 묻히고 다시 파헤쳐지고 다시 묻히고 다시파헤쳐지고 다시묻히고 다시파헤쳐지고 다시묻히고 다시파헤쳐지고다시묻히고다시파헤쳐지고다시묻히고……. 너와 나는 온전히 온전치 못할 것이다. 너의 너희들을 이 무덤에 불러 세울 때까지.
피서라
* 한 강 「소년이 온다」 ‘너’와 ‘나’ 차용.
그것은 무거운 것임에 틀림없었다.
나의 몸뚱이로 쏟아지는 흙들 위로 너의 땀이 촉촉이 내려왔다가 이내 흙으로 뒤덮인다. 간혹 ‘생각이 많은 부엉이’들이 너의 삽질에 박자를 맞춰 우우-.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적의 소음으로 숨이 멎을 듯 헐떡이는 너의 숨소리. 너는 지금 숨 쉬는 법을 잊는다. 삽질의 리듬도 엉망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흙이 너의 땀을 덮지 못한다. 흙은 먼지가 되어 공기 중으로 흩날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교묘히 자리 잡은 부엉이의 눈 속으로 침입한다. 그것의 눈마저 멀게 하고픈 너의 심정일까. 우우- 거리는 그것의 주둥이마저 틀어막고픈 너의 헐떡임. 허공으로 흩날리는 삽질의 아우성이 그저 우습게 보이는 것 뿐 이라고 ‘생각이 많은 부엉이’는 우우- 한다. 너는 우는 것이다. 헐떡이다 못해 우는 것이다. 아래로 쏟아지고 위로 날리는 흙의 냄새를 너는 맡는다. 오로지 열려 있는 감각이라고는 후각뿐. 진한 흙냄새가 비릿하기까지 하다. 어둠보다 어두운 어둠속에서 부엉이의 눈만이 너를 비추고, 정적의 데시벨은 이미 너의 귀를 멎게 했다. 마치 너는 바다 속에서 삽질을 하듯 우아한 듯 우스운 꼴이다. 마침내 흙이 구덩이를 메웠을 때, 너는 안도의 숨을 잊는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할 일을 잊은 사람처럼 할 일 없이 우두커니.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네가 덮은 흙들을 쏘아본다. 다시 파라, 우우-. 부엉이는 말한다. 너는 마치 최면에 빠진 듯 흙을 다시 파기 시작한다. 너는 전투를 하듯 철모도 벗지 않은 채 열심이다. 나를 어디에 묻던 너는 나를 다시 파고 다시 묻고 다시 파고 다시 묻고 다시 파고 다시묻고 다시파고 다시묻고 다시파고다시묻고다시파고다시묻고다시파고다시묻고……
엄마, 나는 죽었어. 아부지, 나는 드디어 죽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는 나를 보지 않았다. 네가 천막을 걷고 들어왔을 때 너는 분명 무언가에 머뭇거렸지만 용감한 척, 무심한 척, 잔인한 척, 비인간적인 척, 비동물적인 척, 비생물적인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시선을 돌렸다. 너는 분명 두려웠었다. 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던 차에 나는 그것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나의 숨이 끊어진 후 이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치마는 없어진지 오래다. 나는 죽었지만 나의 몸뚱이를 덮어줄 천 쪼가리 하나 조차 없어진 지 오래다. 너의 허리띠 버클이 끌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너의 바지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죽었다. 너는 나를 보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너는 달랐다. 나는 요 근래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천막의 문이 걷히고 너의 용감한 척, 무심한 척, 잔인한 척, 비인간적인 척, 비동물적인 척, 비생물적인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하는 눈빛이 다시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척이라도 하는 너의 애씀마저도 고마울 따름이었다. 너는 나를 봤고 반사적으로 나를 덮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를 덮을 무언가를 찾지 못해 당황해하고 있었다. 나의 치마는 이 천막 어디에서 굴러다니고 있는지 나조차 알지 못했고 너도 알지 못했다. 너는 심히 괴로워보였다. 그래, 생각해 보면 너의 인 척 하는 기만의 눈빛은 천막의 문을 걷어내는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너는 착한 사람인가 보다. 나의 착함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언젠가부터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너는 어디선가 모포 따위를 가져와 그것으로 나를 둘둘 말아 들쳐 업고는 정신없이 숲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너의 무게와 나의 무게만큼 너의 군화는 숲을 엉망으로 패어 놓았다. 너는 왜 나를 묻으려 하는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정신없이 숲을 오르면서도 너는 왜 나를 묻어야 하는지 왜 자신이 그래야만 하는지 갈등했지만 너의 발은 이미 긴 발자국을 내며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나는 그것이 어둠속에서 반짝이는 부엉이 눈동자만한 희망이라 생각했다. 그런 작은 희망이라니. 희망이, 희망이 될 수 없는 차가운 몸뚱이로 느끼는 절망적인 희망이라니. 순간 나는 너의 머리를 너의 어깨에 걸린 긴 총으로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나의 손은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너와 나를 내려다 볼 뿐이었다. 흘러넘치다 못해 미끈하게 너의 온 몸을 감아 쥔 땀이 나를 위한 눈물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 순간만이라도 천막의 문을 들어 올렸던 너의 손이 부끄러웠다고 느끼기를.
이제 내려놔, 우우-.
부엉이가 우우- 한다. 나는 몇 초라도 평온해지고 싶어 힘들어하는 너의 등에서 빨리 내려오려 했지만 역시 나는 주검일 뿐이다. 너는 나를 내동댕이치다 시피 바닥에 던져 놓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분노, 후회, 책망,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을 너의 감정들이 땀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그리고 땅으로 흡수됐다. 나의 치마를 찾아와 줬더라면 아마도 나는 너를 용서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말하겠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 다만 호기심에 들 ……. 그래도 난 널 이렇게 묻어 주…….’ 그래, 나의 판단기준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 너의 땀방울마저, 너의 주저함마저 고마울 따름이다. 드디어 너는 땅에 나를 묻었다. 저고리 하나 간신히 입은,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헐벗은 나를 차가운 진흙으로 덮어 주었다. 나의 주검에 착 붙어 점점 짓누르는 그것의 무게가 포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파헤쳐지고 다시 묻히고 다시 파헤쳐지고 다시 묻히고 다시 파헤쳐지고 다시 묻히고 다시파헤쳐지고 다시묻히고 다시파헤쳐지고 다시묻히고 다시파헤쳐지고다시묻히고다시파헤쳐지고다시묻히고……. 너와 나는 온전히 온전치 못할 것이다. 너의 너희들을 이 무덤에 불러 세울 때까지.
피서라
* 한 강 「소년이 온다」 ‘너’와 ‘나’ 차용.
김지연展 / KIM, JEEYOUN / 金池蓮 / 빈방에 서다 Empty Room / 2016. 06. 20 - 07. 08
빈방에 서다#1, 2 Empty Room, C Print, 100cm×70cm, 2015
사람이 모두 떠나버리고 없는 빈집, 빈방에 발을 들여 놓을 때마다 흡사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서늘함을 느껴야 했다. 한 때는 가족의 희망이며 보금자리였을 공간이 이제는 모든 희망을 걷어가 버리고 절망과 회한만을 남기고 간 자리로 남아있다. 빈방의 창문은 희미했으며 그곳에 걸린 커튼은 사람이 살았었다는 나지막한 고백 같았다.
빈집, 빈방을 찍는다는 일은 맥이 빠지는 일이다. 살았던 사람들의 기가 쇄진해 버린 데다 그나마 있던 기력마저 데리고 가버린 공간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공기조차 무거워 무덤 같기도 했다. 철거 대상의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 미로 같았고 천정은 낮았다. 어떤 공간에 들어서니 창문도 없는 방에 부서진 침대 하나가 남아 있는데 여분의 공간은 한 치도 없었다. 그 방에서 침대를 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들여올 수 없는 구조였다. 눅진한 공기 속에서 삐져나온 매트의 속살들은 섬뜩함 바로 그것이었다.
빈방에 서다#3, 4 Empty Room, C Print, 60cm× 40cm, 2015
어느 날 산꼭대기 빈집에 들어섰다. 들어서는 현관에 빈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대개의 빈집들은 문이 꼭꼭 잠겨져있다. 그 중 문이 열린 집은 폐허의 빛깔이 선연했다. 나는 애써 아무 감정도 없이 신발을 신은 체 방문을 열어 제치고 들어섰다(때로는 열 문도 없다). 방안으로 쪽문이 나있고 안은 창문도 없이 어두컴컴했다. 그 곳에 밧줄 한 자락이 드리워져있고 그 아래 창백한 중년의 여인이 벽에 기대어 앉아있었다. 흘러 내려진 밧줄 아래로 드러난 모습이 인형 같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나는 얼른 돌아섰다. 그 순간 어떻게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후 수습은 절차를 밟아 처리 되었다. 오랫동안 아른거리는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내 사진은 빛이 밝다. 꽃무늬 벽지와 오렌지색 커튼과 바다를 닮은 파란 벽들은 순진하게 밝다. 더 이상 무거워 질 수 없는 오기 같은 것이 있었다.
어제 사진 찍고 간 빈집이 오늘 헐리는 것을 보는 일은 충격이었다. 건물을 제거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과 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거의 손에 쥔 거 없이 쫓겨나다 시피 하는 철거민들에게 ‘보금자리’라는 임대 아파트를 짓고 회유의 손짓을 하지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는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판자촌’은 깔끔히 정리가 된다. 누구를 위한 미관이란 말인가? 간혹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고 묻는데 대꾸 할 말이 없었다. ‘당신들이 살았던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어느 초여름, 그 빈집 앞에는 유채꽃과 황매화가 만발하고 있었다.
김지연 작가노트
사람이 모두 떠나버리고 없는 빈집, 빈방에 발을 들여 놓을 때마다 흡사 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서늘함을 느껴야 했다. 한 때는 가족의 희망이며 보금자리였을 공간이 이제는 모든 희망을 걷어가 버리고 절망과 회한만을 남기고 간 자리로 남아있다. 빈방의 창문은 희미했으며 그곳에 걸린 커튼은 사람이 살았었다는 나지막한 고백 같았다.
빈집, 빈방을 찍는다는 일은 맥이 빠지는 일이다. 살았던 사람들의 기가 쇄진해 버린 데다 그나마 있던 기력마저 데리고 가버린 공간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공기조차 무거워 무덤 같기도 했다. 철거 대상의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 미로 같았고 천정은 낮았다. 어떤 공간에 들어서니 창문도 없는 방에 부서진 침대 하나가 남아 있는데 여분의 공간은 한 치도 없었다. 그 방에서 침대를 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들여올 수 없는 구조였다. 눅진한 공기 속에서 삐져나온 매트의 속살들은 섬뜩함 바로 그것이었다.
빈방에 서다#3, 4 Empty Room, C Print, 60cm× 40cm, 2015
어느 날 산꼭대기 빈집에 들어섰다. 들어서는 현관에 빈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대개의 빈집들은 문이 꼭꼭 잠겨져있다. 그 중 문이 열린 집은 폐허의 빛깔이 선연했다. 나는 애써 아무 감정도 없이 신발을 신은 체 방문을 열어 제치고 들어섰다(때로는 열 문도 없다). 방안으로 쪽문이 나있고 안은 창문도 없이 어두컴컴했다. 그 곳에 밧줄 한 자락이 드리워져있고 그 아래 창백한 중년의 여인이 벽에 기대어 앉아있었다. 흘러 내려진 밧줄 아래로 드러난 모습이 인형 같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나는 얼른 돌아섰다. 그 순간 어떻게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후 수습은 절차를 밟아 처리 되었다. 오랫동안 아른거리는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내 사진은 빛이 밝다. 꽃무늬 벽지와 오렌지색 커튼과 바다를 닮은 파란 벽들은 순진하게 밝다. 더 이상 무거워 질 수 없는 오기 같은 것이 있었다.
어제 사진 찍고 간 빈집이 오늘 헐리는 것을 보는 일은 충격이었다. 건물을 제거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과 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거의 손에 쥔 거 없이 쫓겨나다 시피 하는 철거민들에게 ‘보금자리’라는 임대 아파트를 짓고 회유의 손짓을 하지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는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판자촌’은 깔끔히 정리가 된다. 누구를 위한 미관이란 말인가? 간혹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고 묻는데 대꾸 할 말이 없었다. ‘당신들이 살았던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어느 초여름, 그 빈집 앞에는 유채꽃과 황매화가 만발하고 있었다.
김지연 작가노트
빈 집에 서다
내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밥 그릇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마치 어제 던진 것처럼 생생하기 까지 했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를 상상하며 질끈 눈을 감는다. 집은 텅 비었지만 예전처럼 말끔한 구석은 없었다. 돌아서면 어지럽힌다는 아내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가도 어지럽힐 것도 없는 집안이 말끔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니 오랫동안 환기를 안 한 탓인지 눅눅하고 퀴퀴한 시멘트 냄새가 전해졌다. 훔쳐갈 것도 지킬 것도 없는 집은 창문이며 방문들을 살뜰하게 지키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이쑤시개를 주워 열쇠 구멍에 넣고 이리저리 들쑤시자 방문은 쉽게 열렸다. 방안 모서리 틈에서, 없어졌다며 유치원 가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울던 딸아이의 작은 머리방울을 발견했다. 거미줄을 훌훌 털고 그것을 주워들자 먹잇감이 없어 말라죽은 거미 사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아이와 아내가 봤다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와 딸은 지금 없다.
쪼그려 앉아 언제 죽었는지 모를 거미를 유심히 바라봤다. “아빠, 거미는 곤충이 아냐. 봐봐 다리가 몇 개지? 여섯 개가 아니지? 그래서 곤충이 아니래.” 딸아이는 유난히 책을 좋아했지만 아직은 읽지를 못했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녀석은 무언가 알려주려 하면 입을 비죽거리고 돌아 앉아 눈물을 보이곤 했다. 그래서 또래 나이 치고 상식이 풍부한 반면, 숫자세기도 글자도 잘 알지 못했다. 책을 내게 내밀며 다리 개수를 세려다 나의 손가락을 잡고 거미다리 그림에 갖다 댄 것이다. 나는 둥글게 말려 오그라붙은 거미 다리를 조심스럽게 세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어버렸다.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내 뺨을 후려갈기기 전까지 나는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앎의 기쁨에 빠져 있었다. 녀석은 그런 기쁨에 여러 번 웃었으리라. 아내의 무릎에 앉아 반짝이던 눈망울로 책 한번 엄마 한 번 눈을 맞추던 딸의 모습이 선하다. 나는 아내와 아이가 자주 앉아 책을 보던 자리를 찾으려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무렵 우리는 무리를 해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언덕 위 이 집을 마련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둘 만의 힘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집은 내부 벽들이 나무로 둘려 쌓여 있어 살짝만 기대도 특유의 삐그덕 소리를 냈다. 아내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도 방범이 확실해야 한다며 샷시를 새로 달고 방범창을 내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동네에서 유난히 창틀이 흰, 사방이 쇠창살 창으로 뒤덮인 집이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거실 창 아래 소파 하나를 두었다. 아이의 두 다리가 튼튼해 질 무렵 아이는 소파에 누워 두 발을 나무 벽에 올린 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은 “아빠, 도둑은 이리로 들어오는 거야? 쇠막대기 때문에 못 들어오지?”하며 물은 적이 있었다. 언덕 위 이 동네가 재개발로 묶이며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갔고 우리 집 근처에도 빈집들이 하나 둘 늘어갔다. 빈집들이 늘어갈수록 퇴근 후 올라가는 골목길은 더욱 어두워졌고, 점점 더 집 주변이 컴컴해 졌다. 가로등의 불빛도 사람 수에 비례하는 걸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 당시 자주 했던 것 같다. 또한 가로등이 골목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길을 비춘다는 생각도.
아내는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다. 그것을 안 것은 아이가 네 살 무렵이었다. 하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딸아이가 두루마리 휴지 한 칸을 뜯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칸을 뜯어 건네주고 TV를 보는데, 아이는 이리저리 휴지를 접고 다시 펴고 둘둘 말더니 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입에 물었다. 그 뒤로부터 곳곳에서 담배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담뱃재들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냄새가 전혀 베이지 않은 것이 놀랍기까지 했다. 아내의 무엇이 담배를 찾게 했을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사람이 만드는 빛들이 사라질 무렵, 그곳에는 사람이 만드는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와 아내가 자주 앉아 책을 보던 소파로 왔다. 차마 이 소파를 어쩌지 못했다. 소파에 누워 마치 쥐들을 쫓아내듯 나무벽을 뒤꿈치로 쿵쿵 내리찧던 딸아이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이렇게 하면 모두 놀라서 도망간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다. 언덕 위 유난히 창틀이 하얀 집, 유일하게 방범창을 단 우리 집에서 아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담배를 피우는 횟수가 늘어갔고, 아이의 뒤꿈치는 더욱 바빠졌다. 그리고 이제는 담배를 피울 아내도 뒤꿈치를 찧던 아이도 모두 사라졌다. 이 집 또한 사라질 것이다.
소파에 앉아서 아내가 자주 듣던 오티스 레딩의 <부둣가에 앉아서>를 상상했다.
피서라
https://youtu.be/wyPKRcBTsFQ
-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안은 늘 깨끗이 치워져 있었으나 조금만 주의해서 살피면 방바닥이나 마루에는 담뱃재 흘린 자국이 있고 화장실에서도 연탄광에서도 부엌 바닥에서도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재떨이에도 열십자로 혹은 수레바퀴처럼 뱅뱅 돌려가며 필터에 세게 손톱자국이 박힌 꽁초가 있었다.
- 나는 화가 나기보다 우울하고 불쾌했다. 아내의 옷자락이나 방석, 테이블보 위에 조심성 없이 뚫린 담배 불구멍을 나는 예사롭게 보아 넘기기가 어려웠다.
- _오정희 「바람의 넋」
내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밥 그릇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마치 어제 던진 것처럼 생생하기 까지 했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를 상상하며 질끈 눈을 감는다. 집은 텅 비었지만 예전처럼 말끔한 구석은 없었다. 돌아서면 어지럽힌다는 아내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가도 어지럽힐 것도 없는 집안이 말끔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니 오랫동안 환기를 안 한 탓인지 눅눅하고 퀴퀴한 시멘트 냄새가 전해졌다. 훔쳐갈 것도 지킬 것도 없는 집은 창문이며 방문들을 살뜰하게 지키고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이쑤시개를 주워 열쇠 구멍에 넣고 이리저리 들쑤시자 방문은 쉽게 열렸다. 방안 모서리 틈에서, 없어졌다며 유치원 가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울던 딸아이의 작은 머리방울을 발견했다. 거미줄을 훌훌 털고 그것을 주워들자 먹잇감이 없어 말라죽은 거미 사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아이와 아내가 봤다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와 딸은 지금 없다.
쪼그려 앉아 언제 죽었는지 모를 거미를 유심히 바라봤다. “아빠, 거미는 곤충이 아냐. 봐봐 다리가 몇 개지? 여섯 개가 아니지? 그래서 곤충이 아니래.” 딸아이는 유난히 책을 좋아했지만 아직은 읽지를 못했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녀석은 무언가 알려주려 하면 입을 비죽거리고 돌아 앉아 눈물을 보이곤 했다. 그래서 또래 나이 치고 상식이 풍부한 반면, 숫자세기도 글자도 잘 알지 못했다. 책을 내게 내밀며 다리 개수를 세려다 나의 손가락을 잡고 거미다리 그림에 갖다 댄 것이다. 나는 둥글게 말려 오그라붙은 거미 다리를 조심스럽게 세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어버렸다.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내 뺨을 후려갈기기 전까지 나는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앎의 기쁨에 빠져 있었다. 녀석은 그런 기쁨에 여러 번 웃었으리라. 아내의 무릎에 앉아 반짝이던 눈망울로 책 한번 엄마 한 번 눈을 맞추던 딸의 모습이 선하다. 나는 아내와 아이가 자주 앉아 책을 보던 자리를 찾으려 거실로 나갔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무렵 우리는 무리를 해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언덕 위 이 집을 마련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둘 만의 힘으로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집은 내부 벽들이 나무로 둘려 쌓여 있어 살짝만 기대도 특유의 삐그덕 소리를 냈다. 아내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도 방범이 확실해야 한다며 샷시를 새로 달고 방범창을 내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동네에서 유난히 창틀이 흰, 사방이 쇠창살 창으로 뒤덮인 집이 되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거실 창 아래 소파 하나를 두었다. 아이의 두 다리가 튼튼해 질 무렵 아이는 소파에 누워 두 발을 나무 벽에 올린 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은 “아빠, 도둑은 이리로 들어오는 거야? 쇠막대기 때문에 못 들어오지?”하며 물은 적이 있었다. 언덕 위 이 동네가 재개발로 묶이며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갔고 우리 집 근처에도 빈집들이 하나 둘 늘어갔다. 빈집들이 늘어갈수록 퇴근 후 올라가는 골목길은 더욱 어두워졌고, 점점 더 집 주변이 컴컴해 졌다. 가로등의 불빛도 사람 수에 비례하는 걸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 당시 자주 했던 것 같다. 또한 가로등이 골목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길을 비춘다는 생각도.
아내는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다. 그것을 안 것은 아이가 네 살 무렵이었다. 하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딸아이가 두루마리 휴지 한 칸을 뜯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 칸을 뜯어 건네주고 TV를 보는데, 아이는 이리저리 휴지를 접고 다시 펴고 둘둘 말더니 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입에 물었다. 그 뒤로부터 곳곳에서 담배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담뱃재들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냄새가 전혀 베이지 않은 것이 놀랍기까지 했다. 아내의 무엇이 담배를 찾게 했을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사람이 만드는 빛들이 사라질 무렵, 그곳에는 사람이 만드는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와 아내가 자주 앉아 책을 보던 소파로 왔다. 차마 이 소파를 어쩌지 못했다. 소파에 누워 마치 쥐들을 쫓아내듯 나무벽을 뒤꿈치로 쿵쿵 내리찧던 딸아이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이렇게 하면 모두 놀라서 도망간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다. 언덕 위 유난히 창틀이 하얀 집, 유일하게 방범창을 단 우리 집에서 아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담배를 피우는 횟수가 늘어갔고, 아이의 뒤꿈치는 더욱 바빠졌다. 그리고 이제는 담배를 피울 아내도 뒤꿈치를 찧던 아이도 모두 사라졌다. 이 집 또한 사라질 것이다.
소파에 앉아서 아내가 자주 듣던 오티스 레딩의 <부둣가에 앉아서>를 상상했다.
피서라
https://youtu.be/wyPKRcBTsFQ
이지윤展 / LEE, JEAYOON / 李知胤 / 크라임 신 Crime Scene / 2016. 5. 23 – 6. 17
크라임 씬:
당신에게 우리로부터_Crime Scene
1. Introduction
성북동의 북정마을을 찾은 이방인은 이곳의 진짜authenticity를 볼 수 있을까? 이 의문은 궁핍하고 빈 곳, 폐허를 사람들의 삶 및 생활과 분리시켜 미화하고 스펙터클화 하는 태도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구경꾼의 눈과 카메라가 취해가는 “영감”은 마을에 어떤 활력을 주는가? 이는 과연 마을 곳곳의 벽보들이 겨냥하는 개발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가? 또한 이는 오늘날 개인의 생활을 낱낱이 전시하는 소셜미디어와 힙스터 문화에 대한 자의식과도 연결된다. 스스로도 이러한 혐의를 벗기 어려운 위치에서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지고자 일종의 가상의 범죄현장을 구성한다. 북정마을의 입자들grains과 구경꾼의 자취가 증거자료로 제시된다.
2. Method
일종의 가짜 수사관이자 이방인의 위치에서 관찰 및 수집을 통해 증거 모으기가 이루어졌다. 수집에 있어서는 바닥에서 줍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한편으로 구경꾼의 소지품들을 허구적으로 구성하였다. 성북예술동 기간 동안은 북정마을의 몇몇 길목에 작은 증거 표식들도 작업의 연장으로 세워둔다. 이 설치가 마을 구석구석을 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혹은 또다른 스펙터클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마을을 경험하는 방식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길 바란다.
3. Results
수집한 입자들은 쓰레기부터 흙, 톱밥 등이 포함되며 북정마을 특정적인 것과 어느 마을에나 있을 법한 것들이 공존한다. 채집하기와 거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설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택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인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4. Discussion / Conclusion
수집한 북정마을의 디테일과 입자들을 모아봤을 때 우리는 몇 문장으로 규정되는 이 마을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짧은 기간 채집한 과정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현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범죄 현장에서는 증거를 모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목하기를 목표로 하지만 이 작업에서는 범죄의 주된 요소가 비워져 있다. 이로써 이 작업은 끝내 미완성인 수사일 터이다.
이지윤 작가노트
당신에게 우리로부터_Crime Scene
1. Introduction
성북동의 북정마을을 찾은 이방인은 이곳의 진짜authenticity를 볼 수 있을까? 이 의문은 궁핍하고 빈 곳, 폐허를 사람들의 삶 및 생활과 분리시켜 미화하고 스펙터클화 하는 태도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구경꾼의 눈과 카메라가 취해가는 “영감”은 마을에 어떤 활력을 주는가? 이는 과연 마을 곳곳의 벽보들이 겨냥하는 개발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가? 또한 이는 오늘날 개인의 생활을 낱낱이 전시하는 소셜미디어와 힙스터 문화에 대한 자의식과도 연결된다. 스스로도 이러한 혐의를 벗기 어려운 위치에서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지고자 일종의 가상의 범죄현장을 구성한다. 북정마을의 입자들grains과 구경꾼의 자취가 증거자료로 제시된다.
2. Method
일종의 가짜 수사관이자 이방인의 위치에서 관찰 및 수집을 통해 증거 모으기가 이루어졌다. 수집에 있어서는 바닥에서 줍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한편으로 구경꾼의 소지품들을 허구적으로 구성하였다. 성북예술동 기간 동안은 북정마을의 몇몇 길목에 작은 증거 표식들도 작업의 연장으로 세워둔다. 이 설치가 마을 구석구석을 있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혹은 또다른 스펙터클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마을을 경험하는 방식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길 바란다.
3. Results
수집한 입자들은 쓰레기부터 흙, 톱밥 등이 포함되며 북정마을 특정적인 것과 어느 마을에나 있을 법한 것들이 공존한다. 채집하기와 거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설이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택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인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4. Discussion / Conclusion
수집한 북정마을의 디테일과 입자들을 모아봤을 때 우리는 몇 문장으로 규정되는 이 마을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짧은 기간 채집한 과정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현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범죄 현장에서는 증거를 모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목하기를 목표로 하지만 이 작업에서는 범죄의 주된 요소가 비워져 있다. 이로써 이 작업은 끝내 미완성인 수사일 터이다.
이지윤 작가노트
사라진 벽화
……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것이 슈만의 달밤 이라는 것을 말이다.
달이 채 사라지지 않은 어느 새벽녘 주차장에서 나는 그것을 처음 들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빼곡히 차 있는 자동차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드나들며, 운전석 차문 손잡이에 중고차 전단지를 끼워 넣고 있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숨을 참으며 차 사이를 지날 때, 느릿느릿 한 음씩 떨어지는 피아노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었다. 드넓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에 나는 처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스피커를 찾아 자리를 옮기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아득히 보이는 자동차 행렬의 끝을 눈으로 쫓았다.
일을 끝낼 즈음이면,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고 빼곡히 차 있던 차들도 중간 중간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나는 어쩐지 그 비워진 공간들이 불안하고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전단지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다.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비상계단으로 나온다.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 그 시간이 나의 퇴근시간이고 마지막 일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다. 전날 오후부터 내달리던 생산 없는 일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햇살을 받으며 끝나는 것이다.
며칠을 잊고 있었다. 주차장에서의 그 음악. 하루는 몸살이 나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집에서 누워 있는데, 언제부터 틀어 놓았는지 모를 라디오에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슨 음악인지 알기 위해 라디오에 주의를 기울였다. 슈만의 달밤. 디제이의 무신경한 목소리가 전하는 제목에 나는 자동차로 빼곡히 차 있는 주차장을 떠올렸고, 그런 일련의 사고들이 서글프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꿈을 꾸었다. 전단지를 완벽하게 다 꽂아 놓은 주차장에서 내가 차 사이를 드나들 적마다 자동으로 LED 전등이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이상한 꿈. 배경음악은 슈만의 달밤. 나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주 사뿐하고 우아하게 음조의 높낮이에 따라 보폭을 달리 하며 좁은 공간을 누볐다.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고요한 그곳에서 오로지 그 음악만이 나의 안무를 고취시켰다. 음악은 짧았지만 꿈속에서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연이어 재생됐다. 또한 가파른 경사를 올라야 겨우 몇 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비좁은 나의 집과는 다르게 평평하고 드넓은 이곳이 천상의 세계라고 꿈속의 나는 생각했다. 꿈에서 조차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침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꿈을 조작했다.
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밤인지 새벽녘인지 모를 어스름이 창밖으로 깔려 있었다. 긴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계를 봤을 때, 30분도 채 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아침이 오려면 먼 시간이라는 것도. 부엌으로 나가 어제 공사장에서 챙긴 페인트와 붓을 들고 집을 나섰다. 옆집 할머니의 부탁으로 용케도 잊지 않고 가져온 것이 내심 기특했다. 어스름을 만드는 공기와 습기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무심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대로 멈췄다. 옆집 할머니 담벼락엔 조잡한 천사의 날개가 알맹이도 없이 그려져 있었다. 목적도 쓸모도 없는 날개. 나는 날개 위로 침을 뱉었다. 퉤.
언젠가 보았던 동화책이 생각났다. 밤새 온 도시에 그림을 그렸다는 아이. 세상은 좀 고요하면 안 될까. 경적도 경보음도 소거된 ‘달밤’ 같은. 음조의 기복도 없이, 시작과 끝의 구분이 모호해서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 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사는 세계는 너무 알록달록하고 시끄럽고 조화롭지 못하다. 주차장에 가지런히 예쁘게 자동차들이 주차된 조용한 그 세계와는 다르게. 힘겹게 오르고 내리는 긴 계단 앞에서 나는 붓을 들어 페인트 통에 담갔다.
계단을 내려왔을 때, 어스름 너머로 단조롭고 평온한 세계가 올려다 보였다.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어떻게 들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하지만…….
피서라
* 이화동 벽화 훼손사건 재구성/ 관련 기사
- 이 이야기가 테러리스트 소설이라는 소문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정보학 교수가 이 소문을 계속 퍼뜨렸는데 그도 직접 정보를 구하는 것이 꺼림칙했던 모양이다. 여기서 ‘정보학자는 어떻게 정보를 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풍문’으로, 즉 제2, 제3의 입을 거쳐, 아니, 심지어 여섯 사람의 입을 거쳐 전해진 소문으로 정보를 구하는가? 물론 난 이 이야기를 읽으라는 지나친 기대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다.
- -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中 ‘10년 후 하인리히 뵐의 후기’ -
……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것이 슈만의 달밤 이라는 것을 말이다.
달이 채 사라지지 않은 어느 새벽녘 주차장에서 나는 그것을 처음 들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빼곡히 차 있는 자동차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드나들며, 운전석 차문 손잡이에 중고차 전단지를 끼워 넣고 있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숨을 참으며 차 사이를 지날 때, 느릿느릿 한 음씩 떨어지는 피아노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었다. 드넓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에 나는 처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스피커를 찾아 자리를 옮기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아득히 보이는 자동차 행렬의 끝을 눈으로 쫓았다.
일을 끝낼 즈음이면,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고 빼곡히 차 있던 차들도 중간 중간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나는 어쩐지 그 비워진 공간들이 불안하고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전단지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다.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비상계단으로 나온다.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 그 시간이 나의 퇴근시간이고 마지막 일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다. 전날 오후부터 내달리던 생산 없는 일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햇살을 받으며 끝나는 것이다.
며칠을 잊고 있었다. 주차장에서의 그 음악. 하루는 몸살이 나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집에서 누워 있는데, 언제부터 틀어 놓았는지 모를 라디오에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슨 음악인지 알기 위해 라디오에 주의를 기울였다. 슈만의 달밤. 디제이의 무신경한 목소리가 전하는 제목에 나는 자동차로 빼곡히 차 있는 주차장을 떠올렸고, 그런 일련의 사고들이 서글프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 꿈을 꾸었다. 전단지를 완벽하게 다 꽂아 놓은 주차장에서 내가 차 사이를 드나들 적마다 자동으로 LED 전등이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이상한 꿈. 배경음악은 슈만의 달밤. 나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주 사뿐하고 우아하게 음조의 높낮이에 따라 보폭을 달리 하며 좁은 공간을 누볐다.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고요한 그곳에서 오로지 그 음악만이 나의 안무를 고취시켰다. 음악은 짧았지만 꿈속에서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연이어 재생됐다. 또한 가파른 경사를 올라야 겨우 몇 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비좁은 나의 집과는 다르게 평평하고 드넓은 이곳이 천상의 세계라고 꿈속의 나는 생각했다. 꿈에서 조차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침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꿈을 조작했다.
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밤인지 새벽녘인지 모를 어스름이 창밖으로 깔려 있었다. 긴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계를 봤을 때, 30분도 채 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아침이 오려면 먼 시간이라는 것도. 부엌으로 나가 어제 공사장에서 챙긴 페인트와 붓을 들고 집을 나섰다. 옆집 할머니의 부탁으로 용케도 잊지 않고 가져온 것이 내심 기특했다. 어스름을 만드는 공기와 습기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무심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대로 멈췄다. 옆집 할머니 담벼락엔 조잡한 천사의 날개가 알맹이도 없이 그려져 있었다. 목적도 쓸모도 없는 날개. 나는 날개 위로 침을 뱉었다. 퉤.
언젠가 보았던 동화책이 생각났다. 밤새 온 도시에 그림을 그렸다는 아이. 세상은 좀 고요하면 안 될까. 경적도 경보음도 소거된 ‘달밤’ 같은. 음조의 기복도 없이, 시작과 끝의 구분이 모호해서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 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사는 세계는 너무 알록달록하고 시끄럽고 조화롭지 못하다. 주차장에 가지런히 예쁘게 자동차들이 주차된 조용한 그 세계와는 다르게. 힘겹게 오르고 내리는 긴 계단 앞에서 나는 붓을 들어 페인트 통에 담갔다.
계단을 내려왔을 때, 어스름 너머로 단조롭고 평온한 세계가 올려다 보였다.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다. 어떻게 들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하지만…….
피서라
* 이화동 벽화 훼손사건 재구성/ 관련 기사
성북예술동 2016 Sung Buk Art Festival 2016 / 24시 북적북적 24hours bUKJUKBUKJUK / 2016. 5. 13 - 05. 25
2016 성북 예술동 - 24hours / 북적북적
1. <24hours> 권희수, 정승완
기획의도
<24hours>는 성북도원이 본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라는 점에 착안하여 24시간동안 공간을 점거하여 단발성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그동안 성북도원은 카페에서 폐허로, 또다시 예술을 소개하는 장소로 변모해왔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거주불가능성과 불온한 장소성에 착안하여 24시간동안 공간을 열린 상태로 불을 밝힌다.
점거’는 규정을 거부하는 예외상태이자 구별이 작동하지 않는 공백의 공간이다.
24시간의 진공상태에서 성북도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작가노트
24시간동안 성북도원은 불을 밝힌다.
24시간동안 성북도원은 점거된다.
거주불가능한 장소는
무언가를 발설한다.
무언가를 말하기를 거부한다.
2. <북적북적> 이진, 송윤수
기획의도
이진, 송윤수 작가는 북정마을의 빈 집이자 표면적으로 해체된 공간을 ‘남겨진 흔적’들로 여기고, 새로운 미적 가치로 재생산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작가의 직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보이지 않는 환각적 공간을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자세는 북정마을이라는 공간적 정체성과 갈등에 대한 감상에서 시작한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이루는 이 공간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해체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채우는 것은 어떠한 사유를 지녔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틈, 사이>은 곧 북정마을에서의 보이지 않지만, 남겨진 존재들에 대한 공간적 소통을 다시 재생하고자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작업설명
북적북적: 이진, 송윤수 (2채널 영상)
본 영상은 북정마을의 지붕 없는 폐허의 내부와 외부의 움직임을 보다 시각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채널 1: 공간을 이루고 있는 내부의 쓰레기 더미들은 환각적인, 무질서함 속에서의 파편화된 이미지들로 재창조 된다. 채널 2: 건물 외부의 공간, 즉 현재의 북정마을은 고요한 빛과 움직임의 반복이다. 허물어진 벽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그 틈새 공간을 시각적으로 함께 채우는 작업은 폐기된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미적 양식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바이다.
- 일시 : 5. 13(금) - 25(수)
- 장소 : 성북도원(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31길 126-9)
- 진행 : 퍼포먼스 및 영상전시
1. <24hours> 권희수, 정승완
- 일시:5. 13(금), 20시 - 14(토), 20시
- #1 '혀': 5. 13(금), 20시 - 20시 40분
- #2 'DONOTTOUCH': 5. 14(토), 11-18시
- 「24hours」 다채널영상 상영: 5. 16(월) - 5. 25(수)
기획의도
<24hours>는 성북도원이 본래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라는 점에 착안하여 24시간동안 공간을 점거하여 단발성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그동안 성북도원은 카페에서 폐허로, 또다시 예술을 소개하는 장소로 변모해왔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거주불가능성과 불온한 장소성에 착안하여 24시간동안 공간을 열린 상태로 불을 밝힌다.
점거’는 규정을 거부하는 예외상태이자 구별이 작동하지 않는 공백의 공간이다.
24시간의 진공상태에서 성북도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작가노트
24시간동안 성북도원은 불을 밝힌다.
24시간동안 성북도원은 점거된다.
거주불가능한 장소는
무언가를 발설한다.
무언가를 말하기를 거부한다.
2. <북적북적> 이진, 송윤수
- 일시 : 5. 16(월) -25(수)
- 장소 : 성북도원(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31길 126-9)
- 진행 : 영상전시
기획의도
이진, 송윤수 작가는 북정마을의 빈 집이자 표면적으로 해체된 공간을 ‘남겨진 흔적’들로 여기고, 새로운 미적 가치로 재생산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작가의 직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보이지 않는 환각적 공간을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자세는 북정마을이라는 공간적 정체성과 갈등에 대한 감상에서 시작한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이루는 이 공간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해체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채우는 것은 어떠한 사유를 지녔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틈, 사이>은 곧 북정마을에서의 보이지 않지만, 남겨진 존재들에 대한 공간적 소통을 다시 재생하고자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작업설명
북적북적: 이진, 송윤수 (2채널 영상)
본 영상은 북정마을의 지붕 없는 폐허의 내부와 외부의 움직임을 보다 시각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채널 1: 공간을 이루고 있는 내부의 쓰레기 더미들은 환각적인, 무질서함 속에서의 파편화된 이미지들로 재창조 된다. 채널 2: 건물 외부의 공간, 즉 현재의 북정마을은 고요한 빛과 움직임의 반복이다. 허물어진 벽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그 틈새 공간을 시각적으로 함께 채우는 작업은 폐기된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미적 양식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바이다.
씬 SCENE, 시선으로 ‘시선’ 보기
스페이스 이끼는 북정마을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다. 3번 마을버스가 위태롭게 비탈길을 오르고 나면 북정카페를 기점으로 다시 내리막길을 내려온다. 차를 가지고 이끼에 가다보면 내려오는 차, 혹은 올라오는 차로 인해 간혹 애를 먹곤 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력이 나, 마주치는 차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지만 주차문제는 여전하다. 지정주차를 하고 있지만, 지정주차 자리에 차를 대는 것 자체가 간혹 오는 ‘손님’이 ‘이웃’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듯하다. 2016 성북예술동 ‘이웃트기’에서 이끼는 네 가지 전시를 기획했다. 백주은 개인전 <빛의 곰팡이>, 이지윤 개인전 <크라임 씬>, 김지윤 개인전 <빈 집>, 공동 퍼포먼스와 영상물인 <24hours>와 <북적북적>이 그것이다. ‘이웃’과 ‘트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는 집 혹은 그런 사람과 막혀 있던 것을 치우고 서로 스스럼없이 사귀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동안 이끼에서는 매달 개인전을 해 왔고, 새로운 개인전을 열 때마다 말 그대로 이웃집 할머님들이 첫 관람객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문제는 있다.
작가들이 전시를 설치하거나 철수하러 드나들고, 전시를 보러 외지인들이 올 적마다 우리 이웃들은 작품보다는 외지인들을 관람하는 하는 것이 더 흥미로워 보였다. 왜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을 하는지, 뭐 볼게 있어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는지, 부셔져 내다버린 의자 쪼가리가 뭐 대단하다고 셔터를 눌러 대는지 그들에게는 우리의 그런 행동 자체가 신기하면서도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선에 주목했다.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문화를 예쁘고 아기자기 하게 바꾸고 담아내기보다, 외지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여러 갤러리와 문화공간들이 성북동의 빈집들을 터는 것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눈으로 작품이 아닌 일종의 현장증거들을 수집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아닌 그들의 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또한 그들의 시선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일종의 작품으로, 범죄사건의 단서로 남게 될 수도 있다.
백주은과 이지윤, 김지연 개인전에서는 성북동 주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사소한 것들에 주목한다. 외부 관람객들이 지나쳤을 법한 것들, 혹은 주민들에게 낯선 물건들 가령 버려진 가구나 폐허를 찍는 카메라, 버려진, 아무도 살지 않은, 예술가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빈 집과 같은. 성북도원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24hours> 전시 <북적북적>은 금기의 이중성, 파괴와 생성의 경계에서 고정된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성북도원의 장소적 특징을 상기시킨다. 또한 해체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채우는 것은 어떠한 사유를 지녔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할 것이다.
가) 스페이스 이끼 윈도우 전시
1) 백주은 개인전 <빛의 곰팡이> 5/09(월) ~ 5/20(금)
2) 이지윤 개인전 <크라임 씬> 5/23(월) ~ 6/17(금)
3) 김지윤 개인전 <빈 집> 6/20(월) ~ 7/08(금)
나) 성북도원 퍼포먼스 및 전시
1) 권희수, 정승완 퍼포먼스 <24hours> 5/13(금) 오후 8:00 ~14(토) 오후 8:00
- 5/14(토): DONOTTOUCH 11:00-18:00
- 5/14(토): 혀 19:00-19:40
- 5/14(토): 24 hours 종료 21:00
2) 이진, 송윤수 영상물 설치 <북적북적> + <24hours> 퍼포먼스 기록물 5/16(월) ~ 5/25(수)
스페이스 이끼는 북정마을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다. 3번 마을버스가 위태롭게 비탈길을 오르고 나면 북정카페를 기점으로 다시 내리막길을 내려온다. 차를 가지고 이끼에 가다보면 내려오는 차, 혹은 올라오는 차로 인해 간혹 애를 먹곤 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력이 나, 마주치는 차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지만 주차문제는 여전하다. 지정주차를 하고 있지만, 지정주차 자리에 차를 대는 것 자체가 간혹 오는 ‘손님’이 ‘이웃’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듯하다. 2016 성북예술동 ‘이웃트기’에서 이끼는 네 가지 전시를 기획했다. 백주은 개인전 <빛의 곰팡이>, 이지윤 개인전 <크라임 씬>, 김지윤 개인전 <빈 집>, 공동 퍼포먼스와 영상물인 <24hours>와 <북적북적>이 그것이다. ‘이웃’과 ‘트기’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는 집 혹은 그런 사람과 막혀 있던 것을 치우고 서로 스스럼없이 사귀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동안 이끼에서는 매달 개인전을 해 왔고, 새로운 개인전을 열 때마다 말 그대로 이웃집 할머님들이 첫 관람객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문제는 있다.
작가들이 전시를 설치하거나 철수하러 드나들고, 전시를 보러 외지인들이 올 적마다 우리 이웃들은 작품보다는 외지인들을 관람하는 하는 것이 더 흥미로워 보였다. 왜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을 하는지, 뭐 볼게 있어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는지, 부셔져 내다버린 의자 쪼가리가 뭐 대단하다고 셔터를 눌러 대는지 그들에게는 우리의 그런 행동 자체가 신기하면서도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선에 주목했다.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문화를 예쁘고 아기자기 하게 바꾸고 담아내기보다, 외지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여러 갤러리와 문화공간들이 성북동의 빈집들을 터는 것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눈으로 작품이 아닌 일종의 현장증거들을 수집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아닌 그들의 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또한 그들의 시선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일종의 작품으로, 범죄사건의 단서로 남게 될 수도 있다.
백주은과 이지윤, 김지연 개인전에서는 성북동 주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사소한 것들에 주목한다. 외부 관람객들이 지나쳤을 법한 것들, 혹은 주민들에게 낯선 물건들 가령 버려진 가구나 폐허를 찍는 카메라, 버려진, 아무도 살지 않은, 예술가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빈 집과 같은. 성북도원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24hours> 전시 <북적북적>은 금기의 이중성, 파괴와 생성의 경계에서 고정된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성북도원의 장소적 특징을 상기시킨다. 또한 해체된 공간을 시각적으로 채우는 것은 어떠한 사유를 지녔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할 것이다.
가) 스페이스 이끼 윈도우 전시
1) 백주은 개인전 <빛의 곰팡이> 5/09(월) ~ 5/20(금)
2) 이지윤 개인전 <크라임 씬> 5/23(월) ~ 6/17(금)
3) 김지윤 개인전 <빈 집> 6/20(월) ~ 7/08(금)
나) 성북도원 퍼포먼스 및 전시
1) 권희수, 정승완 퍼포먼스 <24hours> 5/13(금) 오후 8:00 ~14(토) 오후 8:00
- 5/14(토): DONOTTOUCH 11:00-18:00
- 5/14(토): 혀 19:00-19:40
- 5/14(토): 24 hours 종료 21:00
2) 이진, 송윤수 영상물 설치 <북적북적> + <24hours> 퍼포먼스 기록물 5/16(월) ~ 5/25(수)
백주은展 / BAEK, JOOEUN / 白珠銀 / 빛의 곰팡이 The Light of Moss / 2016. 05. 08 - 5. 21
빛의 곰팡이
불면에 갇힌 이름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 남은 빛 밤에 홀로 남아 부재의 그림자가 된다 호명되지 못한 꿈 빛의 등 뒤로 선 당신이 불쑥 쪼개진 빛 덩어리가 들락거렸다 사어死語 유령도 되지못한 당신을 가리키는 적당한 그 이름 손바닥에 사어가 된 꿈을 쓰면 미래에 읽었던 최승자의 시 입을 벌려 “아무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찌기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너를모른다 나는너를모른다 너당신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어들의 무덤에 깔려 껍질뿐인 태아가 된다고 했지 무너지는 절벽 사이에 낭만적 연민 그 뿐이라고 생이 납작 엎드려 숨어들어 보드랍고 축축하고 역겨워 지어낸 기억에 남은, 지나간 당신의 그림자 빛을 가린 목덜미 거길 지배하는 잔털 손끝에만 전해지는 그 사소함 뱀 같은 살성을 가졌어 하나씩 떼버린 발가락을 주웠어 덜 자란 손가락 태초 무렵에 걸음처럼 그림자에 배를 대고 갈게 놓쳐버린 단어들을 찾아볼게 우리의 이름은 입술보다 먼저 있었지 얼굴이 모습을 지워갈 때 이륙하던 비행기와 착륙하던 별이 마주칠 때 파도 부스러기가 구름에 입을 맞출 때 당신이 눈을 감아 세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시간이 그대로일 때 운명을 알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한다는 살성殺星 어둠의 끝자락을 따라 바닥에 닿기 전에 숨자 땅의 마른 거품 발등을 덮쳐와 이피하는 몸의 조각들 미끄러진 살성이 빛을 흔들고 우리는 사어가 되지
인용시 - 최승자, ‘일찌기 나는’ 시집 <이 時代의 사랑>
백주은 작가노트
불면에 갇힌 이름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 남은 빛 밤에 홀로 남아 부재의 그림자가 된다 호명되지 못한 꿈 빛의 등 뒤로 선 당신이 불쑥 쪼개진 빛 덩어리가 들락거렸다 사어死語 유령도 되지못한 당신을 가리키는 적당한 그 이름 손바닥에 사어가 된 꿈을 쓰면 미래에 읽었던 최승자의 시 입을 벌려 “아무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찌기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너를모른다 나는너를모른다 너당신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어들의 무덤에 깔려 껍질뿐인 태아가 된다고 했지 무너지는 절벽 사이에 낭만적 연민 그 뿐이라고 생이 납작 엎드려 숨어들어 보드랍고 축축하고 역겨워 지어낸 기억에 남은, 지나간 당신의 그림자 빛을 가린 목덜미 거길 지배하는 잔털 손끝에만 전해지는 그 사소함 뱀 같은 살성을 가졌어 하나씩 떼버린 발가락을 주웠어 덜 자란 손가락 태초 무렵에 걸음처럼 그림자에 배를 대고 갈게 놓쳐버린 단어들을 찾아볼게 우리의 이름은 입술보다 먼저 있었지 얼굴이 모습을 지워갈 때 이륙하던 비행기와 착륙하던 별이 마주칠 때 파도 부스러기가 구름에 입을 맞출 때 당신이 눈을 감아 세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시간이 그대로일 때 운명을 알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한다는 살성殺星 어둠의 끝자락을 따라 바닥에 닿기 전에 숨자 땅의 마른 거품 발등을 덮쳐와 이피하는 몸의 조각들 미끄러진 살성이 빛을 흔들고 우리는 사어가 되지
인용시 - 최승자, ‘일찌기 나는’ 시집 <이 時代의 사랑>
백주은 작가노트
빛은 곰팡이를 소멸시킨다. 드러나는 글자들, And Then You Were Gone.
우리는 사어들의 무덤에 깔려 껍질뿐인 태아가 된다고 했지 무너지는 절벽 사이에 낭만적 연민 그 뿐이라고 생이 납작 엎드려 숨어들어 보드랍고 축축하고 역겨워 지어낸 기억에 남은, 지나간 당신의 그림자 빛을 가린 목덜미 거길 지배하는 잔털 손끝에만 전해지는 그 사소함 뱀 같은 살성을 가졌어 하나씩 떼버린 발가락을 주웠어 덜 자란 손가락 태초 무렵에 걸음처럼 그림자에 배를 대고 갈게 놓쳐버린 단어들을 찾아볼게 우리의 이름은 입술보다 먼저 있었지 And then you were gone
_백주은 작가노트 중
손을 뻗어 태양을 가려 보았다. 가려질 턱이 없지. 손가락 사이사이로 태양빛은 보란 듯 스며들었다. 순간 손가락이 불타오르는 듯 보였다. 모두가 투명해 지는 순간이다. 강렬한 빛은 일순간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든다.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야 간신히 그것들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아이는 티비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투정이다. 빛은 어김없이 아이의 집까지 들어와 있었다. 언젠가 아이는 태양을 향해 주먹을 날린 적인 있다. 그러자 주먹은 어느새 사라지고 금빛 잔털들이 무질서하게 그 자리를 대체했다. 실은 그것이 금빛인지 혹은 어떤 색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색 없는 색, 빛으로 발현되는 색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어느새, 태양은 무엇이건 소멸시킨다 라는 명제가 아이의 머릿속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태양에 주목한 것은 딱히 주목할 것이 없어서였다. 아니다. 아이에게 허락되는 시간에 태양은 얄궂게 티비 화면을 소멸시켰다. 그때부터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강렬한 빛은 아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없애버렸다. 낡은 브라운관은 물론이고 주먹, 가냘픈 아기의 머리칼, 반짝이는 나뭇잎, 높은 교회의 첨탑, 저 멀리 나를 향해 달려오는 엄마, 꼭 잡은 연인들의 손, 뱅글뱅글 돌아가는 자전거 바퀴, 무심코 차게 되는 신발주머니, 희영이 머리위에서 반짝이는 구슬 머리끈, 엄마 대신 내게 내민 할머니의 주름 진 손, 아빠 몰래 펴 본 사진첩, 도서관 창문에 기대서 보는 흥미 없는 하얀 책.
언젠가 아이는 엄마의 말을 기억해 냈다. 빛은 곰팡이를 소멸시킨다. 그리고 한 가지 문장을 더 기억해 냈다. 빛이 소멸시킨 바로 그 장소에서 읽었던 그 한 문장.
엄마는 물고기다.1)
엄마는 물 없는 바닥에서 빛에 의해 소멸되고 있었다. 파닥이는 몸부림이 잦아들자 점차 엄마는 말라갔고 간혹 달갑지 않는 곤충 친구들이 엄마의 비늘위로 내려앉았다. 그날도 뱅그르르 돌아가는 신발주머니와 빛이 만드는 숨바꼭질을 의미 없이 바라보고 있었지. 시점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한 것은 엄마가 물고기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된 아이는 생각했다. 곰팡이가 핀 화장실 타일을 보면서 창문을 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물고기는 말했다. 빛은 곰팡이를 소멸시킨다. 아니다. 뻐끔.
브라운관은 해상도 좋은 모니터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빛은 여전하다. 화면을 누웠다 세웠다 반복한다. 어느새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피터 한트케, 이명, 없어진 글자 you, 사라진 철자들, 문장이었던 그 말 And then you were gone, Short Letter Long Farewell, 누군가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이야기, 애써 지운 마침표의 흔적, 제멋대로 붙여진 쉼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들, 이렇게 써도 될까 하는 고민 없는 고민, 나의 신분을 묻는 누군가의 물음,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인가, 물고기의 마지막 비명, 뻐끔.
빛은 곰팡이를 소멸시킨다. 드러나는 글자들.
And then you were gone.
1)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_윌리엄 포크너
피서라
백주은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녀의 단편영화들을 보면 영화라기보다 일종의 시 같은, 명상을 위한 사색을 위한 기억들의 단편 같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의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 혹은 화장기법, 신발, 액세서리 등으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소설이나 영화로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이 캐릭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옷차림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물건에서도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시 같은 사람들이다. 한두 번으로 그 내면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좀머씨’ 같은 사람들 중에 백주은을 넣고 싶다.
- 2010 대만여성영화제
- 2010 8월 단편 상상마당 외 다수
우리는 사어들의 무덤에 깔려 껍질뿐인 태아가 된다고 했지 무너지는 절벽 사이에 낭만적 연민 그 뿐이라고 생이 납작 엎드려 숨어들어 보드랍고 축축하고 역겨워 지어낸 기억에 남은, 지나간 당신의 그림자 빛을 가린 목덜미 거길 지배하는 잔털 손끝에만 전해지는 그 사소함 뱀 같은 살성을 가졌어 하나씩 떼버린 발가락을 주웠어 덜 자란 손가락 태초 무렵에 걸음처럼 그림자에 배를 대고 갈게 놓쳐버린 단어들을 찾아볼게 우리의 이름은 입술보다 먼저 있었지 And then you were gone
_백주은 작가노트 중
손을 뻗어 태양을 가려 보았다. 가려질 턱이 없지. 손가락 사이사이로 태양빛은 보란 듯 스며들었다. 순간 손가락이 불타오르는 듯 보였다. 모두가 투명해 지는 순간이다. 강렬한 빛은 일순간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든다.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야 간신히 그것들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다. 아이는 티비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투정이다. 빛은 어김없이 아이의 집까지 들어와 있었다. 언젠가 아이는 태양을 향해 주먹을 날린 적인 있다. 그러자 주먹은 어느새 사라지고 금빛 잔털들이 무질서하게 그 자리를 대체했다. 실은 그것이 금빛인지 혹은 어떤 색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색 없는 색, 빛으로 발현되는 색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어느새, 태양은 무엇이건 소멸시킨다 라는 명제가 아이의 머릿속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태양에 주목한 것은 딱히 주목할 것이 없어서였다. 아니다. 아이에게 허락되는 시간에 태양은 얄궂게 티비 화면을 소멸시켰다. 그때부터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강렬한 빛은 아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없애버렸다. 낡은 브라운관은 물론이고 주먹, 가냘픈 아기의 머리칼, 반짝이는 나뭇잎, 높은 교회의 첨탑, 저 멀리 나를 향해 달려오는 엄마, 꼭 잡은 연인들의 손, 뱅글뱅글 돌아가는 자전거 바퀴, 무심코 차게 되는 신발주머니, 희영이 머리위에서 반짝이는 구슬 머리끈, 엄마 대신 내게 내민 할머니의 주름 진 손, 아빠 몰래 펴 본 사진첩, 도서관 창문에 기대서 보는 흥미 없는 하얀 책.
언젠가 아이는 엄마의 말을 기억해 냈다. 빛은 곰팡이를 소멸시킨다. 그리고 한 가지 문장을 더 기억해 냈다. 빛이 소멸시킨 바로 그 장소에서 읽었던 그 한 문장.
엄마는 물고기다.1)
엄마는 물 없는 바닥에서 빛에 의해 소멸되고 있었다. 파닥이는 몸부림이 잦아들자 점차 엄마는 말라갔고 간혹 달갑지 않는 곤충 친구들이 엄마의 비늘위로 내려앉았다. 그날도 뱅그르르 돌아가는 신발주머니와 빛이 만드는 숨바꼭질을 의미 없이 바라보고 있었지. 시점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한 것은 엄마가 물고기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된 아이는 생각했다. 곰팡이가 핀 화장실 타일을 보면서 창문을 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물고기는 말했다. 빛은 곰팡이를 소멸시킨다. 아니다. 뻐끔.
브라운관은 해상도 좋은 모니터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빛은 여전하다. 화면을 누웠다 세웠다 반복한다. 어느새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피터 한트케, 이명, 없어진 글자 you, 사라진 철자들, 문장이었던 그 말 And then you were gone, Short Letter Long Farewell, 누군가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이야기, 애써 지운 마침표의 흔적, 제멋대로 붙여진 쉼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들, 이렇게 써도 될까 하는 고민 없는 고민, 나의 신분을 묻는 누군가의 물음,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인가, 물고기의 마지막 비명, 뻐끔.
빛은 곰팡이를 소멸시킨다. 드러나는 글자들.
And then you were gone.
1)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_윌리엄 포크너
피서라
백주은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녀의 단편영화들을 보면 영화라기보다 일종의 시 같은, 명상을 위한 사색을 위한 기억들의 단편 같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의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 혹은 화장기법, 신발, 액세서리 등으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소설이나 영화로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이 캐릭터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옷차림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물건에서도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시 같은 사람들이다. 한두 번으로 그 내면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좀머씨’ 같은 사람들 중에 백주은을 넣고 싶다.
- 백주은의 영상들
- 포옹 (스톱모션애니메이션) 한국/2009/1분/BW
- 2010 대만여성영화제
- 2010 8월 단편 상상마당 외 다수
- 당신의 첫(다큐멘터리) 한국/2014/4분53초/color
-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다큐멘터리, 실험영상) 한국/2016/10분/color & b/w
송수연展 / SWAN SONG / 宋受娟 / 살기위해 들어가는 방 Death Room for the living / 2016. 04. 04 – 04. 29
Death Room for the Living
Space for Individual 시리즈의 하나로 상여의 형태를 차용한 ‘Death Room for the living’은 우리 사회 속 부조리한 구조적 모순의 죽음과 인간성 회복을 희망하는 작업으로 나무골조에 22개의 흙벽을 세우고 내부를 벽화로 장식한다.
상여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의식이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산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인 무겁고 아름다운 꽃상여 행렬은 여러 가지 의례를 통해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 작업의 시작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우리의 미래가 사그라드는 장면을 목격하고 ‘우리는 과연 함께 슬픔과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흙벽화에는 보살과 나한의 도상이 현대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보살 도상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가져야 할 이타심과 희생을 상징하고, 나한 도상은 현실의 번뇌와 업에 얽매여있으나 더 나은 우리 세상을 위해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실천의지를 표상한다. 나한의 인물들은 SNS를 통해 이 프로젝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알림에 화답한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스페이스 이끼에 전시되는 벽면은 설치물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화면으로 윗열에는 가운데에 관세음보살, 좌우로 허공장, 제개장 보살이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아랫열 가운데에는 참여자의 요청으로 그려진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아이들과 좌우로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상징적으로 그려져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늘날의 나한 및 보살과 같은 실천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한데 모여, 우리 사회의 인간성과 지성의 회복을 소망하는 나와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의 공동작업으로 이는 우리 시대 지성(知性)들이 뜻을 한데 모아 사회의 각성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강정욱, 김정경, 김정선, 김지윤, 김진환, 문은정, 박미정, 박우진, 박인정, 박정식, 설정미, 송금호, 정이도, 이소은, 이재찬, 이지나, 이진호, 장대성, 전성연, 전희영, 하재민, 한세열, 한정아, 한지수
송수연 작가노트
Space for Individual 시리즈의 하나로 상여의 형태를 차용한 ‘Death Room for the living’은 우리 사회 속 부조리한 구조적 모순의 죽음과 인간성 회복을 희망하는 작업으로 나무골조에 22개의 흙벽을 세우고 내부를 벽화로 장식한다.
상여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의식이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산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인 무겁고 아름다운 꽃상여 행렬은 여러 가지 의례를 통해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 작업의 시작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우리의 미래가 사그라드는 장면을 목격하고 ‘우리는 과연 함께 슬픔과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흙벽화에는 보살과 나한의 도상이 현대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보살 도상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가져야 할 이타심과 희생을 상징하고, 나한 도상은 현실의 번뇌와 업에 얽매여있으나 더 나은 우리 세상을 위해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실천의지를 표상한다. 나한의 인물들은 SNS를 통해 이 프로젝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알림에 화답한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스페이스 이끼에 전시되는 벽면은 설치물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화면으로 윗열에는 가운데에 관세음보살, 좌우로 허공장, 제개장 보살이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아랫열 가운데에는 참여자의 요청으로 그려진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아이들과 좌우로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상징적으로 그려져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늘날의 나한 및 보살과 같은 실천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한데 모여, 우리 사회의 인간성과 지성의 회복을 소망하는 나와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의 공동작업으로 이는 우리 시대 지성(知性)들이 뜻을 한데 모아 사회의 각성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강정욱, 김정경, 김정선, 김지윤, 김진환, 문은정, 박미정, 박우진, 박인정, 박정식, 설정미, 송금호, 정이도, 이소은, 이재찬, 이지나, 이진호, 장대성, 전성연, 전희영, 하재민, 한세열, 한정아, 한지수
송수연 작가노트
살기위해 들어가는 방, DEATH ROOM FOR THE LIVING
우리는 어쨌든 내일을 위해서 산다. 그 누구도 어제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일은 우리의 죽음에서 한 발 가까운 또 다른 어제가 될 뿐이다. 죽음에 한 발 다가선 내일, 내일은 헛된 오늘의 희망이고, 혹은 참된 오늘의 대가 일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쩌서 내일을 위해 사는가? 죽음은 정해져 있고 그것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전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송수연 작가의 'Death Room' 들어가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온전히 세워진 그 공간에서 우리가 마주할 감정은 무엇일까? 눈물이 날까? 두려움으로 바로 뛰쳐나오고 싶을까? 어제의 나를 느끼며 스스로를 토닥여 주고 싶을까? 이런 의문 앞에서 우리는 선뜻 그 방에 들어가기를 주저할지도 모른다. 무언가와 마주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단순히 무서움, 두려움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두려운 것이다. 죽음에 한 발 가까운 내일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Death room for the living'. 살기 위해 들어가는 죽음의 방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 <죽어야 사는 여자Death Becomes Her>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죽어야만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영원은 또다른 죽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관건은 죽음이다. 죽음은 다시금 죽음을 부르지 않는다. 자살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다. 죽음에는 내일이 없다. 죽음에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이다.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죽음이 살기위한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회를 이어가는 것은 생전 자신의 업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업의 씨앗이 다시금 탄생으로 이어지고 죽음에 이르며, 윤회한다. 윤회의 고리를 끊고 평온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죽음인 것 같다.
우리는 무엇으로 윤회할 것인가. 다음 생에 나의 어떤 업의 씨앗이 탄생의 텃밭에 뿌려질 것인가. 그 방에 들어가 가만히 나를 대면해 보자. 나의 어제와 나의 내일. 누군가에게는 없을 내일. 바닷속 깊은 곳에서 어쩌면 최인훈의 소설에서처럼 이미 바다가 되었을 지도 모를 그 아이들, 혹은 빛이 되어 버렸을 지도 모를 그 아이들.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버린, 살아낸 우리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혹은 오늘 같은 내일을 꿈꾸며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우리들.
사상이 다소 불온한 엄마인 나는 5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다. 누구나 죽는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죽어 봤으나 죽음이 기억나지 않아 죽은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꽤나 슬프더라. 그러나 그 슬픔이 영원한 것 또한 아니더라. 결국 죽은 사람의 빈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청개구리 동화를 읽고 청개구리 엄마의 죽음에 슬퍼하며 자신의 엄마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버린 아이는 내 품에 안겨 한 참을 울었다. 마치 내가 지금 죽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나 이내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네 엄마, 잘 도와줘. 그러다 엄마 힘들어서 죽는다” 라는 말에, 태연하게 “할머니, 죽으면 없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못 봐.”라고 답한다. 물론 할머니는 당돌한 손자의 말에 당황했겠지만, 나는 아이가 마치 나처럼 우리엄마가 죽는다면, 우리엄마도 죽는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이 이내 대견하기만 하다.
죽음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기위해 죽음의 방에 들어가는 이유일 것이다. ‘보람찬 내일’을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낸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용감해 질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이다. 내일이 없는 그들을 위해, 더 이상의 죽음이 없는 그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두개골 사이를 지나드는’ 물고기 떼들과 함께 바다가 된, 고운 모래알이 된, 밝은 태양빛이 된 그들을 위해 나의 오늘을 주저함 없이 그들을 위해 바친다.
피서라
- 어머니, 오래지 않아 이렇게 부를 수도 생각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자주 보는 물고기 떼가 여기저기서 나를 건드리면서 지나간다. 물고기 떼의 한 부분은 내 눈 속을 빠져나간다. 아마 그들에게는 기차굴 놀이 같은 동작일 테지.(…) 어머니. 그래서 부릅니다. 이 백골은 오래지 않아 이 말을 부를 래야 부를 수 없는 것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 더 살아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한 이 백골을 대신해서 사람들은 할 일을 해주겠지요. 어머니 이렇게 불러도 이 목소리는 결코 어머니에게 들리지 않겠기에 이렇게 부릅니다. 부를 수 있는 동안에 부릅니다. 바다 밑에서 중얼거리는 이 자식의 무서운 중얼거림을 어머님은 결코 듣지 못하겠기에 제가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에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이 꼴을 어머님은 보실 수 없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머님의 슬픔에 대하여 적어도 여기 벌어진 이 끔찍한 광경만은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지요. 정작 이렇게 되고 보니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저를 위해서 슬프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일은 끝났습니다._「바다의 편지」中 최인훈
우리는 어쨌든 내일을 위해서 산다. 그 누구도 어제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일은 우리의 죽음에서 한 발 가까운 또 다른 어제가 될 뿐이다. 죽음에 한 발 다가선 내일, 내일은 헛된 오늘의 희망이고, 혹은 참된 오늘의 대가 일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쩌서 내일을 위해 사는가? 죽음은 정해져 있고 그것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전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송수연 작가의 'Death Room' 들어가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온전히 세워진 그 공간에서 우리가 마주할 감정은 무엇일까? 눈물이 날까? 두려움으로 바로 뛰쳐나오고 싶을까? 어제의 나를 느끼며 스스로를 토닥여 주고 싶을까? 이런 의문 앞에서 우리는 선뜻 그 방에 들어가기를 주저할지도 모른다. 무언가와 마주할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단순히 무서움, 두려움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두려운 것이다. 죽음에 한 발 가까운 내일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Death room for the living'. 살기 위해 들어가는 죽음의 방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 <죽어야 사는 여자Death Becomes Her>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죽어야만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영원은 또다른 죽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관건은 죽음이다. 죽음은 다시금 죽음을 부르지 않는다. 자살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다. 죽음에는 내일이 없다. 죽음에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이다.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죽음이 살기위한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회를 이어가는 것은 생전 자신의 업보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업의 씨앗이 다시금 탄생으로 이어지고 죽음에 이르며, 윤회한다. 윤회의 고리를 끊고 평온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죽음인 것 같다.
우리는 무엇으로 윤회할 것인가. 다음 생에 나의 어떤 업의 씨앗이 탄생의 텃밭에 뿌려질 것인가. 그 방에 들어가 가만히 나를 대면해 보자. 나의 어제와 나의 내일. 누군가에게는 없을 내일. 바닷속 깊은 곳에서 어쩌면 최인훈의 소설에서처럼 이미 바다가 되었을 지도 모를 그 아이들, 혹은 빛이 되어 버렸을 지도 모를 그 아이들.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버린, 살아낸 우리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혹은 오늘 같은 내일을 꿈꾸며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우리들.
사상이 다소 불온한 엄마인 나는 5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다. 누구나 죽는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죽어 봤으나 죽음이 기억나지 않아 죽은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꽤나 슬프더라. 그러나 그 슬픔이 영원한 것 또한 아니더라. 결국 죽은 사람의 빈자리는 없어지게 된다.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청개구리 동화를 읽고 청개구리 엄마의 죽음에 슬퍼하며 자신의 엄마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버린 아이는 내 품에 안겨 한 참을 울었다. 마치 내가 지금 죽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나 이내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네 엄마, 잘 도와줘. 그러다 엄마 힘들어서 죽는다” 라는 말에, 태연하게 “할머니, 죽으면 없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못 봐.”라고 답한다. 물론 할머니는 당돌한 손자의 말에 당황했겠지만, 나는 아이가 마치 나처럼 우리엄마가 죽는다면, 우리엄마도 죽는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이 이내 대견하기만 하다.
죽음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기위해 죽음의 방에 들어가는 이유일 것이다. ‘보람찬 내일’을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낸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용감해 질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이다. 내일이 없는 그들을 위해, 더 이상의 죽음이 없는 그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두개골 사이를 지나드는’ 물고기 떼들과 함께 바다가 된, 고운 모래알이 된, 밝은 태양빛이 된 그들을 위해 나의 오늘을 주저함 없이 그들을 위해 바친다.
피서라
김남표+윤두진展/ kIM, NAMPYO + YOON, DUJIN / 金南杓 + 尹斗珍 / 텐트 TENT / 2016. 03. 07 ~ 04. 01
“자기 집에서 나와 주변을 산책하다 생각 없이 낯선 길을 따라간다.
그래도 일상의 지루한 반복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시도에 기분이 좋아진다.”
그림을 그리는 김남표와 조각하는 윤두진은 크지는 않지만 서로의 작업적 교감을 통해 일상처럼 반복되던 자신의 작업을 벗어나려는 작은 시도를 하고 있다.
작품이 아닌 작업의 변화를 위한 목적이다.
텐트라는 공간은 분명히 일상의 현실과 다른 공간이다.
밤하늘 아래 텐트라는 공간은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 그리고 나다움을 발견하게 한다.
두 예술가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같이 어떤 작업을 한다…….
어찌됐든 두 사람의 표정이 이전과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김남표와 윤두진의 작품은 동물과 문명, 인간과 문명 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해진 이분법적인 구조는 비판과 대치가 아닌 공존과 조화라는 틀 안에서 풍부한 감정을 유도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대상으로 변화시킨다.
두 작가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지점이다.
이번 작품도 오래된 그리스식 주두 위에 풍경과 뒤섞인 날개 달린 표범이 다른 기둥 위에 앉아있는 변형된 인간을 응시한다.
두개의 사물은 인간과 다른 공간에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으나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시간의 기원은 느껴진다. 그러나 이들의 출처는 알 수 없다.
단지 우리 인간과 무관하지 않고 마치 우리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듯하다.
TENT 김남표+윤두진 작가노트
그래도 일상의 지루한 반복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시도에 기분이 좋아진다.”
그림을 그리는 김남표와 조각하는 윤두진은 크지는 않지만 서로의 작업적 교감을 통해 일상처럼 반복되던 자신의 작업을 벗어나려는 작은 시도를 하고 있다.
작품이 아닌 작업의 변화를 위한 목적이다.
텐트라는 공간은 분명히 일상의 현실과 다른 공간이다.
밤하늘 아래 텐트라는 공간은 잃어버린 시간과 기억, 그리고 나다움을 발견하게 한다.
두 예술가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같이 어떤 작업을 한다…….
어찌됐든 두 사람의 표정이 이전과 다름을 발견할 수 있다.
김남표와 윤두진의 작품은 동물과 문명, 인간과 문명 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해진 이분법적인 구조는 비판과 대치가 아닌 공존과 조화라는 틀 안에서 풍부한 감정을 유도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대상으로 변화시킨다.
두 작가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지점이다.
이번 작품도 오래된 그리스식 주두 위에 풍경과 뒤섞인 날개 달린 표범이 다른 기둥 위에 앉아있는 변형된 인간을 응시한다.
두개의 사물은 인간과 다른 공간에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으나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시간의 기원은 느껴진다. 그러나 이들의 출처는 알 수 없다.
단지 우리 인간과 무관하지 않고 마치 우리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듯하다.
TENT 김남표+윤두진 작가노트
빛이 날개를 부러뜨리고 슬픔이, 고통이 샘물 속 추억을 적신다.
오늘은 가슴속에 희미한
별들의 전율을 느낀다,
그러나 나의 길은 안개의
영혼 속에 길을 잃는다.
빛이 나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나의 슬픔이 고통이
생각의 샘물 속
추억을 적신다.
_가을노래(로르카)에서
표범이 재빠르게 날아올랐다. 그것의 날개를 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행운이다. 그것의 꼬리가 나의 목을 곧 죄어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나를 탐색이라도 하듯 시선을 나에게 둔 채 꼬리로 진동을 일으켰다. 그 진동의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일순간 구름이 몰려와 발아래가 까마득해 졌다. 한기가 전해진다. 뾰족한 첨탑들이 구름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전해진다. 나는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이것들로 하여금 위통이 도지다니,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저 녀석은 나를 과연 알아볼까, 나의 가녀린 팔을 눈치 채지는 않았을까, 굳어진 혹은 겨우 위경련으로 찡그린 나의 얼굴을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한 통증이 배꼽에서부터 식도까지 차올라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 했다. 녀석을 보지 않고 녀석을 보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가. 우리가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부터 우리는 천상의 세계를 꿈꿔 왔다. 말을 달리고 우주로 비상하기 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고 파괴해 왔던가. 갑자기 어릴 적 앞마당에 메어 놓았던 나의 ‘얼’이 생각났다. 녀석은 온순한 당나귀였다. 비상하는 표범을 꿈꿔 왔던 시절, 그것의 꿈을 꾼 날이면 나는 얼의 등에 올라타 숲 속을 달리곤 했다. 아직 채 증발되지 않은 새벽이슬이 나의 살갗에 내려앉았고 소름끼치게 아름다운 광경 속으로 나는 빨려 들어가곤 했다. 정신없이 내 앞으로 쏟아지는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면 그야말로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의식의 마지막 끈 앞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저 녀석이었다. 날개를 감추고 나를 잡아먹을 듯 응시하는 녀석의 모습이 언제나 의식의 작은 구멍 안으로 마감되었다.
이 순간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것이 있는 세계에, 나는 보이지 않는 허상으로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로, 이 세계에서는 아무런 존재도 없다는 듯 표범은 그저 원래 보고 있던 곳을 그대로 응시하고 있다는 듯. 긴장감이 감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주두에서 내려와 까마득한 아랫세상으로 곤두박질친다면 과연 그때도 녀석은 이렇듯 찬란한 날개를 펴고 내려와 나를 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녀석도 나처럼 숨죽여 주두에서의 탈출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녀석의 주두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대로 장관이었다. 표범은 어슬렁어슬렁 비탈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시선은 여전히 여기를 향한다. 나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지 알 수 없으리라. 언제부터 라는 말이 무색했다. 단 몇 분이었던 것도 같고 얼을 타고 달리던 시절이 까마득할 정도로 긴 세월을 여기서 보낸 것 같기도 하다. 서로를 바라보며 혹은 바라보지 않으며, 아래로 내려 갈 듯 혹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듯 그렇게 준비운동을 한 참이나 하고 있는 것도 같다. 세상은 변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님에도 여전히 우리이듯 변함없을 것이다. 구름 위로 숨죽여 바라보는 첨탑들은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르거나 아래로 비행해도 여전히 우리를 따를 것이고, 마치 프레임 밖에서 끼어든 듯한 나를 녀석은 계속해서 응시할 것이다.
우리는 끝나는 날까지 함께이고 마침내 끝나는 날이 왔을 때,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무엇을 탐하고 바라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멀리서 얼의 익살스런 콧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
피서라
오늘은 가슴속에 희미한
별들의 전율을 느낀다,
그러나 나의 길은 안개의
영혼 속에 길을 잃는다.
빛이 나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나의 슬픔이 고통이
생각의 샘물 속
추억을 적신다.
_가을노래(로르카)에서
표범이 재빠르게 날아올랐다. 그것의 날개를 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행운이다. 그것의 꼬리가 나의 목을 곧 죄어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나를 탐색이라도 하듯 시선을 나에게 둔 채 꼬리로 진동을 일으켰다. 그 진동의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일순간 구름이 몰려와 발아래가 까마득해 졌다. 한기가 전해진다. 뾰족한 첨탑들이 구름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전해진다. 나는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이것들로 하여금 위통이 도지다니,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저 녀석은 나를 과연 알아볼까, 나의 가녀린 팔을 눈치 채지는 않았을까, 굳어진 혹은 겨우 위경련으로 찡그린 나의 얼굴을 알아차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한 통증이 배꼽에서부터 식도까지 차올라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나는 애써 침착하려 했다. 녀석을 보지 않고 녀석을 보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던가. 우리가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부터 우리는 천상의 세계를 꿈꿔 왔다. 말을 달리고 우주로 비상하기 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고 파괴해 왔던가. 갑자기 어릴 적 앞마당에 메어 놓았던 나의 ‘얼’이 생각났다. 녀석은 온순한 당나귀였다. 비상하는 표범을 꿈꿔 왔던 시절, 그것의 꿈을 꾼 날이면 나는 얼의 등에 올라타 숲 속을 달리곤 했다. 아직 채 증발되지 않은 새벽이슬이 나의 살갗에 내려앉았고 소름끼치게 아름다운 광경 속으로 나는 빨려 들어가곤 했다. 정신없이 내 앞으로 쏟아지는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면 그야말로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의식의 마지막 끈 앞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저 녀석이었다. 날개를 감추고 나를 잡아먹을 듯 응시하는 녀석의 모습이 언제나 의식의 작은 구멍 안으로 마감되었다.
이 순간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것이 있는 세계에, 나는 보이지 않는 허상으로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로, 이 세계에서는 아무런 존재도 없다는 듯 표범은 그저 원래 보고 있던 곳을 그대로 응시하고 있다는 듯. 긴장감이 감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주두에서 내려와 까마득한 아랫세상으로 곤두박질친다면 과연 그때도 녀석은 이렇듯 찬란한 날개를 펴고 내려와 나를 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녀석도 나처럼 숨죽여 주두에서의 탈출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녀석의 주두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대로 장관이었다. 표범은 어슬렁어슬렁 비탈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시선은 여전히 여기를 향한다. 나의 시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지 알 수 없으리라. 언제부터 라는 말이 무색했다. 단 몇 분이었던 것도 같고 얼을 타고 달리던 시절이 까마득할 정도로 긴 세월을 여기서 보낸 것 같기도 하다. 서로를 바라보며 혹은 바라보지 않으며, 아래로 내려 갈 듯 혹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듯 그렇게 준비운동을 한 참이나 하고 있는 것도 같다. 세상은 변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님에도 여전히 우리이듯 변함없을 것이다. 구름 위로 숨죽여 바라보는 첨탑들은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르거나 아래로 비행해도 여전히 우리를 따를 것이고, 마치 프레임 밖에서 끼어든 듯한 나를 녀석은 계속해서 응시할 것이다.
우리는 끝나는 날까지 함께이고 마침내 끝나는 날이 왔을 때,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무엇을 탐하고 바라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멀리서 얼의 익살스런 콧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
피서라
최준경展 / JOON K CHOI / 崔埈京 / 댐, 그녀로부터 The Dam from the Goddesses / 2015. 11. 30 - 01. 15
댐, 그녀로부터 The Dam from the Goddesses
Ⅰ. 절대적이고 완벽한 선함의 추구는 우리 인간사에서는 무모한 시도인지 모른다. 신의 경지와도 같이 세상을 창조하고 완벽함에 이르려 하지만 창조도, 완벽도 인간의 영역이 아닌 까닭이다. 저 도시를 보라. 인간이 꾸민 다리, 도로, 백화점, 아파트들을. 모든게 절대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절대성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충돌한 부산물들은 한강줄기를 따라 말없이 흐른다. 그것을 나는 보았다.
Ⅱ. 작년부터 나는 댐을 그리고 싶었다. 도시 풍경속에서 여러 인간상을 포착하려던 지난 작품의 다음 선상에서 나는 오로지 댐을 그리고 싶었다. 사실 이전부터 내게 댐은 기억속에 아련히 존재하는 먼 조상같은 존재였다. 그 연유는 어릴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홉살 때 쯤이었나, 토목건축가이셨던 아버지는 댐 공사를 감독하시러 가족을 서울에 남겨두시고 지방으로 떠나셨다.
‘댐 따위를 대체 왜 지어야 할까?’어린 마음에 가족이 한데 모여 살지 못하는 슬픔에 애꿎은 댐만 미워했다. 하지만 몇년이 지난 어느날 전주로 내려가 아버지가 감독하셨다는 댐을 보게 되었고, 나는 평생 간직할만큼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거대한 시멘트의 육중한 질량이 주는 위대한 광활함은 존경 그 자체를 내게 가르쳐주었다.
‘존경: 자연과 그 자연을 다루는 인간, 아버지, 시멘트의 엄청난 질량, 도면을 현실로 만드는 현대 기술, 수많은 장비, 노동자들의 인내, 집념, 토목의 신비로움, 댐 안에 덮힌 알수없는 그 무엇 등등… ’
그러던 중 작년에 나는 미국 아리조나주의 글렌 캐년 댐(Glen Canyon Dam) 앞에 설 기회를 갖게 되었고 어릴적의 그 감정이 생생히 떠올랐다. 이 한개의 댐 속에 투입된 시멘트의 질량은 경부고속도로의 그것과 맞먹는단 설명에 놀랐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대담히 자리잡은 댐의 그 우아한 자태란… 붉은빛 사이로 시간도 잊게 만드는 거대한 송전탑 행렬 마저 라스베가스를 밝혀야 하는 댐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수행하는 전사들 같았다. 몇겁을 우두커니 버텨온 저 바위보다 더 굳건하게 둥지를 틀고 그 안에 물을 품은 댐……. 이렇듯 20여년만의 댐의 속살과 조우하게 된 순간, 나만 아는 존경 가득한 환희로, 또 은밀한 의식 저편의 숭배의 감정으로 댐을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존경과 찬사가 그저 댐 하나만의 가치 때문은 아닐 것 같았다. 거듭 스스로 물어 거대한 감정의 파장의 진원지를 찾고자 하였다. 나의 그림은 그것에 대한 모호성을 동반한 질문이자 대답이리라.
Ⅲ. 도시와 댐을 화폭에 표현하기 위해 내게는 몇가지 스스로 내건 조건이 있었다.
1.절대적으로 선한 구도와 형태를 추구할것.
2.절대적으로 완벽한 이분적 구도를 추구할것.
3.절대적인 진실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성을 고려할것.
4.그리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데 대해 실패할것.
이처럼 절대성의 그림을 실패로 마무리하며 성공하는 것이다. 그림은 때때로 기쁨으로- 슬픔으로, 빛으로-어둠으로, 시끄러움으로- 고요함으로, 채운 곳으로- 빈 곳으로 끊임없이 순환하고 대화하며 순간순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모든것이 성공지향적이고 완결을 위한 상태라면 지금 이순간 내가 움직이고 창작하는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Ⅳ.인류가 세대를 내려오며 절대성에 관해 단하나 성공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완전한 사랑이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할수밖에 없는 사랑, 원수마저 마침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란 것을 할때 인간은 감히 신의 절대성의 수준에 이를수 있다는 것이다.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도시를 밝히는 댐의 구조에서도 어떠한 절대적 사랑의 흔적를 발견하는 것 같다.
다시말해, 우리는 결코 언제나 늘 실패하지는 않았다. 갈등과 대립속에도 대를 내려오며 축적된 사랑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우리를 감싸 안는지 모른다. 사랑이 물질로서 증명되지 않듯이, 그림 속 무표정한 풍경 어딘가에도 사랑이 존재하기를… 넉넉한 할머니의 사랑처럼 댐이 품은 물에서 그 흔적이 아스라이 피어나기를, 나는 소망해본다.
최준경 작가노트
www.joonkchoi.com
Ⅰ. 절대적이고 완벽한 선함의 추구는 우리 인간사에서는 무모한 시도인지 모른다. 신의 경지와도 같이 세상을 창조하고 완벽함에 이르려 하지만 창조도, 완벽도 인간의 영역이 아닌 까닭이다. 저 도시를 보라. 인간이 꾸민 다리, 도로, 백화점, 아파트들을. 모든게 절대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절대성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충돌한 부산물들은 한강줄기를 따라 말없이 흐른다. 그것을 나는 보았다.
Ⅱ. 작년부터 나는 댐을 그리고 싶었다. 도시 풍경속에서 여러 인간상을 포착하려던 지난 작품의 다음 선상에서 나는 오로지 댐을 그리고 싶었다. 사실 이전부터 내게 댐은 기억속에 아련히 존재하는 먼 조상같은 존재였다. 그 연유는 어릴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홉살 때 쯤이었나, 토목건축가이셨던 아버지는 댐 공사를 감독하시러 가족을 서울에 남겨두시고 지방으로 떠나셨다.
‘댐 따위를 대체 왜 지어야 할까?’어린 마음에 가족이 한데 모여 살지 못하는 슬픔에 애꿎은 댐만 미워했다. 하지만 몇년이 지난 어느날 전주로 내려가 아버지가 감독하셨다는 댐을 보게 되었고, 나는 평생 간직할만큼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거대한 시멘트의 육중한 질량이 주는 위대한 광활함은 존경 그 자체를 내게 가르쳐주었다.
‘존경: 자연과 그 자연을 다루는 인간, 아버지, 시멘트의 엄청난 질량, 도면을 현실로 만드는 현대 기술, 수많은 장비, 노동자들의 인내, 집념, 토목의 신비로움, 댐 안에 덮힌 알수없는 그 무엇 등등… ’
그러던 중 작년에 나는 미국 아리조나주의 글렌 캐년 댐(Glen Canyon Dam) 앞에 설 기회를 갖게 되었고 어릴적의 그 감정이 생생히 떠올랐다. 이 한개의 댐 속에 투입된 시멘트의 질량은 경부고속도로의 그것과 맞먹는단 설명에 놀랐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대담히 자리잡은 댐의 그 우아한 자태란… 붉은빛 사이로 시간도 잊게 만드는 거대한 송전탑 행렬 마저 라스베가스를 밝혀야 하는 댐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수행하는 전사들 같았다. 몇겁을 우두커니 버텨온 저 바위보다 더 굳건하게 둥지를 틀고 그 안에 물을 품은 댐……. 이렇듯 20여년만의 댐의 속살과 조우하게 된 순간, 나만 아는 존경 가득한 환희로, 또 은밀한 의식 저편의 숭배의 감정으로 댐을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존경과 찬사가 그저 댐 하나만의 가치 때문은 아닐 것 같았다. 거듭 스스로 물어 거대한 감정의 파장의 진원지를 찾고자 하였다. 나의 그림은 그것에 대한 모호성을 동반한 질문이자 대답이리라.
Ⅲ. 도시와 댐을 화폭에 표현하기 위해 내게는 몇가지 스스로 내건 조건이 있었다.
1.절대적으로 선한 구도와 형태를 추구할것.
2.절대적으로 완벽한 이분적 구도를 추구할것.
3.절대적인 진실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성을 고려할것.
4.그리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데 대해 실패할것.
이처럼 절대성의 그림을 실패로 마무리하며 성공하는 것이다. 그림은 때때로 기쁨으로- 슬픔으로, 빛으로-어둠으로, 시끄러움으로- 고요함으로, 채운 곳으로- 빈 곳으로 끊임없이 순환하고 대화하며 순간순간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모든것이 성공지향적이고 완결을 위한 상태라면 지금 이순간 내가 움직이고 창작하는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Ⅳ.인류가 세대를 내려오며 절대성에 관해 단하나 성공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완전한 사랑이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할수밖에 없는 사랑, 원수마저 마침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란 것을 할때 인간은 감히 신의 절대성의 수준에 이를수 있다는 것이다.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도시를 밝히는 댐의 구조에서도 어떠한 절대적 사랑의 흔적를 발견하는 것 같다.
다시말해, 우리는 결코 언제나 늘 실패하지는 않았다. 갈등과 대립속에도 대를 내려오며 축적된 사랑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우리를 감싸 안는지 모른다. 사랑이 물질로서 증명되지 않듯이, 그림 속 무표정한 풍경 어딘가에도 사랑이 존재하기를… 넉넉한 할머니의 사랑처럼 댐이 품은 물에서 그 흔적이 아스라이 피어나기를, 나는 소망해본다.
최준경 작가노트
www.joonkchoi.com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에 실패하기
쓰고 싶지 않지만 써야 할 말, 사랑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비벼대곤 했다. 반은 밤색, 반은 검은색,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눈.
그 수면 위로 빛 한 줄기 올라오지 않았다. 잔물결 하나 일렁이지 않았다. 그 시선은, 항상 그랬던 것 같은 시선은 내게는 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심연이라 불렀던 것이 정확히 이것이다.
동물들도 그녀 같은 눈을 가졌다. 똑바로 보는, 뒷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어떤 후경도 없는, 무한한, 심각한, 속일 수 없는, 곤두선, 불안에 찬, 빨아들일 것 같은 눈, 그녀는 앉기 전 무릎을 구부렸다.
_파스칼 끼냐르「심연들」
그 눈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작가의 눈인지 피서라의 눈인지, 작품과 이 글을 쫓고 있는 당신의 눈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보다 조금 더 명확한 것은 작가의 눈은 도시와 댐을 바라 봤고, 나의 눈은 댐과 더 이상 댐이 아닌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며, 당신의 눈은 도시와 댐과 더 이상 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준경의 작품을 보고 나서 글렌캐년댐을 찾아보았다. 사진만으로도 그 육중한 존재감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 본다면 아마도 ‘육중’과 ‘거대’라는 단어의 참 뜻을 알 수 있으리라. 다시 작가의 작품을 마주했다. 거기에는 육중과 거대함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가 있었는데, 따뜻함이나 차가움과 같은 어떤 심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작가 스스로 작가노트에서 밝히고 있듯, 그가 단순히 댐을 모사한 것이 아니었기에 받을 수 있는 인상이었을 듯싶다.
작가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선함의 추구를 인류의 삶에 대한 열망이라고 표현했다. 절대적이고 완벽한 선함이라…… 재밌는 표현이다. 그는 그림을 완성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스스로 그 조건들에 실패해야 성공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그것이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에 대해 실패할 것이라는 최종 전제가 앞선 드로잉의 조건들을 무너뜨리고 실패의 성공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왜 실패로 귀결되는 작품을 만든 것일까? 분명 전제들을 지키기 위해 쉽지 않은 선을 그었을 것이며, 들었던 붓을 여러 번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그림을 완성하는 내내 마지막 전제를 ‘절대로’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최종 전제를 염두 해 두고 그림을 완성시켜 나갔다면 앞 선 전제들은 그저 위선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성을 위해 최선의 선을 긋고, 최선의 명암과 채색을 가했을 때 작가가 직면하는 결론은 절대성에 대한 실패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공의 시작이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패의 패기이다. 그 과정이야말로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터넷에서 여러 장의 글렌캐년댐 사진을 보았을 때, 그것은 마치 인공물이 아닌 협곡과 함께해온 또 하나의 자연 같았다. 실제로도 콜로라도 강 상류에 이 댐을 건설하면서 파월 호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니 댐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인공적인 자연을 만들어 낸 셈이다. 완전히 인공적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자연적이지도 않은 그것은 최준경의 작품과 닿아 있다.
작가에 의하면 인류의 절대성을 향한 프로젝트는 언제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LOVE. 갑작스런 훅이 가슴을 강타한 느낌이다. 서늘하게 서스펜스를 달리다가 허무한 결론을 맞는 느낌이랄까. 그러나 실은 작가가 도시, 시멘트, 댐 등 인공적인 재료로 만든 거대하고 육중한 건축물에 매료된 계보를 따라가 보면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랑한 단어를 내가 쓸 줄은 몰랐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전혀 말랑하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대목에서 요즘 할 말이 있다.
며칠 사이 내게는 온갖 사건이 벌어졌다. 4살 아들의 유치원 추첨 전쟁에서 모두 실패했으며, 손자의 유치원 추첨을 기원하러 간 엄마의 교통사고와 아흔을 훌쩍 넘긴 외할머니의 죽음이 그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참으로 희한하다. 어릴 적 나는 우리엄마는 어떻게 엄마의 엄마와 떨어져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만약 우리 엄마가 죽으면 나도 살 수 없겠지, 엄마가 죽으면 나도 옆에 같이 누워야지 하면서 그 생각을 엄마에게도 말해주곤 했다. 사랑을 확인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게 남편이 생기고 부모가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사랑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대신 아이의 옷을 입혀 주면서,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면서 아들에게서 나의 사랑을 재차 확인받곤 한다.
엄마는 그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날 새벽 외할머니는 엄마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가족들은 수술 전 엄마가 쇼크를 받을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수술 후 할머니의 죽음을 전했을 때, 엄마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대신 힘겹게 손을 뻗어 단발로 싹둑 자른 내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넌 긴 머리가 예뻐, 다신 자르지 마.”라고 말할 뿐이었다. 엄마는 할머니의 죽음보다 딸의 어색한 헤어스타일이 속상했고, 나는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할머니의 부재로 한동안 어린이집에 혼자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할 아들을 생각하며 속상했다.
사랑 또한 절대적이지 않다. 물론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총량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댐도 언젠간 고여 있는 엄청난 물을 한순간에 흘러 보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려는 콤플렉스가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다. 그것을 알기에 강박적으로 선해지려고 애를 쓴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실패,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행동들이 실은 성공인 것이다. 최준경이 말하는 실패로 마무리 하는 성공. 그의 그림을 보라, 성공인가 실패인가?
나는 간혹 엄청난 스케줄을 세우고, 열심히 달리다가 한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져 아무 예고도 없이 그만두는 못된 습관을 발동할 때가 있다. 최준경의 작품을 보고 아래처럼 들뢰즈의 글귀에 열심히 밑줄을 쳤지만 결국은 그의 텍스트는 그대로의 것으로 남겨둘 것이다. 작가와 당신의 몫으로.
------------------------------------------------------------------------------------------------
각각의 질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질서들의 조건이다. 우리는 비대칭의 요소들을 갖추고 불균등한 크기의 질서들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체계를 신호라 부른다. 그리고 그런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 간격 안에서 섬광처럼 번득이는 것, 불균등한 것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어떤 소통 같은 것을 기호라 부른다. 예술에 있어서의 반복. 이는 규칙성으로 이해되는 자연의 경계선에 대한 반복적인 장식 예술과 법칙과 더불어 깨질 수 있는 예술적 자유를 말한다.
반복이란 것은 그야말로 자신을 구성해 가는 가운데 스스로 위장하는 것, 스스로 위장함으로써만 자신을 구성하는 어떤 것이다.
죽음-충동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각각의 가면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다음 가면으로, 그리고 다시 다음 가면으로 움직이려는 충동이다. 우리는 가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다른 측면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또 다시 연극하려는 충동 때문에 반복한다.
기억에 의존하는 개념들은 어떠한가? 이 개념들도 역시 봉쇄될 수 있는가? 기억에 의존하는 개념들은 원래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 사이의 간극 때문에 봉쇄될 수 있다. 기억된 사물/사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태에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기억이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사태와 기억의 일치는 항상 깨지거나 막힌다. 이는 사건을 경험하는 의식과 이 의식을 기억하는 의식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억의 속성이다. 사건을 경험하는 의식의 직접성은 의식을 기억하는 의식에 의해 자유롭게 조작되기 쉬운 대상이 된다.
의식적인 행위는 그와 모순되는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행위를 통해 법칙을 따른다.
_제임스 윌리엄스「들뢰즈의 차이와 반복-해설과 비판」
* 어두워지면 그의 그림에서 별이 반짝일 것이다
시인들이 행간을 비우고
소설가들이 문단을 나누듯
그의 그림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생성할 것이다
하늘거리는 실크위로 부드럽게 표현된 그림이
나의 심상을 자극했다
댐은 이 순간 아름다웠다
피서라
쓰고 싶지 않지만 써야 할 말, 사랑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비벼대곤 했다. 반은 밤색, 반은 검은색,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눈.
그 수면 위로 빛 한 줄기 올라오지 않았다. 잔물결 하나 일렁이지 않았다. 그 시선은, 항상 그랬던 것 같은 시선은 내게는 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심연이라 불렀던 것이 정확히 이것이다.
동물들도 그녀 같은 눈을 가졌다. 똑바로 보는, 뒷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어떤 후경도 없는, 무한한, 심각한, 속일 수 없는, 곤두선, 불안에 찬, 빨아들일 것 같은 눈, 그녀는 앉기 전 무릎을 구부렸다.
_파스칼 끼냐르「심연들」
그 눈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작가의 눈인지 피서라의 눈인지, 작품과 이 글을 쫓고 있는 당신의 눈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보다 조금 더 명확한 것은 작가의 눈은 도시와 댐을 바라 봤고, 나의 눈은 댐과 더 이상 댐이 아닌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며, 당신의 눈은 도시와 댐과 더 이상 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준경의 작품을 보고 나서 글렌캐년댐을 찾아보았다. 사진만으로도 그 육중한 존재감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실제로 본다면 아마도 ‘육중’과 ‘거대’라는 단어의 참 뜻을 알 수 있으리라. 다시 작가의 작품을 마주했다. 거기에는 육중과 거대함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가 있었는데, 따뜻함이나 차가움과 같은 어떤 심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작가 스스로 작가노트에서 밝히고 있듯, 그가 단순히 댐을 모사한 것이 아니었기에 받을 수 있는 인상이었을 듯싶다.
작가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선함의 추구를 인류의 삶에 대한 열망이라고 표현했다. 절대적이고 완벽한 선함이라…… 재밌는 표현이다. 그는 그림을 완성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스스로 그 조건들에 실패해야 성공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그것이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에 대해 실패할 것이라는 최종 전제가 앞선 드로잉의 조건들을 무너뜨리고 실패의 성공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왜 실패로 귀결되는 작품을 만든 것일까? 분명 전제들을 지키기 위해 쉽지 않은 선을 그었을 것이며, 들었던 붓을 여러 번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그림을 완성하는 내내 마지막 전제를 ‘절대로’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최종 전제를 염두 해 두고 그림을 완성시켜 나갔다면 앞 선 전제들은 그저 위선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성을 위해 최선의 선을 긋고, 최선의 명암과 채색을 가했을 때 작가가 직면하는 결론은 절대성에 대한 실패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공의 시작이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패의 패기이다. 그 과정이야말로 인간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인터넷에서 여러 장의 글렌캐년댐 사진을 보았을 때, 그것은 마치 인공물이 아닌 협곡과 함께해온 또 하나의 자연 같았다. 실제로도 콜로라도 강 상류에 이 댐을 건설하면서 파월 호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니 댐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인공적인 자연을 만들어 낸 셈이다. 완전히 인공적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자연적이지도 않은 그것은 최준경의 작품과 닿아 있다.
작가에 의하면 인류의 절대성을 향한 프로젝트는 언제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LOVE. 갑작스런 훅이 가슴을 강타한 느낌이다. 서늘하게 서스펜스를 달리다가 허무한 결론을 맞는 느낌이랄까. 그러나 실은 작가가 도시, 시멘트, 댐 등 인공적인 재료로 만든 거대하고 육중한 건축물에 매료된 계보를 따라가 보면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랑한 단어를 내가 쓸 줄은 몰랐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전혀 말랑하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대목에서 요즘 할 말이 있다.
며칠 사이 내게는 온갖 사건이 벌어졌다. 4살 아들의 유치원 추첨 전쟁에서 모두 실패했으며, 손자의 유치원 추첨을 기원하러 간 엄마의 교통사고와 아흔을 훌쩍 넘긴 외할머니의 죽음이 그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참으로 희한하다. 어릴 적 나는 우리엄마는 어떻게 엄마의 엄마와 떨어져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만약 우리 엄마가 죽으면 나도 살 수 없겠지, 엄마가 죽으면 나도 옆에 같이 누워야지 하면서 그 생각을 엄마에게도 말해주곤 했다. 사랑을 확인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게 남편이 생기고 부모가 되면서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사랑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대신 아이의 옷을 입혀 주면서,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면서 아들에게서 나의 사랑을 재차 확인받곤 한다.
엄마는 그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날 새벽 외할머니는 엄마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가족들은 수술 전 엄마가 쇼크를 받을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수술 후 할머니의 죽음을 전했을 때, 엄마는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대신 힘겹게 손을 뻗어 단발로 싹둑 자른 내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넌 긴 머리가 예뻐, 다신 자르지 마.”라고 말할 뿐이었다. 엄마는 할머니의 죽음보다 딸의 어색한 헤어스타일이 속상했고, 나는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할머니의 부재로 한동안 어린이집에 혼자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할 아들을 생각하며 속상했다.
사랑 또한 절대적이지 않다. 물론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총량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댐도 언젠간 고여 있는 엄청난 물을 한순간에 흘러 보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려는 콤플렉스가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다. 그것을 알기에 강박적으로 선해지려고 애를 쓴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실패,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행동들이 실은 성공인 것이다. 최준경이 말하는 실패로 마무리 하는 성공. 그의 그림을 보라, 성공인가 실패인가?
나는 간혹 엄청난 스케줄을 세우고, 열심히 달리다가 한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져 아무 예고도 없이 그만두는 못된 습관을 발동할 때가 있다. 최준경의 작품을 보고 아래처럼 들뢰즈의 글귀에 열심히 밑줄을 쳤지만 결국은 그의 텍스트는 그대로의 것으로 남겨둘 것이다. 작가와 당신의 몫으로.
------------------------------------------------------------------------------------------------
각각의 질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질서들의 조건이다. 우리는 비대칭의 요소들을 갖추고 불균등한 크기의 질서들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체계를 신호라 부른다. 그리고 그런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 간격 안에서 섬광처럼 번득이는 것, 불균등한 것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어떤 소통 같은 것을 기호라 부른다. 예술에 있어서의 반복. 이는 규칙성으로 이해되는 자연의 경계선에 대한 반복적인 장식 예술과 법칙과 더불어 깨질 수 있는 예술적 자유를 말한다.
반복이란 것은 그야말로 자신을 구성해 가는 가운데 스스로 위장하는 것, 스스로 위장함으로써만 자신을 구성하는 어떤 것이다.
죽음-충동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각각의 가면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다음 가면으로, 그리고 다시 다음 가면으로 움직이려는 충동이다. 우리는 가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다른 측면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또 다시 연극하려는 충동 때문에 반복한다.
기억에 의존하는 개념들은 어떠한가? 이 개념들도 역시 봉쇄될 수 있는가? 기억에 의존하는 개념들은 원래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 사이의 간극 때문에 봉쇄될 수 있다. 기억된 사물/사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사태에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기억이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사태와 기억의 일치는 항상 깨지거나 막힌다. 이는 사건을 경험하는 의식과 이 의식을 기억하는 의식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억의 속성이다. 사건을 경험하는 의식의 직접성은 의식을 기억하는 의식에 의해 자유롭게 조작되기 쉬운 대상이 된다.
의식적인 행위는 그와 모순되는 다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행위를 통해 법칙을 따른다.
_제임스 윌리엄스「들뢰즈의 차이와 반복-해설과 비판」
* 어두워지면 그의 그림에서 별이 반짝일 것이다
시인들이 행간을 비우고
소설가들이 문단을 나누듯
그의 그림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생성할 것이다
하늘거리는 실크위로 부드럽게 표현된 그림이
나의 심상을 자극했다
댐은 이 순간 아름다웠다
피서라
김병훈展 / KIM, BYUNGHOON / 金炳薰 / 유진幽眞 / 2015. 11. 02 - 11. 27
예천 초간정, 醴泉 草澗亭, Klcp eg009 Pigment Print_Silk, Brush and their mounting, 150 x 215cm 2015 (좌)
우리 자연,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시작된 이미지들은 오랜 시간 수집한 옛모습 의 자료를 통하여 디오라마처럼 복원되고 제한된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지나버린 시대를 회상시키는 존재들에게 다시 영혼을 불어넣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에 벅차있다. 나라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우리민족의 정신속안의 정서와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강산 안에서 흘러 나와 우리에게 서서 히 스며들었다. 우리 조상의 삶의 터전, 낯설지만 이내 곧 익숙해질 이미지들은 기존 관념상식을 옹호하거나 때론 배반하며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인식과 관념의 틈새로 스며들어 마치 우리 눈으로 직접 보거나 2차원적 질량이 부재한 몽환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개개인의 사고 한구석에 단단하게 융화되어 자리잡게 된다.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작가의 관념 속에서 실재와 가상, 진실과 사기는 경계를 알 수 없이 뒤섞여 버린지 오래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진의 형태이기 에 인식된 물질은 더욱이 사실적 근거를 갖게 되고 종이에 고착된 이미지들의 조합된 파편들은 우리의 관념과 결합하고 어느새 진실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초의 단편적인 서사인 달력사진2011 전시를 시작으로 작업은 디 오라마적 환상과 관념 그리고 우리자연의 역사적 복원적인 작업으로 발전 한다.
유진, 幽眞, Ink on Paper_Silk, Brush and their mounting, 132 x 37cm , 2015 (우)
자연, 그대로인 풍수는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대화다.
좌우 옆 산, 뒷산, 앞산, 냇가 등의 위치와 형세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한 후 의미를 부여했다. 최대한 자연의 조건을 이용, 풍수의 원리를 따라 터를 잡고,
방향을 잡고, 혈을 정해 집이나 마을을 짓는다.
우리나라 지형은 이러한 풍수의 원리를 따르기 좋을 정도로 산과 물이 좋다.
바로 금수강산이다. 이 땅에서 자라고 성장한 우리의 삶, 당연히 남다를 수 밖에 없으리라.
이를 두글자 유진幽眞(고요하고 자연 그대로인)이란 글자로 표현한다.
김병훈 작가노트
우리 자연,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시작된 이미지들은 오랜 시간 수집한 옛모습 의 자료를 통하여 디오라마처럼 복원되고 제한된 상상력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지나버린 시대를 회상시키는 존재들에게 다시 영혼을 불어넣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에 벅차있다. 나라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우리민족의 정신속안의 정서와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강산 안에서 흘러 나와 우리에게 서서 히 스며들었다. 우리 조상의 삶의 터전, 낯설지만 이내 곧 익숙해질 이미지들은 기존 관념상식을 옹호하거나 때론 배반하며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인식과 관념의 틈새로 스며들어 마치 우리 눈으로 직접 보거나 2차원적 질량이 부재한 몽환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개개인의 사고 한구석에 단단하게 융화되어 자리잡게 된다.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작가의 관념 속에서 실재와 가상, 진실과 사기는 경계를 알 수 없이 뒤섞여 버린지 오래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진의 형태이기 에 인식된 물질은 더욱이 사실적 근거를 갖게 되고 종이에 고착된 이미지들의 조합된 파편들은 우리의 관념과 결합하고 어느새 진실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초의 단편적인 서사인 달력사진2011 전시를 시작으로 작업은 디 오라마적 환상과 관념 그리고 우리자연의 역사적 복원적인 작업으로 발전 한다.
유진, 幽眞, Ink on Paper_Silk, Brush and their mounting, 132 x 37cm , 2015 (우)
자연, 그대로인 풍수는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대화다.
좌우 옆 산, 뒷산, 앞산, 냇가 등의 위치와 형세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한 후 의미를 부여했다. 최대한 자연의 조건을 이용, 풍수의 원리를 따라 터를 잡고,
방향을 잡고, 혈을 정해 집이나 마을을 짓는다.
우리나라 지형은 이러한 풍수의 원리를 따르기 좋을 정도로 산과 물이 좋다.
바로 금수강산이다. 이 땅에서 자라고 성장한 우리의 삶, 당연히 남다를 수 밖에 없으리라.
이를 두글자 유진幽眞(고요하고 자연 그대로인)이란 글자로 표현한다.
김병훈 작가노트
압도될 수밖에 없는 여정
너무 실제 같아 실재할 것 같지 않은 ‘마보로시’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 우리는 입을 연다. -P-
정말이지 너무나도 시끄러워 나는 숨어버린 것이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누군가는 벌써 일어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고, 이불을 부여잡고 창으로 들어오는 볕을 간신히 피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라디오 속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목소리에서 성별과 가창력을 판단하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혹은 이른 저녁인지도 모를 식사를 챙기기 위해 식탁에 앉아 한 참 동안 벽을 노려보고 있을 때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지금에서야 굳이 일어나 벽을 노려보고 있는 것인지 생각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어제의 일이 생각나 그만 머리를 흔들어 버리고, 마치 그러면 어제의 일이 없어지기라도 할 것 같아 어린아이처럼 그런 주문을 알려 준 엄마의 말이라면 분명하겠지 하고 다시 한 번 세차게 머리를 흔들다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고 왼쪽 렌즈가 방정맞게 바닥에서 엉덩이를 들썩일 때, 나는 벌떡 일어나 내가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합당한 목적지를 찾고 싶었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순 없었다. 순간 혼자서 멋진 말을 만들어 내려 했던 내가 멋쩍었다.
지갑을 챙겼고, 배낭을 하나 둘러메고 양말을 한 켤레 집어넣다, 속옷도 넣어야 하나 고민하다, 책 한 권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책꽂이를 서성이다 읽었던 책은 다시 읽고 싶지 않고, 읽지 않고 꽂아 둔 책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손을 대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다.
내가 모르는 종착지가 쓰여 진 고속버스를 무작정 골라 타고, 눈을 감았다. 무음의 음악이나 소리가 있다면 그런 것을 골라 이어폰으로 듣고 싶었다. 이어폰을 꽂으면 그대로 세계의 소리와 단절되는 것이다. 그런 소리가 있다면, 그런 음악이 있다면 한껏 볼륨을 높여 온전히 그 음악 하나만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나는 버스에서 내린다. 여기는 처음이다. 순간 두려움이 앞선다. 어디로 가지? 하는 생각과 함께 작은 시내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막차라는 것을 직감했다. 버스는 마지막으로 구멍가게 앞에 정차했고, 나는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가게 주인은 마치 예견된 것 마냥 심드렁하게 문을 열어 재끼고는 나를 맞았다. 자리끼를 건네주면서 자고 갈 거쥬? 하고 손가락 5개를 펴들었다. 습관적으로 카드를 빼내려 했지만 오만원 권 한 장을 대신 내밀었다. 주인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커다란 미닫이창을 열더니 방에 팔을 괘고 누워 있는 사내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나오라고 했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가 사내가 보던 TV 프로그램을 그대로 조금 보다가 껐다. 잠을 자려고 한 건 아니지만 불을 껐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떴다. 감았는지 떴는지 눈꺼풀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새까만 어둠이 펼쳐진다. 얼마 안 있어 유리 홑창 가게 문을 통해 어스름히 동이 텄고, 영화 마보로시의 그것처럼 무엇에 홀린 듯 길을 나섰다. 어제는 몰랐던 산이 보였고, 마침 등산화 비슷한 것을 신은 준비성 많은 내가 대견했다. 한 참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구름 속에 와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안개였다. 안개나무, 안개시내, 구름 바위, 구름 풀잎들이 살갗으로 전해졌다. 땀인지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를 그것들이 목덜미로 흘렀다. 닦을 필요는 없다. 아담한 정자 한 채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그 때 나는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와야만 했는지 알 것 만 같았다.
그곳을 내려오면서 압도 라는 단어를 꼭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피서라
너무 실제 같아 실재할 것 같지 않은 ‘마보로시’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 우리는 입을 연다. -P-
정말이지 너무나도 시끄러워 나는 숨어버린 것이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누군가는 벌써 일어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고, 이불을 부여잡고 창으로 들어오는 볕을 간신히 피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라디오 속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목소리에서 성별과 가창력을 판단하고, 아침인지 점심인지 혹은 이른 저녁인지도 모를 식사를 챙기기 위해 식탁에 앉아 한 참 동안 벽을 노려보고 있을 때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지금에서야 굳이 일어나 벽을 노려보고 있는 것인지 생각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어제의 일이 생각나 그만 머리를 흔들어 버리고, 마치 그러면 어제의 일이 없어지기라도 할 것 같아 어린아이처럼 그런 주문을 알려 준 엄마의 말이라면 분명하겠지 하고 다시 한 번 세차게 머리를 흔들다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고 왼쪽 렌즈가 방정맞게 바닥에서 엉덩이를 들썩일 때, 나는 벌떡 일어나 내가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합당한 목적지를 찾고 싶었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순 없었다. 순간 혼자서 멋진 말을 만들어 내려 했던 내가 멋쩍었다.
지갑을 챙겼고, 배낭을 하나 둘러메고 양말을 한 켤레 집어넣다, 속옷도 넣어야 하나 고민하다, 책 한 권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책꽂이를 서성이다 읽었던 책은 다시 읽고 싶지 않고, 읽지 않고 꽂아 둔 책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 손을 대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다.
내가 모르는 종착지가 쓰여 진 고속버스를 무작정 골라 타고, 눈을 감았다. 무음의 음악이나 소리가 있다면 그런 것을 골라 이어폰으로 듣고 싶었다. 이어폰을 꽂으면 그대로 세계의 소리와 단절되는 것이다. 그런 소리가 있다면, 그런 음악이 있다면 한껏 볼륨을 높여 온전히 그 음악 하나만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나는 버스에서 내린다. 여기는 처음이다. 순간 두려움이 앞선다. 어디로 가지? 하는 생각과 함께 작은 시내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막차라는 것을 직감했다. 버스는 마지막으로 구멍가게 앞에 정차했고, 나는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가게 주인은 마치 예견된 것 마냥 심드렁하게 문을 열어 재끼고는 나를 맞았다. 자리끼를 건네주면서 자고 갈 거쥬? 하고 손가락 5개를 펴들었다. 습관적으로 카드를 빼내려 했지만 오만원 권 한 장을 대신 내밀었다. 주인은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커다란 미닫이창을 열더니 방에 팔을 괘고 누워 있는 사내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나오라고 했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가 사내가 보던 TV 프로그램을 그대로 조금 보다가 껐다. 잠을 자려고 한 건 아니지만 불을 껐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떴다. 감았는지 떴는지 눈꺼풀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새까만 어둠이 펼쳐진다. 얼마 안 있어 유리 홑창 가게 문을 통해 어스름히 동이 텄고, 영화 마보로시의 그것처럼 무엇에 홀린 듯 길을 나섰다. 어제는 몰랐던 산이 보였고, 마침 등산화 비슷한 것을 신은 준비성 많은 내가 대견했다. 한 참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구름 속에 와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안개였다. 안개나무, 안개시내, 구름 바위, 구름 풀잎들이 살갗으로 전해졌다. 땀인지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를 그것들이 목덜미로 흘렀다. 닦을 필요는 없다. 아담한 정자 한 채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그 때 나는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와야만 했는지 알 것 만 같았다.
그곳을 내려오면서 압도 라는 단어를 꼭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피서라
권순왕展 / QWON, SOONWANG / 權純旺 / 264 타는 별 Burning Star 264 / 2015. 10. 05 - 10. 30
264 타는 별 BURNING STAR
잔존의 소금 눈 Salt Snow of the Survival, Prainting, Installation, 373x290cm, 2015 (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지난 3월 밀양 금시당의 아침 시간에 150년 된 매화와 마주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400년 된 은행나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인간사의 영화가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가보다. 경술국치 이후 가려진 역사 속에는 만주벌판을 누비고, 대한독립을 외치며 항일무장 투쟁한 동지들이 있었다. 이 아름다운 거처를 멀리하고 이역만리 차가운 남의 별빛 아래서 그리운 고향을 염원하며 쓰러져 간 선열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매화의 고귀한 향기를 맡는구나. 오늘의 가려진 역사는 비밀의 태양아래 지금도 숨 쉬는 그들의 영혼이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264 그는 소금 눈으로 지금 잔존하고 있다. 2015년 여름에 찾았던 이육사의 마지막 장소에 눈이 오는 풍경을 떠올려 보았다. 역사적 시간으로 쌓이는 순간에도 눈물이 녹을 수 있도록.
264 타는 별 264 Burning Star, Prainting, 79x49cm, 2015 (우)
이육사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이다. 수차례 일제에 의해 옥고를 치르고 1944년 해방을 1년 앞두고 1944년 1월 25일 베이징 일본 총 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그는 항일 무장 투쟁가이며 실천적인 민족저항시인이다. 지금 베이징 감옥 그 자리엔 환희의 꽃말인 나팔꽃이 청포도 가지위에 피어 있다. 죽음이 기쁨이 되는 조건은 완전한 독립일 때 절정을 이룬다. 264 그는 탁월한 문학인이다. 동시에 항일 무장 투쟁한 독립 운동가이며 혁명가이다. 1934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작성된 그의 사진에 구멍를 내고 뚫린 상처를 배면으로부터 밀어내 회화적으로 치유하고 싶었다. 영원한 시인이고 싶었던 그가 왜 무장투쟁을 꿈꾸었을까.
권순왕 작가노트
잔존의 소금 눈 Salt Snow of the Survival, Prainting, Installation, 373x290cm, 2015 (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지난 3월 밀양 금시당의 아침 시간에 150년 된 매화와 마주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400년 된 은행나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인간사의 영화가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가보다. 경술국치 이후 가려진 역사 속에는 만주벌판을 누비고, 대한독립을 외치며 항일무장 투쟁한 동지들이 있었다. 이 아름다운 거처를 멀리하고 이역만리 차가운 남의 별빛 아래서 그리운 고향을 염원하며 쓰러져 간 선열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매화의 고귀한 향기를 맡는구나. 오늘의 가려진 역사는 비밀의 태양아래 지금도 숨 쉬는 그들의 영혼이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264 그는 소금 눈으로 지금 잔존하고 있다. 2015년 여름에 찾았던 이육사의 마지막 장소에 눈이 오는 풍경을 떠올려 보았다. 역사적 시간으로 쌓이는 순간에도 눈물이 녹을 수 있도록.
264 타는 별 264 Burning Star, Prainting, 79x49cm, 2015 (우)
이육사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이다. 수차례 일제에 의해 옥고를 치르고 1944년 해방을 1년 앞두고 1944년 1월 25일 베이징 일본 총 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그는 항일 무장 투쟁가이며 실천적인 민족저항시인이다. 지금 베이징 감옥 그 자리엔 환희의 꽃말인 나팔꽃이 청포도 가지위에 피어 있다. 죽음이 기쁨이 되는 조건은 완전한 독립일 때 절정을 이룬다. 264 그는 탁월한 문학인이다. 동시에 항일 무장 투쟁한 독립 운동가이며 혁명가이다. 1934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작성된 그의 사진에 구멍를 내고 뚫린 상처를 배면으로부터 밀어내 회화적으로 치유하고 싶었다. 영원한 시인이고 싶었던 그가 왜 무장투쟁을 꿈꾸었을까.
권순왕 작가노트
타는별, 소멸 속에 생성, 수고로움에 대하여
바닷가, 벌판 외딴 곳에서, 달빛 아래, 쓰라린 생각 속에 잠겨 있는데, 모든 사물들이 노랗고, 불확실하고, 환상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보인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다양한 형상으로, 납작해지기도 하고, 대지에 붙으면서,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게, 달리다, 오고, 되오고 한다. 옛날, 내가 젊음의 날개 위에 실려갈 때, 그것은 나를 꿈꾸게 했고, 나에게 이상하게 보기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에서 초췌한......
(말도로르의 노래_로트레아몽)
광복 70주년, 이육사, 광야, 역사의 무의식, 시, 말과 사물, 심연들, 기다림 망각, 침묵의 목소리, 무장투쟁, 폭력과 생성, 비판과 긍정, 파괴, 현전, 왜, 도대체, 무엇이, 무엇을, 봐야, 할까. 권순왕의 작품 앞에서 무수한 생각과 망상과 감정과 서성임과 책들과 말들이 스쳐지나갔다. 나는, 여기, 이곳에서 내가 아닌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 이 면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말 그대로 현재 이 순간, 아니 지나간 그 순간 내가 포착한 것은 ‘왜’이다.
무엇이 ‘왜’일까. 소름 돋는 이육사의 <광야> 앞에서 권순왕은 왜 그랬을까? 그는 작가노트에서 “264 그는 소금 눈으로 잔존하고 있다. 2015년 여름에 찾았던 이육사의 마지막 장소에 눈이 오는 풍경을 떠올려 보았다. 역사적 시간으로 쌓이는 순간에도 녹을 수 있도록”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하필 소금이었을까? 그리고 왜 눈이었을까? 왜 온전한 사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작가는 사진 위에 ‘작업’을 한 것일까? 왜일까, 왜일까, 왜일까, 왜일까. 며칠 전 있었던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부러 묻지 않았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작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면서 진행 중인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 주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가 택한 방법이 흥미로웠고, 힘들어 하면서도 시간을 들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의 노고를 영상으로라도 담아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작품들에 대해 글을 쓰면서 드는 생각이 ‘왜, 작가들은 어떤 것을 재현하거나 혹은 재현된 것을 파괴하고 또 다시 재현하려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이다. 권순왕이 이번에 택한 방법도 기존의 사진에 소금을 덧입히거나 또는 구멍을 내어 물감을 밀어 넣는, 말 그대로 사서 고생인 수고로움이다. 물론 왜 그랬는지 작가는 노트에서 간단히 말하고 있지만, 왜 굳이 그런 재료를 택해야 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다. 더군다나 <264 타는 별 264 Burning Star>의 뒷면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형형색색 곱기까지 하다.
서늘하고 소름 돋는 이육사의 시 앞에서 우리는 뭔지 모를 두려움, 외경, 뭉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이육사를 대하는 권순왕의 작품 앞에서 우리는 유구의 철학자들이 말한 서블라임sublime, 숭고를 만나게 된다. 숭고와 서블라임, 의미가 상통하는 두 단어의 발화음 중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다.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존재에게 선택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언캐니’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자신도 모르게 재현해 내고, 때로는 기존의 것을 파괴함으로써 단순한 재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낸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매개자로서 발화되지 않는 언어로 참모습, 참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참뜻은 바로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다. 정답은 없다.
서두를 시작한 로트레아몽의「말도로르의 노래」는 장편소설 분량의 시다. 운율도 없는 산문체의 이 읽기 불편한 시를 시인은 왜 썼을까? 다시 ‘왜’이다. 읽기 어려운 보기 힘든, 듣기 쉽지 않은 것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쉽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사고의 장을 마련해 준다.
가던 길을, 멈춰, 서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잠시만, 심연의, 당신의, 나의, 혹은 우리의, 소리가, 장면이, 들리고, 보이고, 마주할 것이다. 무수한 콤마가, 문장에서 저해되는, 콤마가, 콤마를, 여기, 이곳에서는, 써야 할 것 같다. 이육사를 만나고 권순왕을 만나고 로트레아몽을 만나고 피서라를 만나는 여기서, 당신이 서블라임을 검색하고 언캐니의 스펠링을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또한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문장에 빗금을 치길.
피서라
바닷가, 벌판 외딴 곳에서, 달빛 아래, 쓰라린 생각 속에 잠겨 있는데, 모든 사물들이 노랗고, 불확실하고, 환상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보인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다양한 형상으로, 납작해지기도 하고, 대지에 붙으면서,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게, 달리다, 오고, 되오고 한다. 옛날, 내가 젊음의 날개 위에 실려갈 때, 그것은 나를 꿈꾸게 했고, 나에게 이상하게 보기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나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에서 초췌한......
(말도로르의 노래_로트레아몽)
광복 70주년, 이육사, 광야, 역사의 무의식, 시, 말과 사물, 심연들, 기다림 망각, 침묵의 목소리, 무장투쟁, 폭력과 생성, 비판과 긍정, 파괴, 현전, 왜, 도대체, 무엇이, 무엇을, 봐야, 할까. 권순왕의 작품 앞에서 무수한 생각과 망상과 감정과 서성임과 책들과 말들이 스쳐지나갔다. 나는, 여기, 이곳에서 내가 아닌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 이 면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말 그대로 현재 이 순간, 아니 지나간 그 순간 내가 포착한 것은 ‘왜’이다.
무엇이 ‘왜’일까. 소름 돋는 이육사의 <광야> 앞에서 권순왕은 왜 그랬을까? 그는 작가노트에서 “264 그는 소금 눈으로 잔존하고 있다. 2015년 여름에 찾았던 이육사의 마지막 장소에 눈이 오는 풍경을 떠올려 보았다. 역사적 시간으로 쌓이는 순간에도 녹을 수 있도록”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하필 소금이었을까? 그리고 왜 눈이었을까? 왜 온전한 사진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작가는 사진 위에 ‘작업’을 한 것일까? 왜일까, 왜일까, 왜일까, 왜일까. 며칠 전 있었던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부러 묻지 않았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작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면서 진행 중인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 주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가 택한 방법이 흥미로웠고, 힘들어 하면서도 시간을 들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의 노고를 영상으로라도 담아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작품들에 대해 글을 쓰면서 드는 생각이 ‘왜, 작가들은 어떤 것을 재현하거나 혹은 재현된 것을 파괴하고 또 다시 재현하려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이다. 권순왕이 이번에 택한 방법도 기존의 사진에 소금을 덧입히거나 또는 구멍을 내어 물감을 밀어 넣는, 말 그대로 사서 고생인 수고로움이다. 물론 왜 그랬는지 작가는 노트에서 간단히 말하고 있지만, 왜 굳이 그런 재료를 택해야 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다. 더군다나 <264 타는 별 264 Burning Star>의 뒷면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데, 형형색색 곱기까지 하다.
서늘하고 소름 돋는 이육사의 시 앞에서 우리는 뭔지 모를 두려움, 외경, 뭉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이육사를 대하는 권순왕의 작품 앞에서 우리는 유구의 철학자들이 말한 서블라임sublime, 숭고를 만나게 된다. 숭고와 서블라임, 의미가 상통하는 두 단어의 발화음 중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다.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존재에게 선택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언캐니’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자신도 모르게 재현해 내고, 때로는 기존의 것을 파괴함으로써 단순한 재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낸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매개자로서 발화되지 않는 언어로 참모습, 참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참뜻은 바로 당신이 느끼는 그것이다. 정답은 없다.
서두를 시작한 로트레아몽의「말도로르의 노래」는 장편소설 분량의 시다. 운율도 없는 산문체의 이 읽기 불편한 시를 시인은 왜 썼을까? 다시 ‘왜’이다. 읽기 어려운 보기 힘든, 듣기 쉽지 않은 것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쉽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사고의 장을 마련해 준다.
가던 길을, 멈춰, 서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잠시만, 심연의, 당신의, 나의, 혹은 우리의, 소리가, 장면이, 들리고, 보이고, 마주할 것이다. 무수한 콤마가, 문장에서 저해되는, 콤마가, 콤마를, 여기, 이곳에서는, 써야 할 것 같다. 이육사를 만나고 권순왕을 만나고 로트레아몽을 만나고 피서라를 만나는 여기서, 당신이 서블라임을 검색하고 언캐니의 스펠링을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또한 불필요하고 반복되는 문장에 빗금을 치길.
피서라
방명주展 / BANG, MYUNGJOO / 房明珠 / 부뚜막꽃 Rice in Blossom / 2015.09.07-10.02
부뚜막꽃, Rice in Blossom, Archival Pigment Print on Canvas, Installation, 373x290cm, 2005 (좌)
쌀을 먹고사는 사람들이라면 매일 적어도 한번 이상은 누군가에 의해 눈앞에 차려지는 밥을 보게 될 것이다. 「부뚜막꽃」은 그 밥의 외양으로 시작하여 밥의 심리적 사회적 의미까지 사진의 힘을 빌어 포착하고자 한 작업이다. 나의 첫번째 사진전 『트릭』은 일상의 것을 의미있게 또는 무의미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비법으로서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두번째 사진전 『마리오네트』는 삶을 조작하는 거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일상의 사물과 풍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세번째 사진전인 『부뚜막꽃』은 두번째 사진전에서 선보인 「판타스마」연작을 심화시킨 것이다. 여성으로 지니게 되는 딸, 아내, 며느리 등 무시하지 못할 역할들 속에서 접하게 되는 사소한 사물들을 인공조명 위에서 새로운 의미로 포착해내는 작업이 「판타스마」였다. 그들 중에 ‘밥’이 있었다. 『부뚜막꽃』은 부엌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밥짓기에 대한 생각들을 사진작업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으로 또는 먹고살기 위한 반복행위로 매일 행해지는 밥짓기를 모아지고 흐트러지는 밥풀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신성한 먹거리로서 생존의 의미, 한솥밥 먹는 가족이라는 식구의 범위, 가사일이 갖는 사회적 의미, 밥과 밥풀처럼 얽혀진 전체와 개별의 관계 등을 생각하였다.
부뚜막꽃_둥근: 더 높이 더 멀리, Rice in Blossom_Balls: Higher & Farther, Archival Pigment Print, 70x147cm, 2015 (우)
건강에 좋다는 현미밥 짓기를 새로이 배웠다. 어른이 되어가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 잘못된 습관과 지식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생기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다. 매순간 잘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의심스런 가운데, 주변 환경과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더 현실을 버겁게 한다. 『부뚜막꽃_둥근 Rice in Blossom_Balls』시리즈는, 평면으로 펼쳐놓았던 먹거리를 투명구에 덧입히고, 인공조명을 터뜨려 생명을 부여한 작업이다. '부엌'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밥짓기에 대한 생각을 사진작업으로 풀어낸 『부뚜막꽃』(2005년)에서 출발하여, 이젠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허튼 상상력으로 이 공을 따악 날리고, 파악 터뜨리고 싶다. 작디작은 이 고추가루 공을, 저 거대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우주 숲으로 날리고 싶다. 부제 <더 높이, 더 멀리>는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7살 아들의 동화책에서 빌려왔다.
방명주 작가노트
쌀을 먹고사는 사람들이라면 매일 적어도 한번 이상은 누군가에 의해 눈앞에 차려지는 밥을 보게 될 것이다. 「부뚜막꽃」은 그 밥의 외양으로 시작하여 밥의 심리적 사회적 의미까지 사진의 힘을 빌어 포착하고자 한 작업이다. 나의 첫번째 사진전 『트릭』은 일상의 것을 의미있게 또는 무의미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비법으로서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두번째 사진전 『마리오네트』는 삶을 조작하는 거대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일상의 사물과 풍경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세번째 사진전인 『부뚜막꽃』은 두번째 사진전에서 선보인 「판타스마」연작을 심화시킨 것이다. 여성으로 지니게 되는 딸, 아내, 며느리 등 무시하지 못할 역할들 속에서 접하게 되는 사소한 사물들을 인공조명 위에서 새로운 의미로 포착해내는 작업이 「판타스마」였다. 그들 중에 ‘밥’이 있었다. 『부뚜막꽃』은 부엌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밥짓기에 대한 생각들을 사진작업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가족에 대한 의무감으로 또는 먹고살기 위한 반복행위로 매일 행해지는 밥짓기를 모아지고 흐트러지는 밥풀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신성한 먹거리로서 생존의 의미, 한솥밥 먹는 가족이라는 식구의 범위, 가사일이 갖는 사회적 의미, 밥과 밥풀처럼 얽혀진 전체와 개별의 관계 등을 생각하였다.
부뚜막꽃_둥근: 더 높이 더 멀리, Rice in Blossom_Balls: Higher & Farther, Archival Pigment Print, 70x147cm, 2015 (우)
건강에 좋다는 현미밥 짓기를 새로이 배웠다. 어른이 되어가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 잘못된 습관과 지식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 생기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다. 매순간 잘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의심스런 가운데, 주변 환경과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더 현실을 버겁게 한다. 『부뚜막꽃_둥근 Rice in Blossom_Balls』시리즈는, 평면으로 펼쳐놓았던 먹거리를 투명구에 덧입히고, 인공조명을 터뜨려 생명을 부여한 작업이다. '부엌'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밥짓기에 대한 생각을 사진작업으로 풀어낸 『부뚜막꽃』(2005년)에서 출발하여, 이젠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허튼 상상력으로 이 공을 따악 날리고, 파악 터뜨리고 싶다. 작디작은 이 고추가루 공을, 저 거대한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우주 숲으로 날리고 싶다. 부제 <더 높이, 더 멀리>는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7살 아들의 동화책에서 빌려왔다.
방명주 작가노트
더 높이 더 멀리: 관계와 응축의 이야기
1)그녀가 끌어안은 삶은 점점 더 커지고 자라서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삶, 완전한 인생이 되었다.
방명주의 두 작품을 보고 불현듯 버지니아 울프의 위 문장이 생각났고, 곧바로 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밥 : 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솥 따위의 옹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낟알이 풀어지지 않게 끓여 익힌 음식. 끼니로 먹는 음식.
우리는 흔히 밥 하면 rice를 생각한다. 영어에서 rice는 불가산, 말 그대로 셀 수 없는 명사이다. 작가는 그런 밥을 어쩌면 우리가 셀 수도 있을 법한 한 장의 사진으로 구현해 냈다. 그리고 그녀는 2005년 작가 노트에서 “개별과 전체의 관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한 곳에서는 붙어(‘접혀’) 있던 것을 펼쳐 놓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펼쳐져 있던 것을 한데 모아(‘접혀’) 놓았다. 서로 반대의 작업이지만 개별과 전체가 전복되면서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두 작품 모두에서 셀 수 없는 것들을 셀 수 있을 정도의 사태와 마주하게 된다. 이 즈음 되면 아마도 우리는 거대한 스크린 위로 프린트 된 낟알을 정말로 세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품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작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재료들을 가지고 펼치거나 접힘으로써 단순히 밥이나 가루가 아닌 작가가 말하는 “관계” 즉 작가 혹은 밥을 짓는, 고춧가루를 버무리는 이들이 재료를 통해 또 하나의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늘어가는 관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그것의 주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그 대상이 가족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 둘 늘어가는 관계가 스크린 속에서 넓게 펼쳐지거나 반대로 하나로 응축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작가는 2006년 ‘스토리지’ 작품의 작가노트에서 “사진은 보이는 것만 찍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작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진 모두 부감 즉, 높은 위치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며 촬영됐다. 이렇게 작가는 일반사람들이 보통 위치에서는 볼 수 없는 각도에서 촬영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낳는다든지 전체 상황을 개괄하거나 설명적인 묘사가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앞서 말한 작가의 말처럼 수없이 봐 왔지만 보지 못했던 이미지와 작가의 시각이 만들어 낸 무수히 이어지는 관계와 의미들을 두 작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밥, 고춧가루라는 오브제를 사용한 것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 작품에서 영국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름 자체만으로도 버지니아 울프는 상징적이다. 그리고 방명주 작가가 사용한 재료들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그 무언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작가와 작가간의 연결이 지극히 빤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명주가 7살 아들의 동화책에서 빌어, 부제를 <더 높이, 더 멀리>로 정하고, 이 두 작품을 10년 만에 다시 들고 온 것과 서두를 연 위 문장의 소설이 『The Hours』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와 의미심장한 연결고리가 있다.
부제처럼 이 작품으로 그리고 이 작품에서 벗어나 그녀가 앞으로 어떤 사고와 활동들을 이어나갈지 기대해 본다.
피서라
1)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 _버지니아 울프; 출간 당시 'The hour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1)그녀가 끌어안은 삶은 점점 더 커지고 자라서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삶, 완전한 인생이 되었다.
방명주의 두 작품을 보고 불현듯 버지니아 울프의 위 문장이 생각났고, 곧바로 밥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밥 : 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솥 따위의 옹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낟알이 풀어지지 않게 끓여 익힌 음식. 끼니로 먹는 음식.
우리는 흔히 밥 하면 rice를 생각한다. 영어에서 rice는 불가산, 말 그대로 셀 수 없는 명사이다. 작가는 그런 밥을 어쩌면 우리가 셀 수도 있을 법한 한 장의 사진으로 구현해 냈다. 그리고 그녀는 2005년 작가 노트에서 “개별과 전체의 관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한 곳에서는 붙어(‘접혀’) 있던 것을 펼쳐 놓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펼쳐져 있던 것을 한데 모아(‘접혀’) 놓았다. 서로 반대의 작업이지만 개별과 전체가 전복되면서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두 작품 모두에서 셀 수 없는 것들을 셀 수 있을 정도의 사태와 마주하게 된다. 이 즈음 되면 아마도 우리는 거대한 스크린 위로 프린트 된 낟알을 정말로 세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품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작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재료들을 가지고 펼치거나 접힘으로써 단순히 밥이나 가루가 아닌 작가가 말하는 “관계” 즉 작가 혹은 밥을 짓는, 고춧가루를 버무리는 이들이 재료를 통해 또 하나의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늘어가는 관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그것의 주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그 대상이 가족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 둘 늘어가는 관계가 스크린 속에서 넓게 펼쳐지거나 반대로 하나로 응축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말이다.
작가는 2006년 ‘스토리지’ 작품의 작가노트에서 “사진은 보이는 것만 찍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작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진 모두 부감 즉, 높은 위치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며 촬영됐다. 이렇게 작가는 일반사람들이 보통 위치에서는 볼 수 없는 각도에서 촬영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낳는다든지 전체 상황을 개괄하거나 설명적인 묘사가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앞서 말한 작가의 말처럼 수없이 봐 왔지만 보지 못했던 이미지와 작가의 시각이 만들어 낸 무수히 이어지는 관계와 의미들을 두 작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밥, 고춧가루라는 오브제를 사용한 것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 작품에서 영국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름 자체만으로도 버지니아 울프는 상징적이다. 그리고 방명주 작가가 사용한 재료들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그 무언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작가와 작가간의 연결이 지극히 빤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명주가 7살 아들의 동화책에서 빌어, 부제를 <더 높이, 더 멀리>로 정하고, 이 두 작품을 10년 만에 다시 들고 온 것과 서두를 연 위 문장의 소설이 『The Hours』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와 의미심장한 연결고리가 있다.
부제처럼 이 작품으로 그리고 이 작품에서 벗어나 그녀가 앞으로 어떤 사고와 활동들을 이어나갈지 기대해 본다.
피서라
1)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 _버지니아 울프; 출간 당시 'The hour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윤미展 / LEE, YOONMI / 李允美 / 스페이스 드로잉 Space drawing / 2015.08.10-09.04
성북동 스페이스 이끼는 흙으로 초벌구이를 한 것 같은 주황색 기와지붕의 소박한 공간이다. 이곳에 색색의 굵고 가는 실로 감싼 선들이 무심한 듯 또는 계획적으로 의도한 둥근 곡선들로 자유롭게 자연을 그리고 있다. 이 드로잉에는 나지막한 산의 등선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도 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거나 혹은 무엇과 닮은 형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 선들을 따라 가면 즉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리고 갑자기 끊어진 선 밖의 영역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곳은 쭉쭉 뻗은 직선의 건축물들이 아닌 삐뚤삐뚤한 굽은 길, 닮은 듯 닮지 않은 작은 집들의 반복, 또한 다른 것들의 겹침,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선들을 품고 있다.
이렇듯 두께가 다른 선들의 윤곽들이 모여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들이 주변의 환경과 함께 <Space drawing 2015>의 풍경을 완성한다. 그리고 다음 드로잉을 위한 한 가닥의 선을 남겨 놓는다.
공간 드로잉은 공간 속의 다른 공간을 찾아갈 때 직접적인 일상생활의 장소에서 익숙함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만의 특이한 액세서리를 한다. 나는 이것을 판타지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공간을 응시할 때 자신의 기억, 시간,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은 동일하게 주어진 주황색 끈을 잡고서 따라갔으나 그 끝은 각자의 몫이 된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모호해지기를 바란다.
나의 대부분의 작업에서 보여주듯이 회화에서 중요시 다루는 원근법은 의도적으로 비켜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소심한 행위가 나에게 형식을 만드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 틀 안에서 돌출의 공간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돌출의 공간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낯선 것으로의 길트기를 유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낯섦이 이곳에 살지 않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바라보는 시선들을 재미있는 선들의 표정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어떤 경계나 구별을 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삶이 아닌 것이 된다고 한 데리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여기서 삶이 아니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상실됨을 이야기한다. 죽음을 삶과 분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의 상상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미 작가노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거나 혹은 무엇과 닮은 형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 선들을 따라 가면 즉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리고 갑자기 끊어진 선 밖의 영역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곳은 쭉쭉 뻗은 직선의 건축물들이 아닌 삐뚤삐뚤한 굽은 길, 닮은 듯 닮지 않은 작은 집들의 반복, 또한 다른 것들의 겹침,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듯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선들을 품고 있다.
이렇듯 두께가 다른 선들의 윤곽들이 모여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 덩어리들이 주변의 환경과 함께 <Space drawing 2015>의 풍경을 완성한다. 그리고 다음 드로잉을 위한 한 가닥의 선을 남겨 놓는다.
공간 드로잉은 공간 속의 다른 공간을 찾아갈 때 직접적인 일상생활의 장소에서 익숙함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만의 특이한 액세서리를 한다. 나는 이것을 판타지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공간을 응시할 때 자신의 기억, 시간,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은 동일하게 주어진 주황색 끈을 잡고서 따라갔으나 그 끝은 각자의 몫이 된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모호해지기를 바란다.
나의 대부분의 작업에서 보여주듯이 회화에서 중요시 다루는 원근법은 의도적으로 비켜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소심한 행위가 나에게 형식을 만드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 틀 안에서 돌출의 공간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돌출의 공간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낯선 것으로의 길트기를 유도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낯섦이 이곳에 살지 않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바라보는 시선들을 재미있는 선들의 표정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 어떤 경계나 구별을 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삶이 아닌 것이 된다고 한 데리다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여기서 삶이 아니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가 상실됨을 이야기한다. 죽음을 삶과 분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의 상상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미 작가노트
출구를 찾는 기묘한 여정
We're 2 dimensional. That's stage 3.
We're getting no where. Death. Unlucky death.
Oh, no, we're not figurative. This is the last stage. We're not gonna make it.
Wait, we're 2 dimensional. Fall on your face. (영화 인사이드 아웃)
아담한 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창 안의 한 사내가 쇼윈도의 능선들과 대치한다. 쇼윈도 안으로 마치 탈출을 시도하는 듯 한 역동적인 선들이 그가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했다. 사내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능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창밖으로 비춰진 하늘과 쇼윈도 안의 능선처럼 늘어진 전선과 그 아래로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사내는 그것이 차 창 안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했다.
이윤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스페이스 이끼는 경사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버스 한 대가 몇 분 간격으로 지나는 이곳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위의 사내는 언제나 ‘이윤미의 선’들이 아래를 향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어떨 때는 창문 밖으로 투영된 늘어진 전선들과 빽빽이 자리 잡은 집들이 구부러지고 혹은 켜켜이 쌓아올린 선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느낄 지도 모른다. ‘이윤미의 선’들은 단순히 1차원적이 아니다. 작가는 이것을 <Space drawing 2015>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그린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 선을 2차원적인 공간으로 재구성 했는데, 그것도 on과 over의 두 방식을 이용했다. 이 즈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 말해야 할지 도형이라고 말해야 할지 혼돈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 앞에서 우리의 눈은 ‘이윤미의 선’들을 쫓고, 우리의 머리는 한 작은 창 안에서 구현된 닫혔지만 열린 혹은 그 반대인 새로운 공간을 담고, 우리의 손은 선을 감싸고 있는 ‘그것’을 향한다. 공감각(Synesthesia)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러시아 구성주의자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의 그 유명한 <모서리 역부조Corner Counter Relief)를 떠올려 보면, (이윤미 작가가 비록 이번 전시에서는 그녀 특유의 큐브를 직조하진 안았지만) ‘이윤미의 선’들이 모서리에서 끊기 지 않고 평면과 평면을 횡단하면서 단순한 선이 아닌 입체적 공간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코너의 힘이다. 어둑한 벽 코너에 놓인 스탠드나 이콘(Icon)처럼 말이다.
얼마 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글의 서두를 연 대사는 영화 속 조이와 새드가 상상속 친구 빙봉을 만나 추상적 생각(abstract thought)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면서 나온다. 새드는 추상적 생각 문 위에 붙은 ‘PERIGO AFASTE-SE(위험 손대지 마시오/ 빙봉은 이 포르투갈어를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shortcut이라고 읽는다)'라는 경고문 앞에서 망설인다. 결국 그곳에 들어온 이들은 4stage와 맞닥뜨린다. 그들은 먼저 추상화된 후 분열 되고, 해체되어 2차원적 공간과 조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납작한 2차원의 도형으로 변형된 그들은 작은 출구 앞에서 소동을 벌인다. 변형된 자신들의 모양으로는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새드가 한마디 한다. “우리는 2차원이잖아. 납작하게 붙어we're 2 dimensional. Fall on your face.” 마침내 그들은 탈출했다.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들이 추상적 생각의 문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윤미의 작품을 통해 굳이 추상적 세계가 아닐 지라도 또 다른 세계, 차원, 공간으로서의 이동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해 본다. 그래서 나는 1차원적이지 않은 ‘이윤미의 선’들을 각기 다른 세계로 통하는 출구라고 말하고 싶다. 버스 안 사내의 출구, 나의 출구, 이윤미의 출구, 그리고 당신의 출구로서 말이다.
피서라
We're 2 dimensional. That's stage 3.
We're getting no where. Death. Unlucky death.
Oh, no, we're not figurative. This is the last stage. We're not gonna make it.
Wait, we're 2 dimensional. Fall on your face. (영화 인사이드 아웃)
아담한 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창 안의 한 사내가 쇼윈도의 능선들과 대치한다. 쇼윈도 안으로 마치 탈출을 시도하는 듯 한 역동적인 선들이 그가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했다. 사내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능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창밖으로 비춰진 하늘과 쇼윈도 안의 능선처럼 늘어진 전선과 그 아래로 자신을 직시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사내는 그것이 차 창 안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했다.
이윤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스페이스 이끼는 경사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버스 한 대가 몇 분 간격으로 지나는 이곳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위의 사내는 언제나 ‘이윤미의 선’들이 아래를 향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어떨 때는 창문 밖으로 투영된 늘어진 전선들과 빽빽이 자리 잡은 집들이 구부러지고 혹은 켜켜이 쌓아올린 선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느낄 지도 모른다. ‘이윤미의 선’들은 단순히 1차원적이 아니다. 작가는 이것을 <Space drawing 2015>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그린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 선을 2차원적인 공간으로 재구성 했는데, 그것도 on과 over의 두 방식을 이용했다. 이 즈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 말해야 할지 도형이라고 말해야 할지 혼돈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 앞에서 우리의 눈은 ‘이윤미의 선’들을 쫓고, 우리의 머리는 한 작은 창 안에서 구현된 닫혔지만 열린 혹은 그 반대인 새로운 공간을 담고, 우리의 손은 선을 감싸고 있는 ‘그것’을 향한다. 공감각(Synesthesia)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러시아 구성주의자 블라디미르 타틀린(Vladimir Evgrafovich Tatlin)의 그 유명한 <모서리 역부조Corner Counter Relief)를 떠올려 보면, (이윤미 작가가 비록 이번 전시에서는 그녀 특유의 큐브를 직조하진 안았지만) ‘이윤미의 선’들이 모서리에서 끊기 지 않고 평면과 평면을 횡단하면서 단순한 선이 아닌 입체적 공간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코너의 힘이다. 어둑한 벽 코너에 놓인 스탠드나 이콘(Icon)처럼 말이다.
얼마 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았다. 글의 서두를 연 대사는 영화 속 조이와 새드가 상상속 친구 빙봉을 만나 추상적 생각(abstract thought)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면서 나온다. 새드는 추상적 생각 문 위에 붙은 ‘PERIGO AFASTE-SE(위험 손대지 마시오/ 빙봉은 이 포르투갈어를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shortcut이라고 읽는다)'라는 경고문 앞에서 망설인다. 결국 그곳에 들어온 이들은 4stage와 맞닥뜨린다. 그들은 먼저 추상화된 후 분열 되고, 해체되어 2차원적 공간과 조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납작한 2차원의 도형으로 변형된 그들은 작은 출구 앞에서 소동을 벌인다. 변형된 자신들의 모양으로는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새드가 한마디 한다. “우리는 2차원이잖아. 납작하게 붙어we're 2 dimensional. Fall on your face.” 마침내 그들은 탈출했다.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들이 추상적 생각의 문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윤미의 작품을 통해 굳이 추상적 세계가 아닐 지라도 또 다른 세계, 차원, 공간으로서의 이동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해 본다. 그래서 나는 1차원적이지 않은 ‘이윤미의 선’들을 각기 다른 세계로 통하는 출구라고 말하고 싶다. 버스 안 사내의 출구, 나의 출구, 이윤미의 출구, 그리고 당신의 출구로서 말이다.
피서라